공유하기
[오늘과 내일/정성희]두 여자, 가지 않은 길
-
입력 2007년 11월 7일 03시 10분
글자크기 설정

모델 출신인 생팔은 20세기 프랑스 누보레알리슴을 대표하는 예술가다. 생팔의 전기 ‘여신이여, 가장 큰 소리로 웃어라’(슈테파니 슈뢰더)에서 흥미 있었던 것은 그의 작품세계가 아니라 프랑스인의 연애관이었다.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남편과 이혼한 생팔은 아이들도 버리고 파리로 올라와 예술계에 입문하고 평생의 연인이자 ‘예술동지’인 장 탱글리를 만나 재혼한다. 이어지는 장의 외도, 그리고 그 자신의 외도…. 그래도 그는 남편 장에게 말한다. “장, 언제라도 당신이 원할 때는 집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알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이혼 소식을 들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탱글리-생팔, 사르트르-시몬 드 보부아르 커플이 보여 준 ‘그들 방식의 사랑’이었다. 적잖은 사람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부인 없이도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보였지만 나는 ‘대통령부인 프리미엄’을 가볍게 걷어차 버린 세실리아란 여인의 실체가 궁금했다.
세실리아가 왜 남편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데에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라는 직위도 막을 수 없었던 ‘자기 앞의 생(生)’에 대한 열정이 작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이혼 직후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위선 없이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건 프랑스 여성의 뿌리 깊은 자의식 및 실존적 연애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 국민은 대통령의 이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요신문인 르 주르날 뒤 디망슈가 여론조사기관인 IFOP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9%가 이혼은 전적으로 두 사람의 개인 문제라고 응답했다. 프랑스답다. 대통령이 이혼할 경우 수신제가(修身齊家)도 못하는 인물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소지가 높은 사회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세실리아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상원의원과 자연스럽게 대비된다. 힐러리는 모델 출신인 세실리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자랑한다. 누구보다 독립적이고 똑똑한 여자이지만 그는 1996년 르윈스키 스캔들을 겪으면서도 빌 클린턴 대통령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걸 두고 정치적 야심 때문에 아내의 자존심을 버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다. 그때 백악관을 떠났더라면 대통령 후보 힐러리는 없었을 것이다.
현재 힐러리를 가장 확실하게 떠받치고 있는 사람은 남편 클린턴이다.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힐러리는 “모든 세상 사람처럼 우리 부부도 여러 차례 어려운 시기를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시기에도 결혼을 유지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실리아와 힐러리, 이 두 전직 퍼스트레이디의 모습은 일과 사랑의 틈바구니 속에서 매일 전쟁을 치르는 평범한 한국 여성에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삶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현대 여성은 일에서는 완벽한 프로 직장인이 되길, 가정에서는 멋진 아내가 되길 꿈꾼다. 하지만 이들 퍼스트레이디의 대조적 삶이 보여 주듯 21세기 여성에게도 일과 사랑이란 역시 제로섬게임에 가까운 것 같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다. 한 명은 남편을 떠났고, 다른 한 명은 남편을 지켰지만 이런 행위가 그들의 주체적인 선택이란 점이다. 페미니즘이 넘치는 시대, 권익 신장도 좋지만 일을 선택하든, 사랑을 좇든, 그 사이에서 악다구니를 쓰든 그건 오로지 여성 자신의 선택이고 책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씨네@메일 >
-

고영건의 행복 견문록
구독
-

내 생각은
구독
-

기고
구독
트렌드뉴스
-
1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2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3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4
트럼프 안 겁내는 스페인…공습 협조 거부하고 무역 협박도 무시
-
5
하메네이 장례식 연기…이란 “전례 없는 인파 우려”
-
6
美국방 “폭탄 무제한 비축…이틀내 이란 영공 완전 장악할것”
-
7
美국방차관 “한국이 北 상대 재래식 대응 책임지기로 합의”
-
8
이스라엘 “F-35 아디르 전투기로 이란 YAK-130 격추”
-
9
“이스라엘 꾐에 빠져 이란 때렸나”…대리전 의혹에 美여론 들썩
-
10
하메네이 사망에 ‘트럼프 댄스’ 환호…이란 여성 정체 밝혀졌다
-
1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2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3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4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5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6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7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8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9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10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트렌드뉴스
-
1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2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3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4
트럼프 안 겁내는 스페인…공습 협조 거부하고 무역 협박도 무시
-
5
하메네이 장례식 연기…이란 “전례 없는 인파 우려”
-
6
美국방 “폭탄 무제한 비축…이틀내 이란 영공 완전 장악할것”
-
7
美국방차관 “한국이 北 상대 재래식 대응 책임지기로 합의”
-
8
이스라엘 “F-35 아디르 전투기로 이란 YAK-130 격추”
-
9
“이스라엘 꾐에 빠져 이란 때렸나”…대리전 의혹에 美여론 들썩
-
10
하메네이 사망에 ‘트럼프 댄스’ 환호…이란 여성 정체 밝혀졌다
-
1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2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3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4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5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6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7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8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9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10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씨네@메일]'인터뷰'에 대한 찬사와 저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매일 반복하는 이 습관, 동맥을 야금야금 망가뜨린다[노화설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459256.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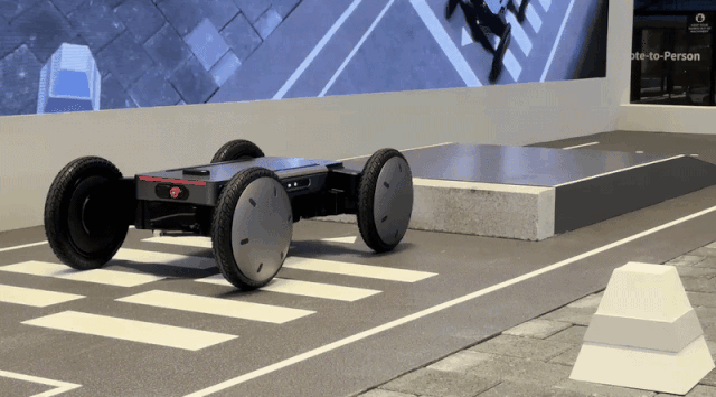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