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책갈피 속의 오늘]1934년 부산 영도다리 개통
-
입력 2004년 11월 22일 18시 21분
글자크기 설정

1930년대 일제는 영도에 조선소를 지어 군수기지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과의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교량이 필요했다.
그러나 부산항을 드나들던 해운업자들은 배가 다리에 걸려 우회해야 한다며 항의했고, 결국 다리를 들어올려 배를 통과시키는 도개교(跳開橋)를 짓게 됐다. 설계는 당시 일본에서 ‘천재 건축가’ 소리를 듣던 마스다 준이 맡았다.
1934년 11월 23일 개통식. 부산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6만여명의 인파가 몰려 다리 상판이 올라가는 광경을 지켜봤다. 공식 명칭은 ‘부산대교’(1980년 새로운 부산대교가 생기면서 ‘영도대교’로 바뀌었다)였지만 사람들은 ‘영도다리’라고 불렀다.
이후 영도다리는 유명세 탓에 실향민의 한 맺힌 공간으로 변모한다.
1951년 1·4후퇴 때 이북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남으로 향했다. 이들이 알 만한 한강 이남의 ‘랜드마크’는 오로지 영도다리. “영도다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기약한 이들은 빈털터리로 다리 주변에 모여들었다.
곳곳에 사람을 찾는 벽보가 붙었다. 날이 밝으면 기다림에 지쳐 투신한 사람들의 보따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경찰은 ‘잠깐만 다시 생각을’ ‘생명은 하나뿐’ 등의 자살 방지 팻말을 내걸었다.
다리 밑 판자촌에는 피란민들의 고민을 들어주던 점(占)집도 80여개에 달했다. 한국 최초의 ‘역술인 거리’였던 셈이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 고 장기려 박사가 처음 천막병원을 연 곳도 여기다.
영도다리는 1966년 영도로 향하는 상수도관이 부착되면서 상판 들어 올리기를 멈췄다. 또 2년 전부터는 교량 노후에 따른 철거 계획이 추진돼 부산 시민의 안타까움을 낳았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는 철거 대신 다리를 확대 보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다. 이르면 2006년 말 다시 상판을 치켜드는 영도다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 개통식 날 ‘굳세어라 금순아’ 노래비 앞에서 때늦은 만남이라도 생기지 않을지 기대해본다.
김준석기자 kjs359@donga.com
책갈피속의 오늘 >
-

한시를 영화로 읊다
구독
-

기고
구독
-

글로벌 이슈
구독
트렌드뉴스
-
1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2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3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 정말 살 빠지고 해독될까?[건강팩트체크]
-
4
李 “‘다음은 북한’ 거론하는 사람 있어…국가 위기 초래”
-
5
‘흑백’ 우승 2년만에…권성준 셰프, 56억 건물주 됐다
-
6
[단독]“한국서 훼손 시신 다수 발견” 허위 영상 올린 유튜버 검찰 송치
-
7
“대기업 줄섰다”…충주맨 김선태, 유튜브 구독자 93만 돌파
-
8
쿠르드족은 누구인가…“미국 지원 요청” 주장에 확전 변수
-
9
“트럼프 막내 배런-김주애 결혼시키자”…세계평화 ‘풍자 밈’ 확산
-
10
나흘 밤샘 게임 대학생, 비명뒤 쓰러져 숨져…사인은 “뇌동맥 파열”
-
1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2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3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4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5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6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7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8
與 “조희대 탄핵안 마련”… 정청래는 “사법 저항 우두머리냐”
-
9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10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트렌드뉴스
-
1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2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3
아침 공복 따뜻한 물 한 잔, 정말 살 빠지고 해독될까?[건강팩트체크]
-
4
李 “‘다음은 북한’ 거론하는 사람 있어…국가 위기 초래”
-
5
‘흑백’ 우승 2년만에…권성준 셰프, 56억 건물주 됐다
-
6
[단독]“한국서 훼손 시신 다수 발견” 허위 영상 올린 유튜버 검찰 송치
-
7
“대기업 줄섰다”…충주맨 김선태, 유튜브 구독자 93만 돌파
-
8
쿠르드족은 누구인가…“미국 지원 요청” 주장에 확전 변수
-
9
“트럼프 막내 배런-김주애 결혼시키자”…세계평화 ‘풍자 밈’ 확산
-
10
나흘 밤샘 게임 대학생, 비명뒤 쓰러져 숨져…사인은 “뇌동맥 파열”
-
1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2
‘증시 패닉’ 어제보다 더했다…코스피 12%, 코스닥 14% 폭락
-
3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4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5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6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7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8
與 “조희대 탄핵안 마련”… 정청래는 “사법 저항 우두머리냐”
-
9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10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창간특집]책갈피 속의 4월 1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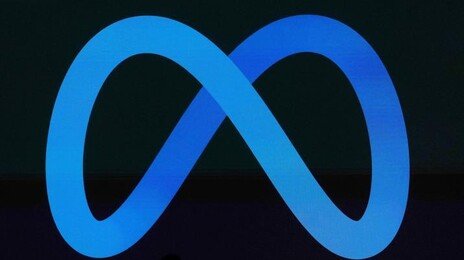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