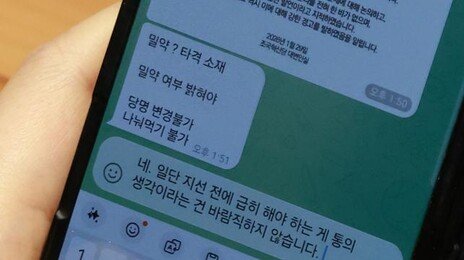공유하기
[韓-벨기에戰 현장 관전기]김용정/『우리도 할수 있다』
-
입력 1998년 6월 26일 19시 21분
글자크기 설정
한국으로서는 비록 대망의 16강진출 꿈이 무산됐지만 월드컵 사상 첫 1승의 기대와 집념을 포기할 수는 없다.
벨기에 역시 16강 토너먼트 진출여부가 한국과의 한판승부에 달렸다. 양팀의 전의(戰意)는 초반부터 불꽃을 튀겼다. 벨기에의 흑백 투톱, 올리베이라와 닐리스의 개인기와 돌파력이 끊임없이 한국수비진을 교란한다.
전원공격의 파상공세가 위협적이다.
전반 6분, 닐리스의 선제골이 한국골문을 갈랐다. 벨기에 월드컵 5회연속 진출의 주역인 닐리스의 진면목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우리선수들의 투혼은 놀라웠다.
한 골을 먼저 허용했으면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멕시코와 네덜란드전에서의 무기력함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드리블과 패스워크 슈팅력 등 개인기 열세는 문제가 아니었다.
투혼, 그 하나만으로 전반을 추가실점없이 대등한 경기로 이끌었다.
후반전은 더욱 팽팽한 접전이었다.
후반 26분, 회심의 만회골을 뽑아내면서 강호 벨기에를 누르고 1승을 거둘 수도 있다는 자신감마저 갖는듯했다.
1대1 무승부는 분명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우승후보의 하나인 네덜란드와 비겼던 벨기에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벌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리옹과 마르세유에서 멕시코와 네덜란드로부터 넘겨받았던 수모와 치욕을 말끔히 씻어줄 수는 없다 해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회복이야말로 값지고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98프랑스월드컵은 우리에게 아쉬움과 함께 값진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이번에도 월드컵 본선 16강의 명승부는 먼나라의 얘기가 되어버렸다. 바야흐로 열기가 더해가는 20세기 마지막 지구촌의 한마당축제를 뒤로 하고 4년후를 기약해야 하는 섭섭함은 크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다른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
21세기의 새벽을 여는 2002년 월드컵을 ‘희망의 구연(球宴)’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부심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김용정〈논설위원〉yjeong@donga.com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7
주식 혐오했던 김은유 변호사, 53세에미국 주식에서 2100% 수익률 달성한 사연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李 “부동산 정상화, 5천피-계곡 정비보다 쉬워”
-
10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6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7
주식 혐오했던 김은유 변호사, 53세에미국 주식에서 2100% 수익률 달성한 사연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李 “부동산 정상화, 5천피-계곡 정비보다 쉬워”
-
10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6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9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10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