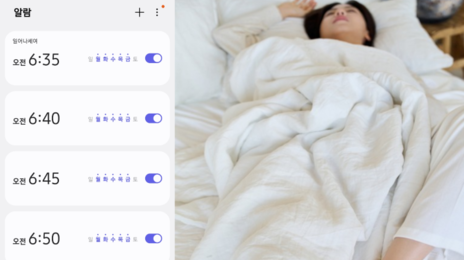공유하기
[오늘과 내일/권순택]노사모의 갈림길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5월 26일 02시 56분
글자크기 설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후는 노사모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2000년 4·13 총선 직후 ‘부산 출마 3연패(連敗)’를 기록한 ‘바보 노무현’을 돕기 위해 결성된 노사모는 정치인 팬클럽의 원조다. ‘박사모’ ‘창사랑’ ‘정통들’은 그 아류들이다.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은 “5·16 때 군인들이 군복 입고 한강 다리를 건넜지만 우리는 노사모와 함께 노란 목도리를 매고 한강을 건넜다”며 2002년 대선 승리의 공을 노사모에 돌렸다. 노 전 대통령도 “노사모는 나와 함께 사고(事故)를 친 공범”이라며 “노사모는 참여민주주의의 아주 화려한 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노사모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친노’와 ‘반노’를 오간 정치인들과는 달리 노 전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에 몰렸을 때조차 의리를 지켰다. 그런 노사모에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까지 동행(同行)을 기대했다. 2006년 8월 노사모 핵심 멤버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그는 “고향집 넓은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자”고 했다. “퇴임 후 고향집에 만들 기념관의 알맹이는 3분의 2 이상이 노사모 기록으로 채워질 것”이라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한 달 전인 지난해 1월 19, 20일 노사모 회원 15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념사진을 찍고 간담회도 가졌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챙겼다. 후사를 도모할 동지들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는 자신의 역사보다 노사모의 역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한 적도 있다.
노사모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노무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됐다. 대통령의 사랑이 지나친 탓이었을까. 노사모 핵심 인사들은 홍위병을 자처하며 비판과 반대를 용납하지 않고 적대감을 드러내곤 했다. 그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노 전 대통령에게 누가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노사모의 권력집단화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노사모 초대 대표 김영부 씨는 3년 전에 이미 “노사모는 역사로 남고 활동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했다.
지역주의 청산과 고비용 정치 배격, 권위주의 타파 같은 노무현 정치의 대의명분을 지지해서 모인 초기 노사모의 뜻은 순수했다고 본다. 그런 명분은 지금도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런 점에서 노사모의 역할은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저를 지지한 분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저를 반대하신 분까지 포함한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 또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는 이제 끝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소망은 갈등과 분열을 끝내는 것이었으리라고 믿고 싶다. 유서 가운데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는 당부를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의 비극을 증오와 분열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노사모는 누구보다 노 전 대통령의 유지(遺志)를 잘 알 것이다. 노사모는 이제 노 전 대통령을 그들만의 대통령에서 풀어줘야 한다. 진작 그랬어야 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가 노사모에 대한 지지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사모는 ‘노무현’을 진정 사랑하는 길이 뭔지 자문할 때다. 노사모가 막무가내가 되면 노 전 대통령의 ‘사후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횡설수설
구독
-

내가 만난 명문장
구독
-

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구독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3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4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5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정해인, ‘쩍벌’ 서양인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논란도
-
8
이란 영공 코앞에 뜬 美초계기… 하메네이 “공격땐 지역 전쟁”
-
9
“내 주인은 날 타이머로만 써”… 인간세계 넘보는 AI 전용 SNS 등장
-
10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8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9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3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4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5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정해인, ‘쩍벌’ 서양인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논란도
-
8
이란 영공 코앞에 뜬 美초계기… 하메네이 “공격땐 지역 전쟁”
-
9
“내 주인은 날 타이머로만 써”… 인간세계 넘보는 AI 전용 SNS 등장
-
10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8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9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허진석]‘정년-연금 일치’는 논의조차 없는 국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30/133269810.1.jpg)
![[횡설수설/김창덕] “그는 정치적 동물이야”](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76552.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