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작가 권지예의 그림읽기]도(道)는 어디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0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잘생긴 꽃나무를 하나 들라 하면 저는 동백나무를 꼽겠습니다. 단단한 회백색의 나무둥치에, 사철 윤기 나는 두툼한 푸른 잎을 자랑하는 상록활엽수인 데다 선연한 붉은 꽃은 필 때도 좋지만 질 때는 더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늦겨울에 제주에 갔을 때 만개한 동백나무 군락지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눈 속에 핀 겨울의 동백꽃은 화려하고 장엄했습니다. 그런데 눈길 위에 툭툭 송이째 떨어져 있는 붉은 꽃송이, 특히나 샛노란 꽃술이 심지처럼 박힌 선홍색 꽃잎 속에 담뿍 하얀 눈을 담은 채 오뚝하니 놓여 있는 꽃송이를 보면서는 폐부를 찌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시들지도 않고 저토록 생생한 핏빛 꽃이, 그것도 꽃잎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낙화하는 꽃이 동백 말고 무엇이 또 있을까! 뭐랄까요. 한마디로 동백은 무척 자존심이 강한 꽃 같았거든요. 요절한 절세 미녀 같더군요. 우울증이나 병으로 죽은 미녀 말고 절개나 신념을 위해 피를 토하며 자살한 아름다운 여인이 떠오르더군요. 제 눈에 그렇게 비장하게 보였던 것은 당시 저의 처지와 맞물려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지요. 문학을 위해, 예술을 위해서 여전사처럼 살자고 한창 고민하던 때였거든요. 한동안 제게 동백꽃은 그런 꽃이었습니다. 극기 훈련 하듯, 작가로서의 결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찾는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에서 이렇게 포근한 동백나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온통 차지하는 동백나무는 온갖 것을 다 품고 있네요. 절의 문살 같은 동백꽃 가지 사이로 깃발을 꽂은 고깃배도, 배만 한 물고기도, 작은 집들도, 집보다 더 큰 새들도, 사람보다 더 큰 사슴과 강아지도 뛰놀고 있네요. 게다가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네요. 하늘은 배가 떠다니는 바다. 오색 물고기가 새처럼 날아다니네요. 땅은 동백나무. 그 위로 장독대와 돌담이 둘러진 집이 세워져 있고 집안에는 아마 두 부부가 밥을 먹나 봐요. 동화처럼 아름다운 정경입니다. 영혼이 순수한 아이가 그린 그림 같아요. 아이는 자기가 관심 갖고 좋아하는 것을 원근이나 대소에 관계없이 크게 그리잖아요. 아마 화가도 아이처럼 영혼이 맑은 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술을 하려면 생활 속에서 항상심을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인지도 모릅니다. 문득 어깨에 잔뜩 힘주고 글을 쓰던 병아리 작가 시절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어깨에 잔뜩 힘주고 써봤자 오십견밖에 얻을 게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저는 언제나 도를 깨칠 수 있을까요?
권지예 작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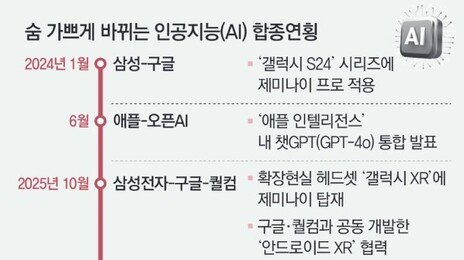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