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늘과 내일/정성희]미래의 직업, 직업의 미래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기자가 되겠다고 신문사 문을 두드리는 취업 준비생들을 볼 때마다 입사 시험을 치르던 25년여 전으로 시곗바늘이 돌아간다. 1985년 늦가을 동아일보 입사 시험의 에세이 문제는 ‘지하철 경복궁역 스케치’였다. 기자 수업을 받은 적도 없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던 시절 나는 경복궁역에 가서 경복궁역을 정말 그림으로 그려야 하는지 잠깐 고민했다. 기사 종류에 스트레이트와 스케치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이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청년들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는 정말 그랬다. 성적표에 ‘권총(F학점)’이 수두룩하고, 스펙을 쌓기 위한 ‘해외 연수’는 개념도 없을 때였다. 대학생들이 만나면 나라 걱정이 넘쳤지만 취업 걱정은 안 했다. 웬만한 대학만 나와도 기업에서 모셔 가려고 줄을 섰고, 직장을 골라 갈 수 있었다. 그러니 어느 응시자가 “기자가 되기 위해서 영혼을 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대목이 들어간 자기소개서를 읽었을 때나 집안 조카가 나이 서른에 직장을 못 구해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안쓰러운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실업은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미국 컨설팅회사 트웬티섬싱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300만 명 가운데 85%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낙향했다. 호프(2003년 사망한 미국 코미디 황제 밥 호프를 말하는 것으로 ‘희망’과 동의어)도 가고 잡스(올해 사망한 스티브 잡스를 빗댄 말로 ‘일자리’란 뜻도 있다)도 없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고 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저서 ‘노동의 종말’을 통해 “세계 경제는 노동의 본질이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으며 기술진보로 인해 실업자가 양산된다”고 예고한 것이 1995년이다. 불행하게도 예언은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요즘 실업은 경기 변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수치상으로 미국이나 유럽보다 사정이 훨씬 나은데도 우리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눈높이를 높인 데는 미디어의 책임도 크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뉴스와 안방 드라마를 통해 재벌가를 엿볼 수 있다.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배웠고 톱스타와 스포츠 영웅을 선망하는 청년세대는 현실은 남루해도 기대 수준만큼은 높다. 삶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사회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직업의 패러다임 바뀌고 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기고
구독
-

함께 미래 라운지
구독
-

Tech&
구독
트렌드뉴스
-
1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2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전
-
3
가짜 돈 내는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中 노점상
-
4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5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6
일하다 쓰러진 60대 남성, 장기기증으로 2명에 새 삶 선물
-
7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8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9
우유냐 두유냐…단백질 양 같아도 노령층엔 ‘이것’ 유리[노화설계]
-
10
박신양 “10년간 몸 못 가눠”…허리 수술·갑상선 투병 고백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5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6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7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10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트렌드뉴스
-
1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2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전
-
3
가짜 돈 내는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中 노점상
-
4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5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6
일하다 쓰러진 60대 남성, 장기기증으로 2명에 새 삶 선물
-
7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8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9
우유냐 두유냐…단백질 양 같아도 노령층엔 ‘이것’ 유리[노화설계]
-
10
박신양 “10년간 몸 못 가눠”…허리 수술·갑상선 투병 고백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5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6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7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10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이상훈]억대 연봉 140만 시대, ‘공짜 증세’가 끝나간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23/13340750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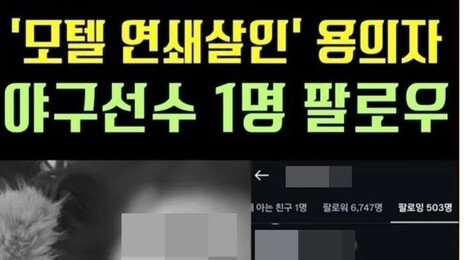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