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고/김기철]광화문광장서 솔향기를 맡고 싶다
- 동아닷컴
-
입력 2009년 11월 21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600년 가까이를 나라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서울은 세계의 어느 수도보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삼각산 북악산 인왕산을 병풍 삼아 경복궁이, 위편에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청와대가 자리 잡았다. 앞에 광화문이 있고 넓디넓은 길이 펼쳐지면서 국보 1호인 남대문이 우뚝 서 있다. 중심에 세종로 사거리가 있어 오랜 역사와 현대문명이 공존하며 살아 움직이는 곳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서울의 중심핵인 동시에 나라의 한복판임을 한눈에 느끼게 한다. 그러나 현대문명이 기승을 떨다 보니 자연스러운 풍광이 위축돼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많이 훼손됐다.
나는 청계천이 서울의 신선한 자연의 휴식처가 되고 수많은 시민이 즐겨 찾아와 감탄하는 모습에서처럼 차량의 행렬로 가득 메워진 광화문 거리를 광장으로 만든다는 발상에 손뼉을 치고 싶을 만큼 감동했다. 그런데 광장이 기대와는 달리 변신한 데 대해 차라리 옛날의 은행나무 행렬이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메마른 불모지를 연상시키는 돌멩이 바닥이라는 점 외에 더 봐줄 모습이 없다. 바닷가 모래사장도 아닌데 웬 파라솔 군락인가? 조각품인지 뭔지 벌겋게 녹슨 것 같은 쇠기둥 같은 물체가 삭막함을 더한다.
물론 서울시는 연구를 많이 하고 고심했을 것이고 꽃밭을 군데군데 해놓았다고 흐뭇해할지 모른다. 이런 발상은 어디까지나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한 일이지 하늘과 땅, 양쪽 길가 건물과의 조화를 생각 못한 것 같다. 우리가 자칫 간과하기 쉬운 점은 매사에 국지적인 현상에 매달리면 대국적인 큰 틀을 잃기 쉽다는 사실이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깨끗하고 향기가 대단하다. 삭막한 겨울날 신부의 면사포 같은 흰 눈을 안은 햇살 속 솔잎 가지를 상상해 보라! 반짝이는 눈부신 광경을 바라보고 시심이 발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 사이에도 소나무를 심어 친자연이나 녹색혁명을 추구하는 마당에 광화문광장은 왜 역행했는지 도대체 모를 노릇이다.
김기철 도예가·수필가
트렌드뉴스
-
1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2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3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4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5
담배 냄새에 찡그렸다고…버스정류장서 여성 무차별 폭행
-
6
떡볶이 먹다 기겁, 맛집 명패에 대형 바퀴벌레가…
-
7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8
[속보]헌재 “득표율 3% 이상 정당만 비례대표 주는 공직선거법 위헌”
-
9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10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1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2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3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4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5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6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7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8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9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10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트렌드뉴스
-
1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2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3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4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5
담배 냄새에 찡그렸다고…버스정류장서 여성 무차별 폭행
-
6
떡볶이 먹다 기겁, 맛집 명패에 대형 바퀴벌레가…
-
7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8
[속보]헌재 “득표율 3% 이상 정당만 비례대표 주는 공직선거법 위헌”
-
9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10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1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
2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
3
홍준표 “김건희 도이치 굳이 무죄?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판결”
-
4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
5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서 韓 빠지겠다는것” 이례적 공개 비판
-
6
[단독]조여오는 25% 관세… “美 관보 게재 준비중”
-
7
[속보]장동혁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
8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
9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10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의대 증원, ‘숫자 집착’ 버리고 ‘과학적 검증’ 우선돼야[기고/김택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9/13325402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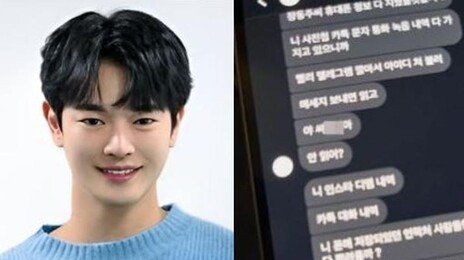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