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동아광장/홍찬식칼럼]축제공화국
-
입력 2003년 8월 22일 18시 06분
글자크기 설정

▼ 급조된 지역축제 ▼
관 주도의 문화행사에도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거액의 예산을 들인 연예인 공연이나 구경거리 위주로 한바탕 쇼처럼 치르는 행사가 대부분이다. 지역축제나 문화행사가 원래 그런 것 아니냐는 인식이 어느 사이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주민이 참여 주체가 되어 지역문화를 가꿔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 이름을 내건 축제들이 활성화되고 그 수가 전국적으로 1000여개를 헤아리게 된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축제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 최근 지역축제 붐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큰 진전이다. 지난 월드컵 때의 짜릿했던 감동처럼 축제는 지친 일상에 활력을 선사한다.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갈등의 근원이 ‘공동체 붕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웃간 단절이 심각한 마당에 지역축제는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축제의 내용이다.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연원을 따져 보면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집중적으로 생겨난 것들이다. 외국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축제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명목으로 지자체들이 급조한 것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지역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단체장의 판단이 축제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러다 보니 ‘축제의 속성 재배’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
축제 명칭은 제각각이어도 내용은 ‘그 밥에 그 나물’인 경우가 많다. 축제 개막식에 가보면 기관장과 지역 유지들이 나서서 한마디씩 자랑을 하고 서울에서 연예인을 불러와 공연을 연 뒤 마지막으로 불꽃놀이를 벌이는 것은 어디에서나 비슷하다. 빠지지 않는 것이 특산물이나 먹을거리 장터인데 지역 특색을 내세우지만 큰 차이가 없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의 측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단체장들이 지역축제를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다 보니 규모가 커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축제를 통한 문화의 재생산 기능보다는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먹고 마시는 놀이 기능이 강조되기 십상이다. 축제의 개성과 특색이 없다 보니 외부 관광객도 초창기처럼 많지 않아 ‘그들만의 잔치’에 머물고 있다. 단체장이 생색은 내지만 결국 행사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치르는 것이고 적자가 나면 고스란히 주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무리를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축제가 문화의 소비기능이라면 지자체들은 지역축제에 신경 쓰는 만큼 문화의 생산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힘을 써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 지자체들은 낙제점이다. 여러 예를 들 것도 없이, 대표적인 문화의 생산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전국적으로 460여 곳에 불과하다. 유럽의 공공도서관은 인구 4000명당 1개꼴로 누구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유럽에는 특색 있는 지역축제도 많지만 도서관 같은 문화의 생산기능도 함께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꼴로 말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흥청거림 방조하는 정부 ▼
사회 전반적으로 ‘가벼운 문화’가 판을 치는 것이 지자체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이 같은 문화적 불균형이 우리의 문화기반을 더 위축시키고 있다. ‘가벼운 문화’와 ‘진지한 문화’가 같이 발전해야 문화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문화 편중을 바로잡는 역할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진지한 문화’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돈 되는 문화’에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흥청거리는 ‘축제공화국’을 방조하고 있는 꼴이다.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동아광장 >
-

오늘과 내일
구독
-

함께 미래 라운지
구독
-

DBR
구독
트렌드뉴스
-
1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2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3
‘나홀로집에 케빈 엄마’ 캐서린 오하라 별세…향년 71세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6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7
‘강남 결혼식’ 식대 평균 9만원 넘어…청첩장이 두렵다
-
8
1차로에 쓰러진 남성 밟고 지나간 60대 운전자, ‘무죄’…이유는?
-
9
경찰도 몰랐다…SNS 난리 난 日 ‘할머니 표지판’
-
10
주식 혐오했던 김은유 변호사, 53세에미국 주식에서 2100% 수익률 달성한 사연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6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7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8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9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10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트렌드뉴스
-
1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2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3
‘나홀로집에 케빈 엄마’ 캐서린 오하라 별세…향년 71세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6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7
‘강남 결혼식’ 식대 평균 9만원 넘어…청첩장이 두렵다
-
8
1차로에 쓰러진 남성 밟고 지나간 60대 운전자, ‘무죄’…이유는?
-
9
경찰도 몰랐다…SNS 난리 난 日 ‘할머니 표지판’
-
10
주식 혐오했던 김은유 변호사, 53세에미국 주식에서 2100% 수익률 달성한 사연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6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7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8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9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10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9/13326243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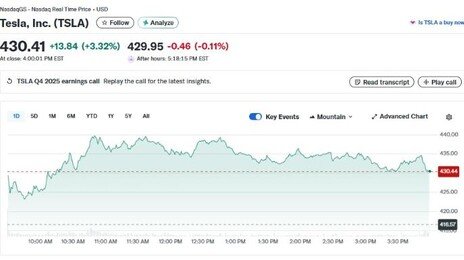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