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청계천, 우리곁으로]서울 보듬은 물길, 藝人가슴 적시고…
-
입력 2005년 9월 13일 03시 07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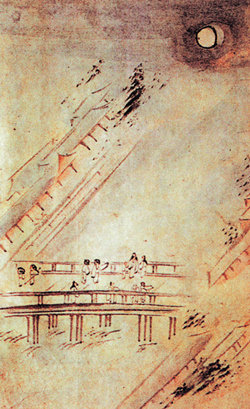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에서 발원해 서울 중심부를 관통하는 청계천. 조선시대에는 하천을 경계로 북촌엔 문반(文班)이, 남촌엔 무반(武班)이 모여 살았다. 일제강점기엔 청계천변은 북촌과 남촌의 완충지대로 서울 보통 시민이 고단한 삶을 꾸려온 생존의 현장이었다. 조선시대 부자들도, 일제강점기 다방골 기생들도, 다리 밑의 걸인들도, 산업화시대 공장의 ‘시다’들도 청계천에 저마다의 흔적을 남겨 놓았다.
삶이 있으면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그림이 있기 마련. 예로부터 청계천은 문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보고(寶庫)였다. 길지는 않지만 다채로운 표정을 지닌 이 하천에서 소설가 시인 화가들은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
조선시대엔 청계천의 활기와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묘사한 글과 그림이 풍성했다. 겸재 정선(謙齋 鄭敾)은 1739년 현재의 종로구 청운동 52 일대를 중심으로 청계천 주변의 장관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청풍계(淸風溪)’를 그렸다. 그는 이 일대가 ‘골이 깊고 그윽하며 물 맑고 바위 좋은 경치가 있어 더울 때 소풍하기에 가장 좋다’고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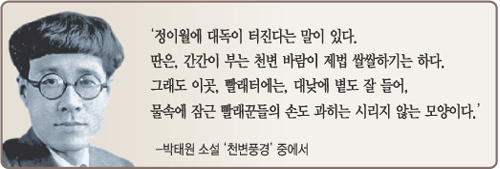 |
하지만 근대 이후 청계천 문학이나 그림은 천변의 음울한 풍경에 주목했다.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1930년대 서울 중산층과 하층민 삶의 애환을 다룬 박태원(朴泰遠·1909∼1987)의 소설 ‘천변풍경’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정이월에 대독이 터진다는 말이 있다. 딴은, 간간이 부는 천변 바람이 제법 쌀쌀하기는 하다. 그래도 이곳, 빨래터에는, 대낮에 볕도 잘 들어, 물속에 잠근 빨래꾼들의 손도 과히는 시리지 않는 모양이다.’
광복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청계천은 ‘난민수용소’처럼 변했다. 6·25전쟁을 서울에서 겪은 소설가 김원일(金源一)은 당시를 회고하는 칼럼에서 ‘그해 여름 엄마를 따라 식용품을 구하러 수다리 부근 난전(亂廛)에 나갔다가 시체 몇 구가 쓰레기 더미 하천 바닥에 버려진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썼다.
 |
시사만화 ‘고바우’로 유명한 김성환(金星煥) 화백이 그린 1950년대 후반 청계천 풍경에는 빈대떡집과 사창가, 천변 사람들과 행인들이 마치 조선시대 풍속화처럼 해학적인 모습으로 나온다. 가슴이 드러나는 저고리를 입고 빨랫감을 머리에 인 채 천변으로 가는 아낙, 더러운 것도 아랑곳없이 물속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등이 그려진 그의 그림은 따뜻하다.
일본의 대표적 보도 사진작가인 구와바라 시세이(桑原史成·68) 씨는 1960년대 청계천의 모습을 낱낱이 앵글에 담았다. 천변의 목조 가설물 위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과 그 아래에서 물장난하는 아이들, 3층짜리 수상(水上) 판잣집 난간에 나와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양치질하는 사람…. 사진 속 판자촌은 가난함과 누추함으로 가득했지만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모두가 밝다. 그래서 정겹고 애틋하다.
청계천 복개 공사는 1958년부터 1977년까지 20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청계피복노동자 청년 전태일(全泰壹)이 자신의 육신을 태운 것은 1970년이었다. 소설가 박태순(朴泰洵)은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 사건 상황을 현장 취재해 르포를 썼다(여성동아 1970년 12월호).
민주화시대가 열리고 경제적 풍요가 서울을 덮었지만 청계천은 여전히 꽉 막히고 뒤틀린 대도시의 신음이 묻히는 곳이었다.
이 거리를 시인들은 때로 한숨에 젖어, 때로 쓸쓸함에 잠겨 걸었다.
‘퇴계로에서 을지로를 지나고 청계천을 걸어가는 동안/중부시장 행상인들이 잡아당기는 밧줄,/오늘따라 무인도가 유달리 바다 위로 치솟아 보였다/눈마저 내리지 않는 외롭고 캄캄한 날/인파의 물살을 허우적이며/퇴계로에서 을지로로 노를 젓는 동안/내 돛대 위에 흐느끼던 깃발은 가만히 아래로 떨어져 내리고/무인도는 점점 커다랗게 떠올라와 있었다….’(김종해·金鍾海 ‘무인도를 위하여’·1991년)
‘청계천 평화시장 앞,/지천으로 깔린 평화,/철지나 시세 잃은 평화,/전 품목 바겐세일 80%!/아직은,/공(空)이 아니다/…/아가씨, 평화 백원어치만 줘 봐요.’(이준후·李俊厚 ‘아우라지, 추억에 대하여’·1999년)
새로운 세대가 보는 청계천은 어떤 모습일까.
2003년 7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물 위를 걷는 사람들-청계천 프로젝트’ 전. 세대별로 다양한 미술인 42명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허름한 판잣집이 가득했던 옛 청계천을 체험한 원로부터 고가도로만으로 청계천을 떠올리는 20대까지, 청계천에 대한 각기 다른 기억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품은 새로운 청계천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담았다.
‘눈부신 햇살이 아름다운 거리에/오고가는 사람들 흥겹게 노래한다/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웃음꽃 피우네….’
국민가수 조용필(趙容弼)이 작사 작곡한 ‘청계천’의 가사처럼 이제 청계천은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공간이 된다. 수백 년간 도시생활의 찌꺼기를 실어 나르다 만신창이가 되어 끝내 콘크리트 아래로 버림받았던 청계천이 다시 생명의 숨길을 내뿜고 있다. 청계천을 사색의 공간, 발랄한 문화의 향기가 넘쳐 나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허문명 기자 angel@donga.com
청계천, 우리곁으로 >
-

현장속으로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트렌드뉴스
-
1
李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은 안돼”…추미애 법사위 겨냥?
-
2
“이란 우라늄 찾아라”…특수부대 공중침투 ‘허니 배저 작전’ 거론
-
3
‘도쿄의 기적’ 韓, 경우의 수 뚫고 17년만에 WBC 8강
-
4
“핵폭탄 11개분 우라늄 제거” 美항공기 100대-2400명 투입하나
-
5
바늘 구멍 ‘경우의 수’ 뚫었다… 17년만에 WBC 8강
-
6
종로3가역 승강장에 3억 돈가방…한밤 순찰 역무원이 발견
-
7
트럼프 “전쟁 끝나가고 있다…호르무즈 장악도 고려”
-
8
미군 유해 송환식서 흰색 야구모자 쓴 트럼프, 부적절 논란
-
9
“왜 나만 늙었지?”…서울대 명예교수가 꼽은 ‘피부노화 습관’ [노화설계]
-
10
의총서 침묵한 장동혁…‘절윤 결의문’엔 “총의 존중”
-
1
국힘 공관위, 오세훈 겨냥 “후보 없더라도 공천 기강 세울 것”
-
2
의총서 침묵한 장동혁…‘절윤 결의문’엔 “총의 존중”
-
3
[천광암 칼럼]“尹이 계속했어도 주가 6,000”… 정말 가능했을까
-
4
李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은 안돼”…추미애 법사위 겨냥?
-
5
李 “정유사·주유소 담합과 매점매석, 이익의 몇배로 엄정 제재”
-
6
성토 쏟아져도 침묵한 장동혁, 절윤 결의문엔 대변인 짧은 입장만
-
7
빗장풀린 주한미군 무기 차출… “통보-협의 절차도 축소할듯”
-
8
이란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 선출”…美와 화해 멀어졌다
-
9
“자식이 부모 모실 필요 없다” 48%…18년만에 두 배로
-
10
한동훈 “반도체 사이클 있는데…코스피 자화자찬할 일 아니다”
트렌드뉴스
-
1
李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은 안돼”…추미애 법사위 겨냥?
-
2
“이란 우라늄 찾아라”…특수부대 공중침투 ‘허니 배저 작전’ 거론
-
3
‘도쿄의 기적’ 韓, 경우의 수 뚫고 17년만에 WBC 8강
-
4
“핵폭탄 11개분 우라늄 제거” 美항공기 100대-2400명 투입하나
-
5
바늘 구멍 ‘경우의 수’ 뚫었다… 17년만에 WBC 8강
-
6
종로3가역 승강장에 3억 돈가방…한밤 순찰 역무원이 발견
-
7
트럼프 “전쟁 끝나가고 있다…호르무즈 장악도 고려”
-
8
미군 유해 송환식서 흰색 야구모자 쓴 트럼프, 부적절 논란
-
9
“왜 나만 늙었지?”…서울대 명예교수가 꼽은 ‘피부노화 습관’ [노화설계]
-
10
의총서 침묵한 장동혁…‘절윤 결의문’엔 “총의 존중”
-
1
국힘 공관위, 오세훈 겨냥 “후보 없더라도 공천 기강 세울 것”
-
2
의총서 침묵한 장동혁…‘절윤 결의문’엔 “총의 존중”
-
3
[천광암 칼럼]“尹이 계속했어도 주가 6,000”… 정말 가능했을까
-
4
李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은 안돼”…추미애 법사위 겨냥?
-
5
李 “정유사·주유소 담합과 매점매석, 이익의 몇배로 엄정 제재”
-
6
성토 쏟아져도 침묵한 장동혁, 절윤 결의문엔 대변인 짧은 입장만
-
7
빗장풀린 주한미군 무기 차출… “통보-협의 절차도 축소할듯”
-
8
이란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 선출”…美와 화해 멀어졌다
-
9
“자식이 부모 모실 필요 없다” 48%…18년만에 두 배로
-
10
한동훈 “반도체 사이클 있는데…코스피 자화자찬할 일 아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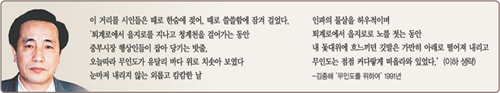
![[청계천, 우리곁으로] D-17 새물을 기다리는 사람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5/09/14/6953952.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