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책의 향기]암울했던 시대, 청춘을 위로한 시인의 자기고백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그때 그 베스트셀러]1994년 종합베스트셀러 5위(교보문고 기준)
◇서른, 잔치는 끝났다/최영미 지음/128쪽·8000원·창비

아주 드물지만 어떤 유행어는 코미디언이나 아름다운 배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문학 작품에서 연원되기도 한다. 1994년, 서른세 살 젊은 시인이 출간한 첫 시집이 이 뜻밖의 현상을 만들었다. 시인의 이름은 최영미, 시집 제목은 ‘서른, 잔치는 끝났다’. 조금이라도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서른 살에서 반사적으로 잔치를 연상할 정도였다.
그렇다고 이 시집이 단지 매력적인 제목으로 돌풍을 일으킨 건 아닐 것이다. 말장난이나 사춘기적 감성과는 거리가 먼 문학적인 시집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시집에 수록된 쉰여섯 편의 시에서 찾아야 할 테다.

물론 시집이 인기를 끈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 시집이 출간된 1994년은 기나긴 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막 들어선 때였다. ‘잔치’는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던 혁명이기도 한 셈이다. 이 전환의 시대에 최영미는 시집 표제작에 이렇게 썼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내가 운동보다도 운동가를/술보다도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는 걸’….
잔치(혁명)는 끝났다는데 제대로 끝낸 건지 알 수 없어 다들 조금씩은 회의감에 젖어 있던 때, 젊은 시인의 이 고백은 시대적 호응을 얻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살아남은 것은 슬픔이 아니라 배고픔이라는 직설에서(‘살아남은 자의 배고픔’) 나만이 순수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위로를 얻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1995년 미성년을 벗어나 대학생이 됐다. 대학에 들어가 보니 혁명은 흔적조차 희미했고 싸울 대상은 불분명했다. 개인이 곧 신념이자 윤리인 시대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세월은 부지런히 흘렀고, 운동가를 부를 줄 알던 사람들은 이제 중장년이 돼 서른 살은 잔치가 끝난 나이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새파란 청춘이라고 말한다.
조해진 소설가
그때 그 베스트셀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손효림의 베스트셀러 레시피
구독
-

딥다이브
구독
트렌드뉴스
-
1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2
이정후 美공항서 일시 구금…前하원의장까지 나서 풀려났다
-
3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4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5
수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찾았다…핵심은 ‘이것’
-
6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7명 법무연수원 좌천
-
7
與 합당 제안에…조국 “국민 뜻대로” 당내 논의 착수
-
8
[속보]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9
李대통령 지지율 59%…부동산 정책은 “부정적” 47%
-
10
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한 이진관, 박성재-최상목 재판도 맡아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4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5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6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7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8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
9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10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트렌드뉴스
-
1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2
이정후 美공항서 일시 구금…前하원의장까지 나서 풀려났다
-
3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4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5
수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법 찾았다…핵심은 ‘이것’
-
6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7명 법무연수원 좌천
-
7
與 합당 제안에…조국 “국민 뜻대로” 당내 논의 착수
-
8
[속보]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9
李대통령 지지율 59%…부동산 정책은 “부정적” 47%
-
10
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한 이진관, 박성재-최상목 재판도 맡아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
4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5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6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
7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
8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
9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10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日본질 꿰뚫은 이어령의 통찰력](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9/12/14/9879901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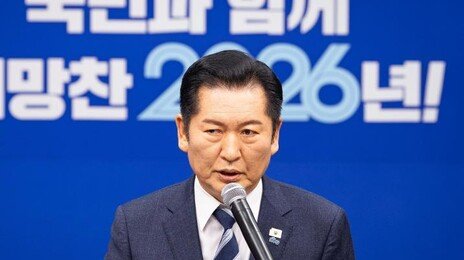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