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2500년 전 돌널무덤 속의 주인공을 보는 날이 닥쳤다. 그 속에는 영감님 한 분이 긴 돌칼을 옆에 차고 누워 계셨다. (…) 그런데 떨어지는 빗방울과 더불어 그나마 남아 있던 희미한 육신의 흔적이 자취도 없이 점점이 사라지는 위를 낙엽이 덮는 것이었다. 고고학에 종사하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기 마련인 ‘죽은 자와의 대화’에서 느끼는 묘한 적막한 낭만이야말로 아마도 고고학자를 계속 현장으로 떠돌게 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석기시대 민족논의는 난센스
고고학은 겉에서 보기엔 ‘낭만적인’ 학문이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모험이나 보물찾기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 현실에서 고고학은 ‘3D 업종’이다. “흙구덩이에서 하루해를 보내고 저녁이면 독한 막소주나 막걸리 사발에 곯아떨어져 자고 하는 생활을 몇 주나 몇 달쯤 반복하다 보면 약간은 ‘맛이 가기’ 마련이다.”
고고학이 가진 매력도 무궁무진하다. 죽은 자와의 대화도 그 중 하나다.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고고학에 얽힌 에피소드와 문제점 등을 편안하게 풀어낸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고고학 유물로 대우받는 경기 연천군 전곡리의 아슐리안식 주먹도끼를 보자. 저자는 주먹도끼가 가진 의의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단 뒷얘기를 통해 자연스레 존재를 각인시킨다. 미국 공군 하사관 그렉 보웬이 애인이랑 한탄강 유원지에 놀러갔다가 주먹도끼를 발견한 과정, 이후 프랑스 보르도대학을 통해 서울대 고고학과와 이어진 인연 등을 흥미롭게 펼쳐낸다. 즉 ‘이선복 교수의…’는 고고학에 대한 정보보다 이해를 돕는 데 주력하는 책이다.
특히 저자가 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얘기하고자 하는 대목은 한국 고고학에서 자주 거론되는 ‘한민족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한국을 비롯해 북한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민족의 기원에 집착하는 경향이 크다.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 시절부터 각 민족의 원형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자가 볼 때 이는 고고학에 접근하는 가장 어리석은 태도다. 민족의 뿌리를 중시하는 쪽에선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사실 구석기 신석기가 ‘민족’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겨우 불을 발견하고 도구 쓰는 법을 배우던 시대와 민족 개념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현대인의 심리가 담긴 탓이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 정통설로 받아들여진 ‘한민족이 파미르 고원에서 기원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를 거쳐 한반도에 도착했다’는 것도 어떤 근거에 따르기보다 선입견에서 나온 추측일 가능성이 높다.
“민족 기원의 연구라는 주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 증거에 입각해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는 진지한 고고학적 연구 과제가 아니다. 한 사회가 이를 접근해 들어가는 사회적 기대치 내지는 왜 이 문제에 집착하는가 하는 패러다임 차원의 문제이다.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한민족의 기원이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정리부터 하지 않으면 논의는 계속 겉돌기만 할 것이다.”
이 책은 명쾌하다. 저자는 주류의 시각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이가 정설로 받아들이던 고고학의 여러 주제를 흔든다.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전반적인 논의를 짚지만 평범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설명한다. 고고학을 답답하고 재미없는 학문이라는 편견을 가졌던 이들도 다시금 고고학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매력을 전한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헌법재판소 간 기후변화 소송… 청소년들, 정부와 ‘미래’를 다툰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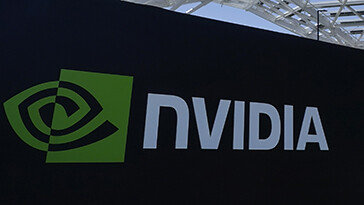
中 서버에 美가 수출 막은 반도체… 어디서 구했나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0분에 법안 2개 처리… 남은 임기 ‘입법 풀악셀’ 밟는 야당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