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라메드] “사람을 얼려서 치료한다고?” 저체온 치료의 비밀, 인공뇌사
-
입력 2015년 4월 20일 10시 40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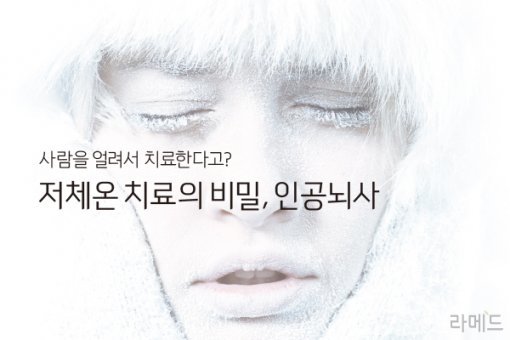
케이블음악방송 Mnet의 <언프리티랩스타> 7화에서 래퍼 치타가 언급한 ‘인공뇌사’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되었다. ‘인공뇌사’란 무엇인지,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병조 교수에게 들었다.
에디터 임종현 사진 Mnet 방송화면 캡쳐
치타는 본 방송에서 “17살 때 버스에 치여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2차 수술을 하는 방법과 인공뇌사를 하는 방법이 있었다”며 “내가 음악을 못 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할 거라는 걸 아셨던 부모님은 살 확률이 낮아도 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인공 뇌사를 선택하셨다”는 말을 했다.

치타가 방송에서 언급한 ‘인공뇌사’의 정확한 명칭은 ‘저체온치료’이다. 체온을 내려 생체의 대사 및 산소 소비량을 감소시켜 장기의 저산소 상태나 혈류 차단에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체온치료는 ‘혼수치료’라고도 불린다.
저체온치료는 체온을 내리는 정도에 따라 경도(32℃ 정도까지), 중등도 (32~26℃), 고도(26~20℃) 및 극심한 저체온(20℃ 이하)으로 나눈다. 치료방법으로는 체표면을 냉각하는 방법, 체강(동물의 체벽과 내장 사이에 있는 빈 곳) 냉각법 및 체외순환에 의한 혈액냉각법 등이 있다. 냉각을 위해 전신마취 또는 자율신경차단제 등을 사용하여 냉각에 대한 몸의 반응을 준비한 후 실시한다.
사람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심장이 마비돼서 혈액을 뿜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5분이 지나면 뇌세포는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심장이 다시 뛰게 되어 갑작스레 다량의 혈액이 뇌에 쏟아져 들어가면, 그 충격으로 뇌세포는 더 심하게 망가진다. 이때 체온을 하락시키면 온몸의 신진대사가 늦춰져서 이런 문제가 덜 생기는데, 저체온치료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전병조 교수는 “심정지 환자 중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에게 12~24시간 동안 체온을 32~34℃로 유지시키는 저체온치료를 시행한다”며 “이는 허혈(혈액의 유입이 어려워 일어나는 혈행 장애) 후 재관류 손상(갑자기 피가 공급되어 뇌와 장기에 손상을 입는 것)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저체온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뇌손상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물질의 생성과 분비가 억제되고 혈액-뇌 장벽이 보호되며 세포의 생존 에너지인 ATP(Adenosine TriphosPhate) 보전, 미세혈류 개선, 뇌압 감소, 산소자 유기 감소, 경련 억제 등 다양한 효과를 통하여 생존율과 신경학적 예후가 개선된다.
저체온치료로 목숨을 건진 이들
래퍼 치타 말고도 저체온치료 후 의식을 회복한 이들이 적지 않다. 작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삼성 이건희 회장도 약 60시간에 걸쳐 저체온치료를 받아 화제가 되었다.
2011년 5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신영록 프로축구 선수는 저체온치료의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신영록 선수는 경기 중 심장마비로 갑자기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의료진은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심장마비 후유증을 막기 위해 저체온치료와 수면치료를 진행했다. 저체온치료는 뇌기능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크게 높여준다.
신영록 선수는 쓰러진 이후 한 달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몇 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 약 2달 이후 기적처럼 깨어났다. 이는 의료진의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함께 저체온치료의 영향이 컸다.
2010년에는 체력 검정 도중 쓰러져 의식 불명에 빠진 50대 경찰관이 저체온치료를 통해 기적적으로 소생하기도 했다. 당사자인 박모 경위는 사고 당시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진 ‘임상적 사망’ 상태였다.
가천의대 길병원은 이에 저체온 치료를 적용, 박 경위의 뇌기능 저하를 줄이면서 의식 회복에 성공했다. 참고로 가천의대 길병원은 2002년에 저체온치료법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한 병원이다.
또한, 최근 광주지역 모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에 의식을 잃은 여대생이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저체온치료를 받고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하기도 했다.
32℃ 이하의 저체온치료는 부작용 우려 커져
저체온치료는 1850년대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피부암 수술에서 국소 부위의 종양을 얼려 죽이는 방법으로 처음 활용됐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뇌 손상 방지를 위해 저체온치료가 활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2년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심정지 환자의 뇌 손상 방지에 저체온요법이 효과 있다’는 논문이 실리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저체온 요법은 심정지 후 뇌 손상 치료에 효과가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정받는다. 저체온치료는 2010년, 미국 심장협회에 의해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후 심장박동이 돌아오면 원칙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심정지 치료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더불어 저체온치료는 심정지 외에도 뇌졸중, 외상성뇌손상, 척수손상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고 있다.
전병조 교수는 “학계에 보고된 저체온 치료의 부작용은 서맥성 부정맥 발생, 감염 기회 증가, 혈액 응고장애, 전해질 불균형, 고혈당, 신장 기능 저하, 젖산 산혈증, 췌장염, 혈소판 감소 등”이라며 “이러한 부작용은 32℃ 이하의 중등도 저체온 유도 시 발생이 증가하며, 우리나라에서 심정지 환자에게 주로 적용하고 있는 경도(32℃ 정도까지) 저체온치료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와 정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엠미디어(M MEDIA) 라메드 편집부(www.remede.net ), 취재 임종현 기자(kss@egihu.com)
트렌드뉴스
-
1
미군 공중급유기 이라크 상공서 추락…“격추된 건 아니다”
-
2
한동훈 “내가 배신자? 나를 발탁한 건 尹 아닌 대한민국”
-
3
“숨겨진 자산인 줄 알았는데 6000만원 빚”…주린이 울린 미수거래
-
4
“장동혁 비판자를 선대위장에”…국힘 소장파 ‘리더십 교체’ 목청
-
5
아스팔트 뚫고 ‘거대 철기둥’ 13m 솟구쳐…“이게 무슨일?”
-
6
낡은 집 바닥 뜯었더니 금화 400개 쏟아져…“7억원 가치”
-
7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땅,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리겠다” 망언
-
8
두달전 외동딸 얻은 40대 아빠 쓰러져…장기기증으로 5명 살렸다
-
9
‘검찰 개혁’ 갈라진 與… “대통령 협박” “李도 배신자” 정면충돌
-
10
파괴되는 美첨단무기들…리퍼 11대-1조원 넘는 레이더도 잃어
-
1
국민 70% “국힘 비호감”…민주는 ‘호감’이 50%로 올라
-
2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전격 사퇴…“제 생각 추진 어려워”
-
3
한동훈 “내가 배신자? 나를 발탁한 건 尹 아닌 대한민국”
-
4
오세훈 “오늘은 공천 등록 못한다, 선거는 참여”…절윤 배수진
-
5
친명, 김어준과 선긋기… 유튜브 출연 취소하고 “법적조치” 성토
-
6
오세훈 “인적 쇄신” 공천 신청 또 보이콧… 당권파 “플랜B 있다”
-
7
“장동혁 비판자를 선대위장에”…국힘 소장파 ‘리더십 교체’ 목청
-
8
‘보수의 심장’ TK도 뒤집혔다…민주 29%, 국힘 25% 지지
-
9
靑직원 또 쓰러지자, 李 “나를 악덕 사업주라고…”
-
10
윤희숙 “이순신은 12척으로 싸워…오세훈 전장으로 가야”
트렌드뉴스
-
1
미군 공중급유기 이라크 상공서 추락…“격추된 건 아니다”
-
2
한동훈 “내가 배신자? 나를 발탁한 건 尹 아닌 대한민국”
-
3
“숨겨진 자산인 줄 알았는데 6000만원 빚”…주린이 울린 미수거래
-
4
“장동혁 비판자를 선대위장에”…국힘 소장파 ‘리더십 교체’ 목청
-
5
아스팔트 뚫고 ‘거대 철기둥’ 13m 솟구쳐…“이게 무슨일?”
-
6
낡은 집 바닥 뜯었더니 금화 400개 쏟아져…“7억원 가치”
-
7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땅,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리겠다” 망언
-
8
두달전 외동딸 얻은 40대 아빠 쓰러져…장기기증으로 5명 살렸다
-
9
‘검찰 개혁’ 갈라진 與… “대통령 협박” “李도 배신자” 정면충돌
-
10
파괴되는 美첨단무기들…리퍼 11대-1조원 넘는 레이더도 잃어
-
1
국민 70% “국힘 비호감”…민주는 ‘호감’이 50%로 올라
-
2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전격 사퇴…“제 생각 추진 어려워”
-
3
한동훈 “내가 배신자? 나를 발탁한 건 尹 아닌 대한민국”
-
4
오세훈 “오늘은 공천 등록 못한다, 선거는 참여”…절윤 배수진
-
5
친명, 김어준과 선긋기… 유튜브 출연 취소하고 “법적조치” 성토
-
6
오세훈 “인적 쇄신” 공천 신청 또 보이콧… 당권파 “플랜B 있다”
-
7
“장동혁 비판자를 선대위장에”…국힘 소장파 ‘리더십 교체’ 목청
-
8
‘보수의 심장’ TK도 뒤집혔다…민주 29%, 국힘 25% 지지
-
9
靑직원 또 쓰러지자, 李 “나를 악덕 사업주라고…”
-
10
윤희숙 “이순신은 12척으로 싸워…오세훈 전장으로 가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