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현대 위기 물밑엔 '家臣갈등' 있었다
-
입력 2000년 11월 9일 18시 49분
글자크기 설정
재벌 2, 3세가 이끄는 그룹의 경우 전문경영인들의 보좌가 중요한데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존망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는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대그룹의 경우 일부 전문경영인들은 2세 사이의 갈등관계를 조장, 자신들의 권력확장에 악용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익치의 독주〓흔히들 정몽헌(鄭夢憲·MH)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의 측근이라고 하면 이익치(李益治)전 현대증권회장, 김윤규(金潤圭)현대건설사장, 김재수(金在洙)구조본부장 등을 꼽는다. 현대의 핵심인사들은 이와 관련, “세명이 측근인 것은 맞지만 세사람의 위상은 현격한 차이가 난다”며 “정회장의 브레인은 이전회장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영향력이 컸다”고 말했다.
최근 MH가 미국에서 귀국할 때도 MH와 함께 있던 이전회장은 만류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김윤규사장 김재수본부장이 이전회장과 충돌하면서 “회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극언, MH가 귀국했다는 것이 현대 임원의 증언이다. 이전회장의 현대건설 사태에 대한 인식과 증권회장직을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
이전회장은 90년대 들어 현대의 금융권 진출, 대북 사업,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등 현대그룹 핵심현안의 항상 가운데에 서 있었다. MH도 대북 사업을 성공시켜 자신을 현대그룹의 대권을 이어받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준 이전회장을 총애해왔다.
그러나 이전회장이 주도한 사업들은 결국 MH 관련사들이 휘청거리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윤규 현대건설사장에 대한 지적도 많다.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덩치가 큰 회사가 현금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과감한 위기관리가 필요한데 엔지니어 출신으로 ‘관리’에 약한 김사장이 취임한 것이 악수였다는 것. 건설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도 북한을 드나들고 왕회장의 시중을 드는 등 김사장의 처신도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도 많다.
▽가신들의 갈등이 불러온 ‘왕자의 난’〓현대건설의 신뢰성 위기를 불러온 ‘왕자의 난’도 가신들의 갈등이 촉발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이전회장이 MH의 신임을 전적으로 받으면서 당시 전문경영인중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던 종합기획실의 박세용(朴世勇)회장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결국 99년 현대전자 주가 조작사건으로 이전회장과 박회장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전회장이 그룹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박회장과 ‘박회장이 자신만을 위해 몸을 사린다’는 이전회장의 논리가 부닥친 것.
결국 MH는 박회장을 인사조치시켜 정몽구(鄭夢九·MK)회장의 계열사로 보내고 이전회장은 위세는 절정에 이른다.
올 3월 MK측이 MH가 해외에 나간 사이 이전회장을 고려산업개발회장으로 발령을 내면서 결국 가신들의 갈등은 왕자의 난으로 확전돼 모두가 경영권 분쟁에 골몰했다. “시장의 심판이라는 진짜 위기가 오고 있다”고 직언하는 가신은 아무도 없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트렌드뉴스
-
1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2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3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4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5
與초선 28명도 “대통령 팔지 말고 독단적 합당 중단하라”
-
6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외파병 간다…태국 ‘코브라골드’ 파견
-
7
집값 잡으려 ‘갭투자 1주택’도 규제할듯… “매물 되레 줄것” 전망도
-
8
[횡설수설/이진영]82세에 6번째 징역형 선고받은 장영자
-
9
“고수익 보장”에 2억 맡긴 리딩방 전문가, AI 딥페이크였다
-
10
고교 중퇴 후 접시닦이에서 백만장자로…“생각만 말고 행동하라”[손효림의 베스트셀러 레시피]
-
1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2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3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4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5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6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7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8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9
[단독]美투자사 황당 주장 “李정부, 中경쟁사 위해 美기업 쿠팡 공격”
-
10
李 “코스피 올라 국민연금 250조원 늘어…고갈 걱정 안해도 돼”
트렌드뉴스
-
1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2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3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4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5
與초선 28명도 “대통령 팔지 말고 독단적 합당 중단하라”
-
6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외파병 간다…태국 ‘코브라골드’ 파견
-
7
집값 잡으려 ‘갭투자 1주택’도 규제할듯… “매물 되레 줄것” 전망도
-
8
[횡설수설/이진영]82세에 6번째 징역형 선고받은 장영자
-
9
“고수익 보장”에 2억 맡긴 리딩방 전문가, AI 딥페이크였다
-
10
고교 중퇴 후 접시닦이에서 백만장자로…“생각만 말고 행동하라”[손효림의 베스트셀러 레시피]
-
1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2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3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4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5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6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7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8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9
[단독]美투자사 황당 주장 “李정부, 中경쟁사 위해 美기업 쿠팡 공격”
-
10
李 “코스피 올라 국민연금 250조원 늘어…고갈 걱정 안해도 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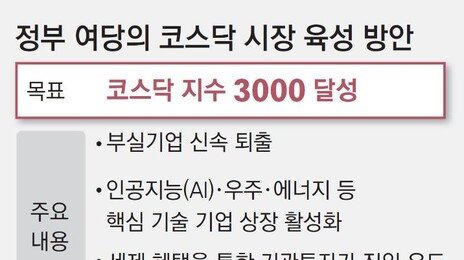

![“김밥이랑 스시는 다른데”…‘김밥김’에 ‘스시앤롤’ 표기 논란 [e글e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16795.3.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