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민 친화사업 펼치는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절에서 축제 열고 이장회의에도 나가 “대중 멀리하면 부처님 마음이 아니죠”
“사람들 마음이 머물지 않고 발걸음 없는 절은 죽은 곳”

“문화축제라지만 대웅전 앞에서 ‘똥꼬 춤’을 추는데 ‘싫어라’ 하는 스님들도 많지라. 말사(末寺) 주지나 참석할 이장 회의에 본사 주지가 가는 것도 그렇고….”
27일 전북 고창 선운사(禪雲寺) 입구에서 만난 이성수 총무과장의 말이다. 귀동냥한 택시 운전사의 말도 있다. “선운사 하면 동백꽃이제. 백양사 내장사, 이렇게 합쳐서 트라이앵글인디, 주지 스님 바뀐 뒤 선운사가 젤 많이 바뀌어 버렸어.”
1500년 고찰(古刹)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조계종 25개 본사 주지 스님 중 최연소인 법만(法滿·48·사진) 스님은 대웅전 뒤 수리봉에 절집 이름처럼 선운(禪雲)이 감돈다며 운을 뗐다.
스님은 2007년 주지로 취임하자마자 창고로 사용하던 대웅전 앞 만세루를 다실로 바꿨다. 신도들은 대웅전 바로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절 전체를 볼 수 있게 됐다. 다리품을 팔거나 허리 숙여 불심을 표하는 사찰 분위기에서는 파격적인 변화다. 최근에는 일주문에서 극락교까지 400여 m에 장애인 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생명 일반이 생로병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두 부처님의 법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이들도 자신의 힘으로 좋은 꽃을 보고, 쉽게 부처님을 만나야죠.”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절에서 찾아가는 사찰로 바뀐 것. 그 키워드는 지역과 문화다. 5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전체 예산의 5분의 1을 지역 복지와 문화사업에 쓰고 있다. 9월 개최하는 선운문화축제에서는 시와 노래, 춤이 어우러진다. 스님은 또 인근 ‘미당 서정주 시문학관’ 이사장이자 주변 4개 면 이장들이 참여하는 이장회의 멤버다.
“20여 년 선방 수좌로 살다 절집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주지 결심을 냈습니다. 수행은 기본이죠. 이 핑계로 대중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 아닙니다. 민심이 불심이고, 불심이 민심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머물지 않는, 발걸음이 없는 절은 죽은 곳입니다.”
스님은 평소 말이 어눌해 ‘어∼ 스님’으로 불리지만 불교의 변화를 강조할 때는 거침이 없었다.
1982년 전북대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이던 스님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풀기 위해 절로 들어갔다.
“한 학기 공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30년이 코앞입니다. 손만 뻗으면, 눈만 크게 뜨면 경계를 넘어설 듯한 때도 있었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만법귀일(萬法歸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듯, 불교 신도가 아닌 분들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스님은 최근 종단 내 갈등에 대해 “말로 개혁을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남아 있는 탐욕이 문제”라며 “마음을 비우는 공심(空心)과 자신을 낮추는 하심(下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창=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트렌드뉴스
-
1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2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3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4
최태원 “SK하이닉스 이익 1000억달러 전망? 1000억달러 손실 될수도”
-
5
급매 쏟아진 강남, 현금부자들 ‘줍줍’…대출 막힌 강북은 버티기
-
6
“하메네이에 죽음을” 이란 시위 재점화…美 군사개입 빨라지나
-
7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8
김용범 “LTV 축소-만기 차등화”…다주택자 대출 축소 시사
-
9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동참하면 보복하겠다”
-
10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
1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李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
4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5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6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브라질 영부인, 김혜경 여사에 “삼바 축제 방문해달라”
-
9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10
조승래 “8곳 단체장 ‘무능한 尹키즈’…6·3 선거서 퇴출할 것”
트렌드뉴스
-
1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2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3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4
최태원 “SK하이닉스 이익 1000억달러 전망? 1000억달러 손실 될수도”
-
5
급매 쏟아진 강남, 현금부자들 ‘줍줍’…대출 막힌 강북은 버티기
-
6
“하메네이에 죽음을” 이란 시위 재점화…美 군사개입 빨라지나
-
7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8
김용범 “LTV 축소-만기 차등화”…다주택자 대출 축소 시사
-
9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동참하면 보복하겠다”
-
10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
1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李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
4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5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6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브라질 영부인, 김혜경 여사에 “삼바 축제 방문해달라”
-
9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10
조승래 “8곳 단체장 ‘무능한 尹키즈’…6·3 선거서 퇴출할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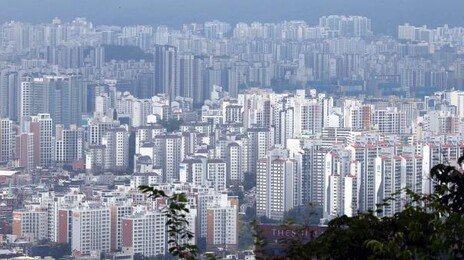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