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배용준이 직접 쓴 일상의 에세이 &전통요리 레시피 2가지
- 동아닷컴
-
입력 2010년 6월 9일 14시 48분
글자크기 설정
“역시 어머니의 아침 밥상이 최고”
[Star cooking]
평소보다 한참 늦게 눈을 떴다. 그래도 영 일어나기가 싫다. 허기가 느껴지지만 입 안은 까끌하다. 밤늦도록 일하다 물 먹은 솜처럼 늘어져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싶은 날이면, 누군가 억지로라도 깨워 군침 도는 구수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는 생기 넘치는 ‘밥상’을 차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누운 채로 떠올린 공허한 상상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어차피 매번 같은 결론이다. “오늘은~사먹자!”
제법 솜씨를 부릴 줄 아는, 자신 있는 요리도 있지만, 바깥에서 사먹는 음식에 익숙하다 보니 이렇게 종종 입맛을 잃을 때가 있다. 제아무리 공들여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이라도 가족의 사랑을 듬뿍 담은 밥상의 정성을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근사한 외식의 설레임과 특별한 맛의 놀라운 기쁨은 그것대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일상의 단순함이 큰 의미를 줄 수 있듯, 매일 차려먹는 단순 소박한 가정식이 내 활력의 근본이 아니었던가 싶다. 내 인생의 대부분은 집에서 먹는 단순한 밥과 반찬으로 채워졌던 것 아닌가.
시끄러운 일이 있건 힘든 일이 있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에 마주 보고 함께 앉으면 일상의 걱정 근심은 연기처럼 사라졌었다. 이겨낼 힘이 나게 했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온몸으로 화를 표현하고 있어도 그저 “밥 먹고 다시 자라”였다. 끼니는 거르지 말라는 어머니의 속정이었다. 그게 밥상의 묘한 힘이었던 기억이 난다. “밥심이 최고다.” 다른 것은 없고 오직 밥 먹는 것이 생활의 중심이라는 듯한 그 말이 어릴 땐 불만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식수 년간 혼자만의 생활을 지속해온 지금에 와선 고개가 끄덕여진다. 식구(食口), 함께 밥을 먹는 다는 것, 그게 가족의 다른 이름이 아니던가.
내가 20대에 부모님 품을 떠나 생활하게 된 것은 당신들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소소한 즐거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불효가 아니었나 싶어서 요즘은 부모님께 이것저것 부탁드리는 일이 잦다. 나는 예전에 많이 못해본 투정을 부리고, 또 부모님은 짐짓 타박하는 체도 하신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과 정을 주고받는 과정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다.

배용준이 직접 공개한 전통요리 레시피 2
준·비·재·료
오이 10개. 소금 적당량, 양념(다진 마늘 1큰술, 부추 200g, 쪽파·양파 100g씩, 고춧가루 4큰술, 멸치액적 2큰술, 설탕 1 1/2큰술, 소금 약간)
만·들·기
1 오이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양끝의 꼭지를 잘라내고 2등분 한 뒤 한쪽 끝을 조금 남기고 +자 모양으로 자른다.
2 잘라 놓은 오이에 소금 2큰술을 뿌리고 두 시간 정도 절인 뒤 체에 담아 물기를 뺀다.
3 부추, 쪽파, 양파를 1cm 크기로 썰고, 분량의 양념 재료를 넣고 잘 섞는다.
4 절인 오이에 양념을 적당히 넣고 용기에 담아 하루 정도 실온에 보관한 뒤 냉장고에 넣고 차게 해 먹는다.
나만의 김치전
준·비·재·료

1 김치는 소를 털어낸 다음 0.5cm 폭으로 잘게 썬다.
2 오징어는 몸통의 껍질을 벗겨 가로 0.2cm, 세로 0.3cm 크기로 곱게 채썰고, 다리는 발판을 제거한 다음 0.5cm 크기로 잘게 썬다.
3 양파는 껍질을 벗긴 뒤 흐르는 물에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곱게 채썬다.
4 볼에 잘게 썬 김치, 오징어, 양파, 달걀, 김칫국물, 밀가루, 물을 넣어 잘 겄은 뒤 간장과 소금으로 간한다.
5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④의 반죽을 1큰술 떠서 얇게 편 다음 중불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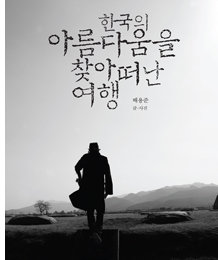
우리나라 각 분야의 대표 장인들과 전통 문화, 그리고, 볼거리 풍부한 각 지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풍경을 소박한 여행자 배용준의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배우 배용준의 다정다감한 감성으로 한국의 정취를 세심하게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잊히기 쉽고, 뒷전에 밀리기 쉬운 ‘옛것’. 현대적이지 않아 다소 낡아 보이기도 하고, 낯설어 보이기도 하는 ‘전통’을 배용준이 심오하고 깊이 있는 문화로 소개한다.
글&사진·배용준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에서 발췌
도움주신 곳 (주)시드페이퍼출판 02-3446-1512
정리·박미현<더우먼동아 에디터 aammy1@naver.com>
트렌드뉴스
-
1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2
美 “5개월 뒤 122조 필요 없게 될 것”…韓 “미국과 우호적인 협의 이어나갈 것”
-
3
남창희 9세 연하 신부, 무한도전 ‘한강 아이유’였다
-
4
與 “국힘 반대로 충남-대전 통합 무산 위기”… 지방선거 변수 떠올라
-
5
핵잠 건조 논의할 美협상단 방한 연기…‘관세 위법판결’ 후폭풍
-
6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
7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8
美, 이란 정밀 타격후 대규모 공격 검토… 韓대사관 ‘교민 철수령’
-
9
심장수술뒤 혈압 치솟던 강아지…머리에 ‘이것’ 얹자 ‘뚝’
-
10
1만명 뒤엉킨 日 ‘알몸 축제’ 사고 속출…3명 의식불명
-
1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2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3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4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5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
6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
7
119 구급차 출동 36%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씩 늦어져”
-
8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9
전현무, 순직 경관에 ‘칼빵’ 발언 논란…“숭고한 희생 모독” 경찰 반발
-
10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트렌드뉴스
-
1
‘1000억대 자산’ 손흥민이 타는 車 뭐길래…조회수 폭발
-
2
美 “5개월 뒤 122조 필요 없게 될 것”…韓 “미국과 우호적인 협의 이어나갈 것”
-
3
남창희 9세 연하 신부, 무한도전 ‘한강 아이유’였다
-
4
與 “국힘 반대로 충남-대전 통합 무산 위기”… 지방선거 변수 떠올라
-
5
핵잠 건조 논의할 美협상단 방한 연기…‘관세 위법판결’ 후폭풍
-
6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
7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8
美, 이란 정밀 타격후 대규모 공격 검토… 韓대사관 ‘교민 철수령’
-
9
심장수술뒤 혈압 치솟던 강아지…머리에 ‘이것’ 얹자 ‘뚝’
-
10
1만명 뒤엉킨 日 ‘알몸 축제’ 사고 속출…3명 의식불명
-
1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2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3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4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5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
6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
7
119 구급차 출동 36%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씩 늦어져”
-
8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9
전현무, 순직 경관에 ‘칼빵’ 발언 논란…“숭고한 희생 모독” 경찰 반발
-
10
‘절윤’ 공세 막은 국힘 ‘입틀막 의총’…당명개정-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끌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