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돈 - 性 등 경험적 대상 통해 근대성 탐구”
-
입력 2007년 2월 7일 02시 56분
글자크기 설정


《막스 베버와 함께 독일 사회학의 양대 시조로 꼽히는 게오르크 지멜의 선집(전 10권·도서출판 길) 1차분 3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200여 편에 이르는 지멜의 저술 중 국내에 소개된 것은 1980년대 영역본을 중역한 ‘돈의 철학’ 등 서너 권밖에 안된다. 이는 지멜이 조국인 독일에서조차 1980년대가 돼서야 조명을 받을 만큼 잊혀진 학자였기 때문이다.》
사회구조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베버와 달리 지멜은 돈, 유행, 음식, 성과 같은 일상적 주제에 천착한 미시적 사회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런 미시적 접근법은 구조와 체계를 강조한 19세기 후반 학계의 냉대를 받았다.
지멜의 진면목이 1980년대 빛을 본 이유는 근대성과 탈근대성이 학계의 화두로 부각되고 거대담론보다 일상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강조되면서다. 24권짜리 지멜 전집이 독일 주어캄프 출판사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이번 선집은 전집 중에서 문화, 근대 세계관의 역사, 예술, 공간과 도시, 윤리, 종교, 전쟁 등을 주제별로 묶어 펴낸 것이다. 그 작업의 핵심에 김덕영 독일 카셀대 연구교수가 있다.
김 교수는 카셀대에서 베버와 지멜을 비교 분석해 대학교수 자격논문(하빌리타치온)을 썼고 2004년 ‘짐멜이냐 베버냐?’(한울아카데미), 2005년 번역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새물결) 등을 통해 지멜 알리기에 주력해 왔다.
“지멜 저술 중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뭘까를 고민하다 근대성의 탐구라는 주제와 다양한 학문을 넘나드는 그의 학제적 사유체계를 보여 줄 수 있는 글을 먼저 골랐습니다. 그는 사회학자 이전에 칸트철학을 전공한 철학자였고 미학, 역사학, 심리학을 넘나들며 통합적 사유를 펼쳤습니다.”
독일에 체류 중인 김 교수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베버가 일상의 배후에 도사린 구조나 체계를 밝혀내는 데 주력했다면 지멜은 일상의 경험적 대상을 파고들어 배후에 놓인 총체적 의미를 밝혀내려 했다. 그런 점에서 지멜 사회학은 미시사회학이 아니라 경험과학과 철학의 접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집과 별도로 5월경 800쪽 분량의 연구서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를 펴내고, 독일어 원본을 번역해 ‘돈의 철학’ ‘렘브란트’ 등 지멜의 대작도 차례로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정해인, ‘쩍벌’ 서양인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논란도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5
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모자이크 사진’ 공개…무인점포 업주 벌금형
-
6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7
케데헌 ‘골든’ 만든 K팝 작곡가들, 그래미 품었다
-
8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9
리프트에 배낭 버클 끼여 공중 매달려…日스키장서 외국인女 사망
-
10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10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정해인, ‘쩍벌’ 서양인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논란도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5
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모자이크 사진’ 공개…무인점포 업주 벌금형
-
6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7
케데헌 ‘골든’ 만든 K팝 작곡가들, 그래미 품었다
-
8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9
리프트에 배낭 버클 끼여 공중 매달려…日스키장서 외국인女 사망
-
10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10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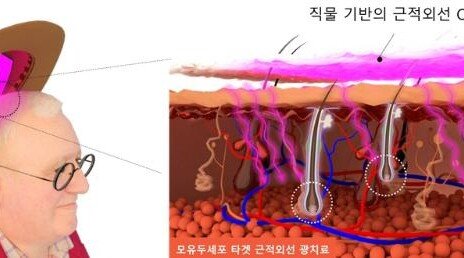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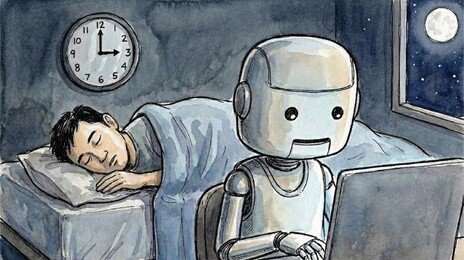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