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랑과 자비]따뜻한 눈물을 흘리자
-
입력 2005년 2월 25일 18시 47분
글자크기 설정

감동이 없는 메마른 가슴을 아파하며 울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없다. 스펄전은 가장 많이 울었기에, 19세기에 가장 강렬한 영향을 미친 목사가 되었던 것이다. 우는 것은 능력이다.
4복음서에는 모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다. 그중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차별성이 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누가 8:6)고 한다. 식물이 자라는 절대 조건은 습기다. 흙이 없어도 수경재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습기의 공급이 없으면 죽는다. 살리는 것은 습기에 있다.
사람의 감정도 식물과 마찬가지로 습기가 필요하다. 사람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울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사회의 많은 요소들이 말라 가는 것은 비판 부족 때문이 아니다. 습기 부족 때문이다.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사랑의 부족 때문이다. 눈물 없이 직언하면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눈물과 함께 직언하면 변화를 가져온다. 어머니의 질책 앞에서 자녀들이 상처를 입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울 수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 수용소에서 어떻게 견디었는가를 물었다. 그는 “나는 눈물과 한숨으로 견디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삶을 포기한 사람은 울지 않는다고 한다. 삶을 포기하면 경계심이 사라지고, 아끼던 모든 것도 낭비하더라고 한다. 그리고 죽더라는 것이다. 눈물 없는 사회, 습기 없는 사회는 메마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전진하는 사회가 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안타까워하며 우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지극히 약해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사회에 생명을 주는 구원자들인 것이다.
서울 청파동 삼일교회 목사 전병욱
사랑과 자비 >
-

유재영 기자의 보너스 원샷
구독
-

여주엽의 운동처방
구독
-

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
구독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3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4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5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정해인, ‘쩍벌’ 서양인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논란도
-
8
이란 영공 코앞에 뜬 美초계기… 하메네이 “공격땐 지역 전쟁”
-
9
“내 주인은 날 타이머로만 써”… 인간세계 넘보는 AI 전용 SNS 등장
-
10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3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4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5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정해인, ‘쩍벌’ 서양인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논란도
-
8
이란 영공 코앞에 뜬 美초계기… 하메네이 “공격땐 지역 전쟁”
-
9
“내 주인은 날 타이머로만 써”… 인간세계 넘보는 AI 전용 SNS 등장
-
10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랑과 자비]이동원 목사 “마음의 문부터 열자”](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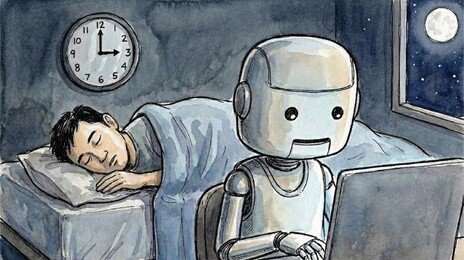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