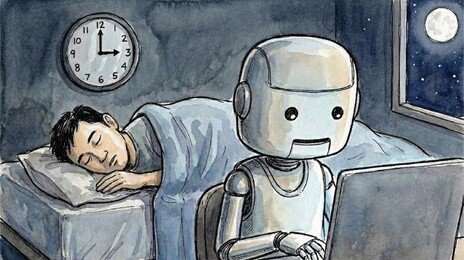공유하기
아시아 3국 엇갈린 2골
-
입력 2002년 6월 5일 01시 42분
글자크기 설정
한중일 3국의 희비가 엇갈렸다. 아시아 36억 인구의 성원 속에 4일 나란히 출전한 극동 3개국. 절묘하게도 시간대별로 아시아 축구의 위상이 점점 높아갔다.
먼저 선두주자로 나선 중국은 코스타리카전에서 전반전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도 후반 체력이 떨어지며 연속골을 내줘 완패했다.
그러나 아시아의 하늘은 일본 경기에서부터 개기 시작했다.
| ▼관련기사▼ |
일본은 유럽의 ‘붉은 악마’ 벨기에 수비진을 무너뜨리며 2골을 뽑아냈다. 비록 2-1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아쉽게 비겼지만 첫 출전한 98월드컵에서 3패를 당한 것을 기억하면 나름대로 선전했다. 무승부로 첫 승점(1)을 얻은 것도 의미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선 아시아의 희망 한국. 역대 월드컵에서 4무10패에 그쳤던 한국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나” 하는 전문가의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공수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펼치며 첫 승을 거둬 아시아인의 자존심을 세웠다.
이날 한국과 일본이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꺼운 미드필더진. 한국은 공격형 미드필더인 유상철과 수비형 미드필더인 김남일이 중원에서 끊임없이 뛰어다니며 상대를 견제,폴란드의 공수 흐름을 번번이 끊어놨고 일본 역시 나카타 히데토시와 오노 신지라는 걸출한 미드필더 때문에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아시아 3개국이 거둔 성적은 월드컵 출전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중국은 첫 출전의 부담 때문인지 경험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고 98년에 이어 두 번째 참가한 일본도 위기관리 능력에서 한계를 보여줬다. 하지만 5연속 출전 포함, 아시아 최다인 6회나 월드컵 본선에 오른 한국은 4연속 출전선수 홍명보를 비롯한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이 절묘한 하모니를 이뤄내며 마침내 첫 승리를 손에 거머쥐었다.
김상수기자 ssoo@donga.com
트렌드뉴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아가야 행복해야 해”…홈캠 속 산후 도우미 작별 인사에 ‘뭉클’
-
3
[속보]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4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5
복원한 로마 성당 천사 얼굴, 총리 닮았네…이탈리아 발칵
-
6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7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8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9
백인 부부 사이에서 흑인 아이 태어나…‘난임 클리닉’ 발칵
-
10
한화, 노르웨이 뚫었다…‘천무’ 1조3000억 수출 쾌거
-
1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2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8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9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10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트렌드뉴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아가야 행복해야 해”…홈캠 속 산후 도우미 작별 인사에 ‘뭉클’
-
3
[속보]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4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5
복원한 로마 성당 천사 얼굴, 총리 닮았네…이탈리아 발칵
-
6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7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8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9
백인 부부 사이에서 흑인 아이 태어나…‘난임 클리닉’ 발칵
-
10
한화, 노르웨이 뚫었다…‘천무’ 1조3000억 수출 쾌거
-
1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2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8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9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10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