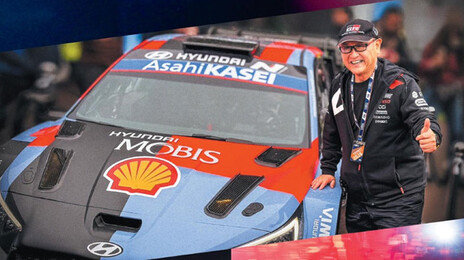공유하기
[문학신간]박완서 새 장편 '아주 오래된 농담'
-
입력 2000년 10월 27일 18시 51분
글자크기 설정

여태 어디서건 박완서 선생이 말을 많이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늘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편이다. 그러나 어떤 때, 그러니까 그 자리의 누군가 아니꼽게 굴거나 말이 안 되는 걸 우긴다거나 잘 난 체하거나 비열하고 치사하게 굴면, 그렇게 한다고 느끼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를 의식하게 된다. 틀림없이 일갈(一喝)을 해서 함께 자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불쾌감이나 언짢음을 말끔하게 청소해주는 것이다.
언제나 그런 경우에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셨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았다. 누구나 역겹지만 참아내는 걸, 그는 참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부분에 보내지는 갈채. 혹은 기다림. 어쩌면 십자가 같은 것이 그의 오래된 마력이다. 오래도록 가깝게 지내면서 내가 자신 있게 박완서 선생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이점이다. 누구나 아니꼽다고 느끼면서 차마 말 못 하는 것에 대해 참지 않는 건 그의 개성이고 당당함이며 힘이다.
그 힘. 동시대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 결코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어떤 권력과 어떤 명예도 어떤 금력도 그 힘과 대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힘이 칠순의 나이에도 시들거나 게을러지지 않은 건 물론 타협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고 확인시킨 소설이 바로 이번에 쓴 ‘아주 오래된 농담’이다.
호흡기내과 의사 심영빈과 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속물 근성은 이미 오래 전에 도스토예프스키가 ‘악령’이나 ‘백치’에서 너무도 잘 그려 보였던 러시아 말기의 귀족들이 간직했던 속물근성을 갈파해 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근성이 당사자는 물론 한 사회를 어떻게 서서히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지, 그것의 치부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회의 상부구조를 점유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너무 오래된 농담’을 읽으면 된다.
‘가족애라는 미명 뒤에 실은 얼마나 더러운 욕심과 무자비한 이기심이 숨겨져 있는지’ 이 소설만큼 잘 쓰여진 게 따로 있을까. 민족 문제니 계급 갈등이니 목청 높이면서 정작 자기 앞에 놓인 짜장면 그릇 하나 치울 줄 모르는 열정과 정의가 판치는 유아기적 사회의식을 가진 상류 지식인들에게도 이 책은 그래서 영묘한 한 대의 ‘침’이다. 거기다 작가의 소망대로 뼈대는 숨고 재미가 넘치는 바람에 자기 자신들의 치부를 보는 줄 몰라도 된다면, 이건 덤일까?
이경자(소설가)
트렌드뉴스
-
1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2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3
운전 중 ‘미상 물체’ 부딪혀 앞유리 파손…50대女 숨져
-
4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5
바닷가 인근 배수로서 실종된 20대 여성…18시간 만에 구조
-
6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7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8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9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10
추성훈 “매번 이혼 생각…야노시호와 똑같아”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8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9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10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트렌드뉴스
-
1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2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3
운전 중 ‘미상 물체’ 부딪혀 앞유리 파손…50대女 숨져
-
4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5
바닷가 인근 배수로서 실종된 20대 여성…18시간 만에 구조
-
6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7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8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9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10
추성훈 “매번 이혼 생각…야노시호와 똑같아”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8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9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10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