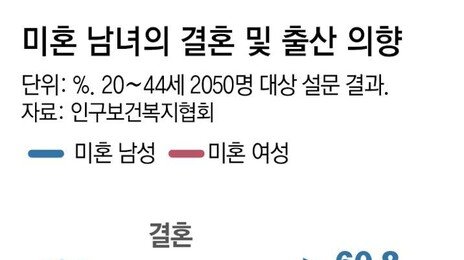공유하기
[새책]시집2권 「외로우니까…」「지금 알고 있는…」
-
입력 1998년 10월 19일 19시 06분
글자크기 설정
바람결에 수런거리는 새들의 노래처럼, 아침 햇살에 살랑이는 나뭇잎처럼 그렇게 다가온 두 권의 시집. 흐르는 강물처럼, 속으로 속으로 물살을 삭이며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깊고 고즈넉이 우리네 고단한 삶의 주름을 어루만지며 다독이는.
정호승의 여섯번째 시집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리고 명상시인 류시화가 엮은 잠언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열림원에서 내놓은 이들 시집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 ‘좋은 시〓안읽히는 시’라는 공식을 보기좋게 깨부수고 있다.
대학 선후배 이상의 막역한 사이이기도 한 두 시인. 작년 이맘때에도 각각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정호승)와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류시화)을 정상권에 올려놓아 화제가 됐었다.
어쨌거나, 참으로 시가 읽히지 않는 이 소음(騷音)의 시대에, 그래서 ‘시는 죽었는가’라는 외마디 소리마저 아득하기만 한 이 소모적인 시대에 널리 읽히고 사랑받는 시가 있다니! 진정 반갑다.
한결 깊어지고 쉬워진 정호승의 시. 그래서 그의 시는 그만큼 종교적이기도 하고 동화적(童話的)이기도 하다.
지나온 시인의 길을 더듬으며 진실된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다. 시인과 사람의 ‘하나 됨’을 간절히 기구한다. 고해성사(告解聖事)처럼, 기도처럼….
‘안개꽃’을 보자.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죽어서도 그대로 피어 있는가/장미는 시들 때 고개를 꺾고/사람은 죽을 때 입을 벌이는데/너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똑같구나…’
그래선가. 그는 ‘사람은 죽을 때에/한번은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고 죽는다는데/새들도 죽을 때에/푸른 하늘을 향해/한번은 맑고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고 죽는다는데/나 죽을 때에/한번도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지 못하고/눈길에 핏방울만 남기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시인의 길을 간다.
아직도 그 여진(餘震)이 생생한 작년과 재작년 ‘류시화 신드롬’의 주인공 류씨. 그의 잠언시집은 인디언에서 17세기 수녀, 유대의 랍비, 회교의 신비주의 시인, 걸인, 가수, 에이즈 감염자에 이르는 이들의 시편을 아우른다.
이들 잠언시의 핵심은 단 한 마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게로 가려면/모든 것을 떠나 모든 것에게로 가야한다…’는데 모아진다.
표제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사랑에 더 열중하고/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입맞춤을 즐겼으리라/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기우기자〉keywoo@donga.com
트렌드뉴스
-
1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2
정해인, ‘쩍벌’ 서양인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논란도
-
3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4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5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8
“내 주인은 날 타이머로만 써”… 인간세계 넘보는 AI 전용 SNS 등장
-
9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10
[오늘의 운세/2월 2일]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4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트렌드뉴스
-
1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2
정해인, ‘쩍벌’ 서양인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논란도
-
3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4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5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8
“내 주인은 날 타이머로만 써”… 인간세계 넘보는 AI 전용 SNS 등장
-
9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10
[오늘의 운세/2월 2일]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4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알아두면 좋아요]고기 맛 살려주는 소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1/02/01/680717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