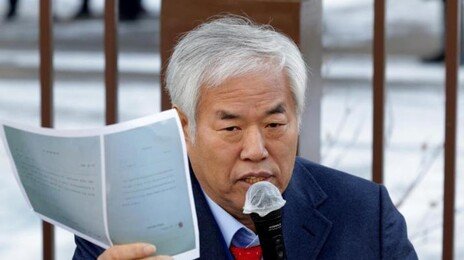공유하기
[광화문에서/김정훈]유리 속의 빅뱅실험
-
입력 2008년 9월 23일 02시 59분
글자크기 설정

10일 제네바와 프랑스 접경지역에 걸쳐 있는 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CERN)가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빅뱅(Big Bang·대폭발)’ 순간을 재현하는 실험에 들어간 것을 빗댄 농담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이 실험을 앞두고 과학계에서는 “둘레 27km의 강입자가속기(LHC)가 가동되면 블랙홀이 생겨나 지구가 빨려 들어갈 것이고,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필자가 7월 말까지 1년간 제네바에서 연수를 하는 동안에도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어떤 시민단체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실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지하 실험장치가 암을 유발한다더라”, “임산부가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더라”는 얘기들이 오갔다. 인권단체들은 “거대 실험 장치를 만드는 데 들인 79억 스위스프랑(약 8조 원)이면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모두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흉흉한 얘기들은 그저 식사 자리를 즐겁게 하는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됐고, 주민들의 동요는 조금도 없었다. 실험을 위한 준비일정은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유는 간단했다. CERN은 놀라울 정도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오고 있었다. 올해 4월 5, 6일 이틀 동안 연구소의 모든 시설을 개방하는 ‘오픈 데이’ 행사를 열었고,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찾아온 사람들까지 6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지하 100m에 만들어진 터널로 통하는 8개의 포인트에서는 선착순으로 입장이 허용돼 아침 일찍부터 노년의 부부, 어린아이를 목말 태운 가족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 정도 인파면 지하 시설을 보는 데 4주일은 걸릴 것”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에 터널 구경을 포기했지만, 그 대신 연구소 곳곳을 마음껏 둘러볼 수 있었다.
아인슈타인 거리, 오펜하이머 거리, 퀴리 거리 등으로 이름 붙여진 CERN 내 도로들 사이로 즐비하게 서 있는 연구동은 지도를 보지 않으면 길을 잃을 정도로 광활했다. 하지만 곳곳에 가이드로 배치된 CERN의 과학자 1000여 명의 친절한 안내로 아무런 불편을 느낄 수 없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대한 원통형자석장치 제조공장, 지하터널 공사에 쓰인 중장비들은 흥미로운 눈요깃거리도 제공했다.
오픈 데이는 빅뱅실험을 설명하고 알리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노벨상은 왜 여성과학자를 외면하는가’, ‘인터넷과 WWW의 역사’(CERN은 월드와이드웹을 처음 창안한 인터넷의 발상지다) 같은 과학토론이 벌어졌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게오르크 베드노르츠(1987년), 앤서니 레깃(2003년) 같은 저명 과학자들이 토론을 이끌었다.
CERN은 이 같은 오픈 데이 행사를 5년마다 한 번씩 열어 왔고, 평상시에도 예약만 하면 누구나 연구소 내부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일반인의 접근에 아무런 문턱이 없는 이곳에서는 올해 초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광우병 괴담(怪談) 같은 것이 애초에 설 자리가 없었다.
김정훈 사회부 차장 jngh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차승재의 영화이야기]'영화 아카데미'의 빛과 그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