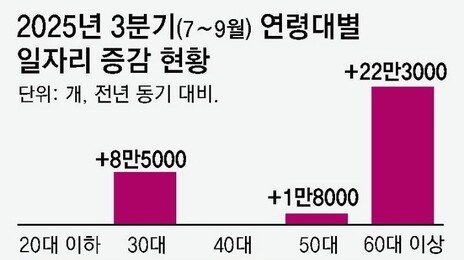공유하기
[오늘과 내일/정성희]헤어스프레이와 미국 대선
-
입력 2008년 1월 30일 03시 08분
글자크기 설정

같은 배 탔던 여성과 흑인
여성과 흑인이 맞붙은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을 보면서 헤어스프레이가 떠올랐다. 뮤지컬에서 뚱뚱한 백인소녀 트레이시는 흑인소년 시위드에게 흑인 춤동작을 배워 TV쇼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고 단박에 인기를 끌게 된다. 트레이시가 TV에서 공개적으로 “매일 매일을 흑인의 날로 제정하자”고 제의하면서 본격적인 인종 갈등 상황이 전개된다. 쉽게 말하면 뮤지컬 배경이 된 1962년 미국 사회에선 흑인과 여성이 똑같은 사회적 약자였다.
에피소드의 배경을 1962년으로 설정한 것은 플롯에 나름대로 복선을 깔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듬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학교에 흑백통합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권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분리되지만 평등한(separate but equal)’ 형식적 평등을 실질적 평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로 이루어지지 못한 민권법안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어받아 1964년 흑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한 더 진전된 민권법안을 통과시킨다. 이후 흑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씩 폐지된다.
그로부터 46년이 흐른 올해 미국은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나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에선 이렇다 할 유력 주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외교 경제 실정(失政)으로 각종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은 예외 없이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이번 미국 대선이 흥미로운 이유는 미국 사회에서 한때 동격으로 취급되었던 흑인과 여성이 서로 경쟁자로 등장했고 이 중 어느 쪽에 대한 금기가 먼저 깨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예비선거의 전적은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후보가 2 대 2로 최종 결과는 예측불허다. 미국에 정통하다는 사람들한테 누가 이길지 물어보았으나 하나같이 “정말 모르겠다”고 한다. 결과에 따라 미국 사회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말이다.
최근 CNN 인터넷판이 오피니언 리서치와 함께 미국 성인 1393명(백인 743명, 흑인 513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미국 사회의 변화가 실감난다. 백인의 72%가 “미국은 흑인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고 응답했다. 2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65%였다. “미국이 여성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남성의 64%와 여성의 65%가 “그렇다”고 답했다. 수치만 보면 여전히 인종보다는 성별에 민감한 듯하다.
어느 금기 먼저 깨질까
양 후보도 인종이나 성별에 관한 뇌관을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는 기색이 보인다. 흑백 통합을 강조하는 오바마 후보이지만 자신의 미들네임인 ‘후세인’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후세인이 주는 부정적 뉘앙스를 염려해서다. 냉혹한 마키아벨리스트란 지적을 받고 있는 힐러리는 “내가 여자라 공격하느냐”는 공격적 태도 대신 눈물을 흘려 상황을 반전시켰다.
물론 인종이나 성별이 대통령 선택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여론조사에서 흑백 유권자 모두 대통령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고 이어서 이라크, 테러, 건강보험, 유가를 지적한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흑인이 되건 여성이 되건 미국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맞을 것이다. 누구의 머리에 헤어스프레이가 뿌려질지 몰라도 동시대인으로 그 역사의 한 장면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뿌듯한 일이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씨네@메일 >
-

고양이 눈
구독
-

서광원의 자연과 삶
구독
-

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
구독
트렌드뉴스
-
1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2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3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4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5
“대구에 이렇게 눈이 온다고?” 시민들도 놀란 ‘2월 폭설’
-
6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7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8
이정현, 공관위원 이력 논란에 “이유여하 막론 송구…책임 지겠다”
-
9
주호영 “TK통합 반대 누구냐” vs 송언석 “그만두겠다” 충돌
-
10
우유냐 두유냐…단백질 양 같아도 노령층엔 ‘이것’ 유리[노화설계]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10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트렌드뉴스
-
1
손님이 버린 복권 185억원 당첨…편의점 직원이 챙겼다 소송 당해
-
2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불쾌감
-
3
가짜 돈 내민 할머니에게 7년째 음식 내준 노점상
-
4
“잠만 자면 입이 바싹바싹”…잠들기 전에 이것 체크해야 [알쓸톡]
-
5
“대구에 이렇게 눈이 온다고?” 시민들도 놀란 ‘2월 폭설’
-
6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7
[단독]타슈켄트 의대 한국인 유학생들, 국시 응시 1년 밀릴 듯
-
8
이정현, 공관위원 이력 논란에 “이유여하 막론 송구…책임 지겠다”
-
9
주호영 “TK통합 반대 누구냐” vs 송언석 “그만두겠다” 충돌
-
10
우유냐 두유냐…단백질 양 같아도 노령층엔 ‘이것’ 유리[노화설계]
-
1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토론’ 27일 생중계…李 “도망 못갈것”
-
2
李 “임대료 못올리니 관리비 바가지…다 찾아내 정리해야”
-
3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
4
李 “농지 사놓고 방치하면 강제매각 명령하는 게 원칙”
-
5
장동혁 “배현진 징계 재논의 안해…오세훈 절망적인 말 왜 하나”
-
6
정청래, ‘재명이네 마을’서 강제탈퇴 당해… 與 지지층 분열 가속
-
7
李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보다 쉽다…정부에 맞서지 말라”
-
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
9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
10
서로 껴안은 두 소년공, 대통령 되어 만났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씨네@메일]'인터뷰'에 대한 찬사와 저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