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프로축구 출범 30년 넘도록 왜 관중수 ‘쉬쉬’ 했을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0일 17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프로축구는 1983년 이후 출범 30년이 넘었다. 공자는 30세를 이립(而立)이라 불렀다. 학문의 기초를 확립하는 시기라는 의미다. 프로축구는 이립을 넘었지만 관중 관리에서는 걸음마 단계다. 집계를 제대로 한 게 2012년부터니 그럴 수밖에 없다. 연맹은 2011년 “300만 관중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구단이 근거 없이 얘기한 숫자를 더한 수치다. 하지만 당시 이를 믿는 팬들은 거의 없었다. 이전부터 ‘뻥 튀기’ 발표가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이었다. 실제 관중을 세 보니 거품은 쏙 빠졌다. 지난해 클래식 총 관중은 180만 명이었다.
▷상황이 이러니 프로야구가 700만 관중을 얘기할 때 프로축구는 조용했다. 말을 꺼내봤자 비교만 될 뿐이었다. 프로야구는 원년부터 관중을 집계했다.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쌓이다 보니 관중 수는 인기를 가늠하는 척도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프로축구는 왜 최근에야 관중 수를 세기 시작했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구단들이 반대해서다. 연맹 관계자는 “구단에게 관중은 중요한 실적이다. 성적이 안 되면 관중이라도 뒤지지 않아야 한다.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기에 누구나 ‘뻥 튀기’ 집계의 유혹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무 연맹 부총재는 “전북 등 일부 구단을 제외하면 단장이 너무 자주 바뀐다. 장기적인 플랜이 나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올 시즌 클래식은 228경기를 치른다. 프로야구는 720경기다. 경기 수가 야구의 3분의 1도 안되니 전체 관중 비교는 무의미하다. 다만 평균 관중은 야구와 경쟁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프로야구의 올 평균 관중 목표는 1만1614명(총 836만 2000명)이다. 대놓고 발표는 안 했지만 연맹은 내심 올 시즌 300만 관중(클래식)을 기대한다. 평균 1만3158명이 입장해야 가능한 숫자다. 지난해 3라운드까지 평균 1만667명이었던 클래식 평균 관중은 결국 7931명으로 줄었다. 올해 3라운드까지 평균 관중은 지난해보다 19.5% 증가한 1만2753명. 목표를 이루려면 관중이 더 늘어야 한다. 지금의 축구 바람은 잠시 살랑대다 잦아들 미풍일까, 아니면 갈수록 거세질 태풍일까. 올 시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5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6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7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8
‘대륙의 아이콘’서 밉상된 구아이링, “中 위해 39개 메달 땄다. 당신은?”
-
9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10
“한동훈 티켓 장사? 김어준은 더 받아…선관위 사전 문의했다”[정치를 부탁해]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8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9
李, 국힘 직격 “망국적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
10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5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6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7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8
‘대륙의 아이콘’서 밉상된 구아이링, “中 위해 39개 메달 땄다. 당신은?”
-
9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10
“한동훈 티켓 장사? 김어준은 더 받아…선관위 사전 문의했다”[정치를 부탁해]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8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9
李, 국힘 직격 “망국적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
10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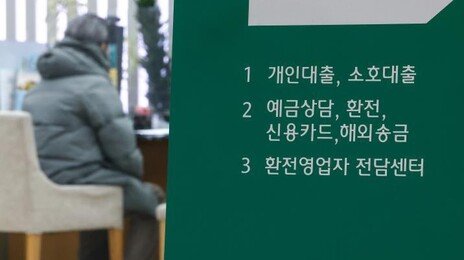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