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Biz Golf]해외파 골퍼 득세 美PGA “절대 강자는 없다”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이젠 미국프로골프(PGA)투어도 인종의 용광로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다양한 피부색에 다채로운 언어를 구사하는 해외파들의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올 시즌 외국 국적을 지닌 PGA투어 멤버는 22개국 80명에 이른다. 1983년에는 21명에 불과했다. 2009년 19개국 70명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인근의 토리파인스에서 개막한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는 한국인 선수 5명과 미국 교포 2명이 총출동했다. 신인 강성훈은 1라운드에서 8언더파를 몰아쳐 단독 선두에 나서는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주 밥 호프 클래식에서는 역시 올해 데뷔한 조나탄 베가스가 베네수엘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PGA투어 챔피언에 올라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해외파 강세는 유럽 선수들이 주도하고 있다. 세계 랭킹 10위 안에 1위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 2위 마르틴 카이머(독일)를 비롯해 유럽 선수 6명이 포진했다. 유럽 선수가 1, 2위를 석권한 것은 1993년 닉 팔도, 베른하르트 랑거 이후 18년 만이다. 콧대가 높아진 유럽 선수들은 시즌 초반 PGA투어 출전을 외면할 정도까지 됐다.
PGA투어에서 7승을 거둔 최경주, 아시아 최초로 메이저 챔피언에 오른 양용은 등은 골프의 변방이던 아시아에서 필드의 개척자로 불린다. 이들의 활약은 신체조건과 환경이 비슷한 아시아 지역의 어린 골프 유망주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줬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 골프의 세계적인 저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꿈의 무대라는 PGA투어를 향하는 발길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언젠가 무늬만 PGA투어라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트렌드뉴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3
‘워시 쇼크’ 금·은값 폭락 배경엔…“中 투기꾼의 광적인 투자”
-
4
“한동훈 티켓 장사? 김어준은 더 받아…선관위 사전 문의했다”[정치를 부탁해]
-
5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6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7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8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9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10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1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2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9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10
李, 국힘 직격 “망국적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트렌드뉴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3
‘워시 쇼크’ 금·은값 폭락 배경엔…“中 투기꾼의 광적인 투자”
-
4
“한동훈 티켓 장사? 김어준은 더 받아…선관위 사전 문의했다”[정치를 부탁해]
-
5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6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7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8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9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10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1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2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9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10
李, 국힘 직격 “망국적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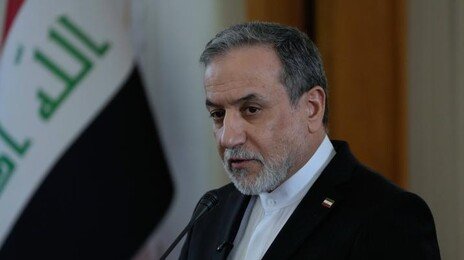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