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내 몸 안의 항암제’는 투병의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9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 폐암 극복 원용만씨 사연
“5년간 3차례 대수술
완치 확신 꺾인적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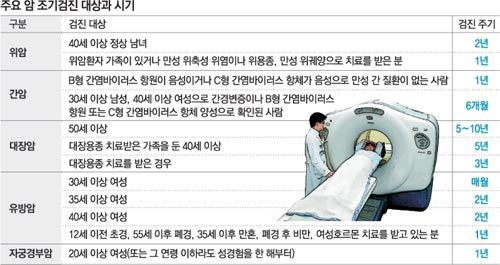
췌장암과 폐암의 생존율은 매우 낮다. 3년 생존율이 각각 8.2%와 15.7%에 불과하다. 일부 의사들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생존 가능성을 장담하지 못할 때도 솔직히 꽤 있다”고 털어놓는다. 두 암은 5년이 지나 재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만큼 난치성 암이다.
그러나 투병의지가 강하면 이길 수 있다. 10년 넘게 폐암과 싸워 마침내 암을 극복한 원용만 씨(60·경기 양주시)의 경우가 그렇다. 원 씨는 1996년 10월 비소세포성폐암 진단을 받았다. 폐암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어렵다는 암이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 암 덩어리가 있는 오른쪽 폐의 아랫부분을 잘라냈다. 하지만 암세포는 여전히 폐에 남아 있었다. 1998년 2월과 2001년 4월 폐의 일부분을 더 잘라냈다.
5년간 3차례의 수술을 받으며 몸과 마음은 극도로 피폐해졌다. 그러나 암과의 싸움은 겨우 시작이었다. 3차 수술 후 3개월간 몸을 추스른 뒤 곧바로 항암치료가 시작됐다. 이후 3개월간 네 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았다. 독한 항암제 때문에 제대로 음식을 먹는 게 불가능했다.
원 씨는 버텼다. 평소 믿고 있는 종교의 도움이 컸다. 원 씨는 기도를 하면서 평정심을 되찾았다. 고통은 컸지만 삶의 의지를 꺾은 적은 없었다. 의사의 지시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원 씨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를 악물었다. 세 차례의 수술과 아홉 차례의 항암치료, 서른 번의 방사선치료에 이어 또다시 새로운 항암치료가 이어졌다.
폐암 진단을 받은 지 만 12년이 흐른 2008년 11월, 원 씨의 폐에서는 암세포가 더 발견되지 않았다. 비로소 완치 판정이 떨어졌다. 요즘 원 씨는 6개월마다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할 뿐이다. “단 한 번도 내가 암으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폐암을 이길 거라고 확신했고, 예상대로 이뤄진 거죠. 투병의지만 있으면 그 어떤 난치 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원 씨가 밝힌 승인(勝因)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트렌드뉴스
-
1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2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3
운전 중 ‘미상 물체’ 부딪혀 앞유리 파손…50대女 숨져
-
4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5
바닷가 인근 배수로서 실종된 20대 여성…18시간 만에 구조
-
6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7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8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9
‘아파트’로 무대 연 그래미 시상식, ‘골든’으로 혼문 닫았다
-
10
추성훈 “매번 이혼 생각…야노시호와 똑같아”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8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9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10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트렌드뉴스
-
1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2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3
운전 중 ‘미상 물체’ 부딪혀 앞유리 파손…50대女 숨져
-
4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5
바닷가 인근 배수로서 실종된 20대 여성…18시간 만에 구조
-
6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7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8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9
‘아파트’로 무대 연 그래미 시상식, ‘골든’으로 혼문 닫았다
-
10
추성훈 “매번 이혼 생각…야노시호와 똑같아”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8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9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10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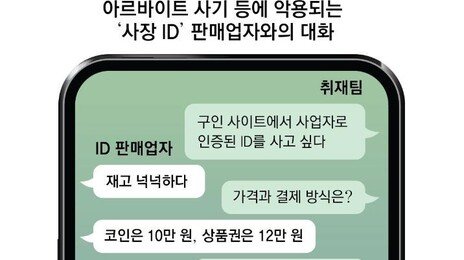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