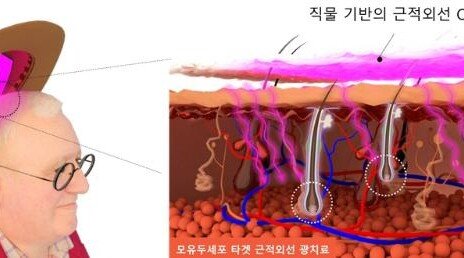공유하기
[理知논술/문학 숲 논술 꽃]조화와 균형
-
입력 2008년 6월 9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객관적 인식 최대 걸림돌은 주관의 ‘색안경’
○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본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때로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된 인습(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 중에서 합리적·진보적 관점에서 가치가 의심되거나 부정되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은 자신의 잣대에 맞지 않는 것들은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옹졸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편견은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장애가 된다.
○ 계란을 깨는 최고의 방법
릴리퍼트와 블레훠스크라는 강력한 나라들은 지난 36개월 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란을 먹기 전에, 그것을 깨는 가장 오래된 방법은 넓고 둥근 방향의 끝부분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왕의 할아버지께서 소년이었을 당시 그동안의 관습대로 계란을 깨다가 손가락을 베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의 아버지였던 당시의 국왕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계란을 깰 때는 좁은 방향의 끝부분을 깨도록 명령하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엄한 벌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이 법에 대하여 몹시 화가 나서 이 문제로 인해 6차례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중략) 통계에 의하면 그동안 1만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좁은 방향의 끝부분으로 계란을 깨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수많은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넓고 둥근 방향의 끝부분을 깨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출판과 판매의 자유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법에 의하여 공직에도 취임하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너선 스위프트, ‘걸리버 여행기, 제1부 작은 사람들의 나라’]
|
걸리버가 여행한 소인국 사람들은 작은 몸집만큼이나 마음 씀씀이도 작았다. 그들은 ‘계란을 어느 쪽으로 깨야 하느냐’에 대해 오랫동안 싸움을 계속한다. 이 논쟁은 ‘왕자가 오랜 관습대로 계란을 깨다가 손을 베인 사건’을 계기로 처음 일어났다. 릴리퍼트의 왕은 왕자가 다친 것에 대한 분노를 오랜 관습대로 계란을 깨려는 사람들에게 퍼부은 것이다. 그러나 ‘왕자가 손을 다친 것’이 꼭 계란을 깨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란을 깨는 방법에 대해 집착하고 분노한다. 이러한 소인국 사람들의 행동은 인간이 믿고 있는 신념과 이념이 얼마나 맹목적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때로 인간은 ‘계란을 깨는 법’ 하나에도 여유를 둘 수 없을 만큼 옹졸해진다.
○ 사물에는 애초부터 정해진 색깔이 없다
흔히 까마귀는 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까마귀의 색은 빛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한다.이 때문에 연암 박지원은 ‘까마귀는 검다’라는 인습적 사고로는 까마귀의 참 모습을 인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빛의 변화에 따른 ‘루앙 성당’의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루앙 성당’을 연작으로 그렸던 클로드 모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의 본질을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면 사물을 보기 전에 미리 자신의 주관을 만드는 잘못을 피해야 한다.
견문이 좁은 사람은 해오라기를 가지고 까마귀를 비웃고 물오리를 들어 학의 자태를 위태롭게 여긴다. 그 사물 자체는 전혀 괴이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성을 내어 꾸짖으며 한 가지라도 제 소견과 다르면 천하 만물을 다 부정하려고 덤벼든다. 아아! 저 까마귀를 보자. 그 날개보다 더 검은 색깔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햇빛이 언뜻 흐릿하게 비치면 옅은 황금빛이 돌고, 다시 햇빛이 빛나면 연한 녹색으로도 되며, 햇빛에 비추어 보면 자줏빛으로 솟구치기도 하고, 눈이 아물아물해지면서는 비취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푸른 까마귀라고 불러도 옳으며 붉은 까마귀라고 불러도 역시 옳을 것이다.
사물에는 애초부터 정해진 색깔이 없건만 그것을 보는 내가 색깔을 먼저 결정하고 있다. 어찌 눈으로 색을 결정하는 것뿐이랴. 심지어 보지도 않고 미리 마음속으로 결정해 버리기도 한다. 아아! 까마귀를 검은 색깔에다 봉쇄시키는 것쯤이야 그래도 괜찮다. 이제는 천하의 모든 빛깔을 까마귀의 검은색 하나에 봉쇄시키려 한다. 까마귀가 과연 검은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소위 푸른빛, 붉은빛을 띤다는 것은 바로 검은색 가운데서 푸르고 붉은 빛이 난다는 사실을 의미함을 그 누가 알고 있으랴? 검은색을 어둡다고 보는 사람은 까마귀만 모를 뿐 아니라 검은색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물은 검기 때문에 능히 비출 수 있고 옻칠은 까맣기 때문에 능히 비추어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색깔이 있는 것치고 광채가 없는 것은 없고, 형체가 있는 것치고 맵시가 없는 것은 없다.
[박지원, ‘능양시집서(菱陽詩集序)’] |
렘브란트와 고흐는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화상 속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로 고정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모습은 한 가지의 이미지로 고착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얼굴은 어떤 장소에, 어떤 시기에, 누구와 있느냐 등에 따라 달라진다.
○ 조화 속에만 참된 아름다움이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꽃이 존재한다. 하지만 같은 꽃이라 할지라도 꽃이 피어 있는 장소와 시기에 따라서 꽃의 자태는 달라진다. 또한 꽃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진 경험과 가치관과 그 날의 느낌에 따라 꽃의 자태는 또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꽃에 대해 각양각색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꽃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물이 다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물의 참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 고정된 관념을 버리고 다른 것과의 어울림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여유를 가져야 한다.
모든 사물은 제 나름대로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가지며 그 어떤 것도 세상과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 지배되거나 기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평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무슨 빛깔을 좋아하느냐, 어떤 꽃을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다면 얼핏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이 어느 계절이 인상적이냐고 한대도 역시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할 것이며 종내는 잘 모르겠노라는 대답이 될 성싶다.
사람의 경우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어떤 성격이 매력적이며 어떠한 얼굴에 흥미를 느끼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과 인간들 앞에서 창문을 닫아 버리고 내 마음이 황무지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떠한 하나하나를 추려 내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며 서둘러 보기에는 좀 나이 들어 버린 것 같기는 하다.
무릇 어떤 꽃이든 빛깔이든 혹은 계절이든 간에 어느 조화를 이룬 속에서만이 참된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조화는 명확하게 구체화시켜 볼 수 없는 일종의 꿈이기도 하다. 느낌 속에 안개처럼 몰려오는 환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때때로 정신과 현상이 일치되는 순간 우리는 미(美)의 가치를 인식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결코 고정된 관념은 아닌 것이다. (중략)
[박경리, ‘조화’] |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3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4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5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정해인, ‘쩍벌’ 서양인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논란도
-
8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내 주인은 날 타이머로만 써”… 인간세계 넘보는 AI 전용 SNS 등장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8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9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3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4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5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정해인, ‘쩍벌’ 서양인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논란도
-
8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내 주인은 날 타이머로만 써”… 인간세계 넘보는 AI 전용 SNS 등장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8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9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76557.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