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위기의 韓美동맹]<2>한국의 혼란스러운 대미관
-
입력 2004년 5월 24일 18시 43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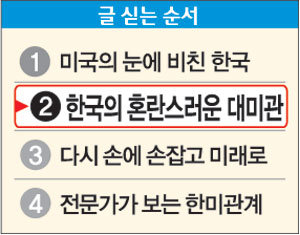
개혁 성향인 유 의원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다.
“자기들 필요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면 나가는 것이지 왜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내부에는 북한의 대남 기본전략에 변화가 없다는 시각도 많습니다.”(정 당선자)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유 의원)
“미국은 자기들이 주둔하는 나라의 국민이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다. 단정적으로 볼 수 없어요.”(정 당선자)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미국을 보는 시각은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다. 그러나 정작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미국통은 드물다. 유재건(柳在乾) 의원과 채수찬(蔡秀燦) 당선자, 정 당선자 정도다. 이들 외에 운동권 출신으로서 이종걸(李鍾杰) 송영길(宋永吉) 임종석(任鍾晳) 의원 등이 한미 의원외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8년간 대미 의원외교에 매달려 온 유재건 의원은 “같이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며 “위에다 이야기해 봐야 소용도 없고…”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6·25전쟁 이후 30여년간 미국은 ‘영원한 혈맹(血盟)’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미’의 물결이 몰아치면서 미국의 이미지는 변하기 시작했다. 여기엔 88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민족적 자존의식이 높아진 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
40여년간 국제질서를 지배해 온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반미=친북’이라는 고정관념도 무너졌다.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햇볕정책은 북한의 이미지를 ‘뿔난 도깨비’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가난한 동포의 나라’로 바꿔 놓았다.
그러나 ‘이념을 걸러 줄 정상적인 시장’(Marketplace of idea)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탓에 미국에 대한 인식도 정제되지 않은 채 출렁거리고 있다.
“한국의 반미 감정은 중동 국가 수준이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2002년 4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대단히 충격적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전 세계 3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민의 72%가 ‘미국의 전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한국과 함께 이슬람교 국가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가 전쟁에 가장 광범위하게 반대하는 국가로 등록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반미감정 확산에는 미국도 책임이 있다. 냉전의 붕괴는 ‘자유주의 국가의 수호자’가 아니라 슈퍼파워를 지향하는 패권국가 미국의 얼굴을 부각시켰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공정성과 끊이지 않는 주한미군 범죄,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 2000년 조지 W 부시 정권 등장 이후 계속된 일방주의 세계전략,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은 한국민의 대미 인식을 부정적인 쪽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대미 인식은 역설적이고 이중적이다.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전략(하드 파워)에는 매우 비판적이면서도 미국의 문화와 생활규범, 교육체계 등(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는 추종적이다.
‘아메리칸 드림’의 유혹은 미국에서 매년 수많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정도로 강력하다. 2003년까지 공식적인 미 이민자는 68만여명이지만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100만명을 훨씬 뛰어넘는다. 1996년 341명에 불과하던 초등학생 유학생이 2002년에는 열 배가 넘는 3464명으로 급증했다.
조기 영어교육 열풍과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선물하기 위한 ‘원정 출산 붐’ 등 미국에 대한 선망은 대미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다. 우리 기업들이 전범으로 따르는 ‘글로벌 스탠더드’도 알고 보면 ‘아메리칸 스탠더드’의 다른 이름이다.
미국의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에 대한 양극화된 인식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전략적 목표를 제시한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金晧起) 교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용적인 친미와 실용적인 반미를 포괄하는 이른바 용미(用美)의 방법”이라며 “용미 방법은 미국에 지혜롭게 대응함으로써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에 서로 이익을 주는 게임이 될 수 있게 하는 전략을 말한다”고 밝혔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
▼“이젠 국익이 중요 反美 깃발론 안돼”▼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 사이에도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한나라당 고진화(高鎭和·서울 영등포갑) 국회의원 당선자는 24일 “미국이 동서냉전 시절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파트너로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을 지원하던 때에는 미국에 반대했다”며 “그러나 한국에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대상황이 변했는데도 ‘자주성’을 과도하게 내세워 반미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며 “자주성과 동맹은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 당선자는 1985년 성균관대 삼민투위원장으로서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2년6개월간 복역했던 운동권 출신.
그는 “80년 신군부의 광주학살에 대해 군사작전권을 갖고 있던 미국이 이를 용인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반미는 타당한 문제제기였다. 하지만 민주화된 정권이 들어선 이제는 국익 중심의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미국을 봐야 한다”고 자신이 ‘반미 깃발’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
▼“美 일방주의 여전 관계 재정리 할때”▼
민주노동당 조승수(趙承洙·울산 북) 국회의원 당선자는 “미국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동맹 강화론자들은 여전히 미국이 한국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냉전논리에 입각해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동맹을 고정적 개념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달라진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과거 미국은 원조경제를 통해 한국을 미국의 세계시장 영향력 아래 두려는 전략을 썼지만 지금은 일정 부분 한국과 경쟁하는 관계가 됐다”며 “이제는 우리의 관점에서 한미관계를 냉정히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당선자 역시 동국대 재학 시절 군사독재 타도 시위로 제적된 뒤 노동운동 등을 하다가 구속과 수배생활을 했던 운동권 출신. 그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상호주의 속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미국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슈퍼301조 등을 앞세워 일방의 이익만 관철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자주’의 현실은… ▼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추구하는 자주외교는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인가.
현 정부의 핵심관계자들은 자주외교의 개념에 대해 ‘스스로 국익을 정의하고 그 국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자주’란 국익의 실현을 위한 목표이며 ‘동맹’은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현 정부 핵심관계자들이 주장하는 동맹관계 변화를 통한 자주외교의 추진에는 상당한 위험요소가 깔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종연구소 이대우 박사는 “자주외교로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국민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지만 대북 억지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적 노력과 부담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맹을 손익으로만 계산할 경우 한국의 의지와 달리 동맹이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철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주외교의 수준은 ‘선택적 협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이나 테러문제 등에 대해서는 미국에 협력하면서 자신의 독자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선택적 협력’을 표방하고 있는 나라는 실제 전 세계에서 중국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프랑스 독일 등은 내부적으로 자주외교를 추구하면서도 이를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국방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미군 장성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미국에 대해 신경을 쓰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자주외교의 한계는 정부의 외교 행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노 대통령은 한미관계의 균형과 한미공조의 강화를 동시에 이야기한다. 또 자주국방을 표방하면서도 현실적인 재정적 제약 때문에 올해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2.8%로 묶어놓
았다. 그런가 하면 자주외교를 내세우면서도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고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선 끝내 ‘노(NO)’라고 말하지 못했다.
서울대 외교학과 전재성 교수는 “자주외교는 언어적 수사가 아니라 국가전략의 결과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며 “국가전략 차원에서 자주를 종속의 반대로 생각하는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국제 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위기의 韓美동맹 >
-

알쓸톡
구독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동아광장
구독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6
월 300만원 줘도 “공무원은 싫어요”…Z세대 82% ‘의향 없다’
-
7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8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9
“일찍 좀 다녀” 행사장서 호통 들은 장원영, 알고보니…
-
10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6개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혔다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3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6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7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8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9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
10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6
월 300만원 줘도 “공무원은 싫어요”…Z세대 82% ‘의향 없다’
-
7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8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9
“일찍 좀 다녀” 행사장서 호통 들은 장원영, 알고보니…
-
10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6개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혔다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3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6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7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8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9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
10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위기의 韓美동맹]다시 손에 손잡고 미래로](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