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유윤종]독일 의사당에 비친 한국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독일 수도 베를린을 5년 만에 방문했다. 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과 독일의 독한포럼(회장 하르트무트 코시크 독일 재무차관)이 공동 주최한 제10차 한독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한국 측 김학준 한독포럼 회장을 비롯한 양국 학자와 정관계 인사, 언론인 50여 명이 두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에 대해 이틀 동안 논의를 펼쳤다.
회의는 ‘제국의사당’과 부속 건물에서 열렸다. 제국의사당은 1894년 건립됐고 통일 후 연방정부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천도하면서 1999년부터 독일연방공화국 의회로 쓰이고 있다.
이 건물의 원형지붕(돔)은 연방의회로 재개관하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투명 돔으로 바뀌었다. 2006년 월드컵 기간에는 의사당을 서너 겹으로 두른 긴 행렬 때문에 들어가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돔 꼭대기에 올라서자 의원들의 자리가 바로 아래 내려다보였다. 망원경이 있다면 의원들의 자료까지 읽을 수 있을 듯했다. 한국 국회의 ‘드잡이’가 이런 곳에서도 가능할까. 독일 연방의회를 한국에 옮겨온다면 폭력행위는 사진기자들의 카메라보다 국회 방문자들의 휴대전화에 먼저 잡혀 낱낱이 전파될 것이다.
둘째 날, 슈테판 뮐러 연방의원 등 독일 측 참가자들은 독일의 정치재단이 정치 과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독일에서 정치재단은 정당과 연계해 각종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한다. 사민당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노사관계, 녹색당의 하인리히 뵐 재단은 환경 문제에 깊이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얘기를 들으며 올해 7월 동아일보에 실린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 기사를 떠올렸다. 연구소마다 자신 있는 보고서 5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연구소는 공개할 만한 보고서가 없다고 했고 다른 곳에서 2, 3개씩 제출한 보고서도 현안을 요약한 10∼20쪽짜리에 그쳤다.
포럼은 양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며 마무리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을 공유·교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학생과 문화전문가들의 상호 교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현실 정책에 반영하기 앞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양국 협력에 대해 깊은 토의를 펼친 것만으로도 여러 생산적인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포럼 참가자들은 18일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을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했다.
숙소로 돌아온 뒤 컴퓨터를 켜고 동아닷컴 뉴스 사이트에 접속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야당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점거 속에 3주째 표류하고 있다는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이곳에서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이 꿈속의 일처럼 느껴졌다. 서로가 ‘세계의 책임 있는 중강국(中强國·middle power)’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여러 가지를 논의했지만 독일과 한국은 아직 그만큼의 거리와 차이가 있었다. -베를린에서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2030세상
구독
-

기고
구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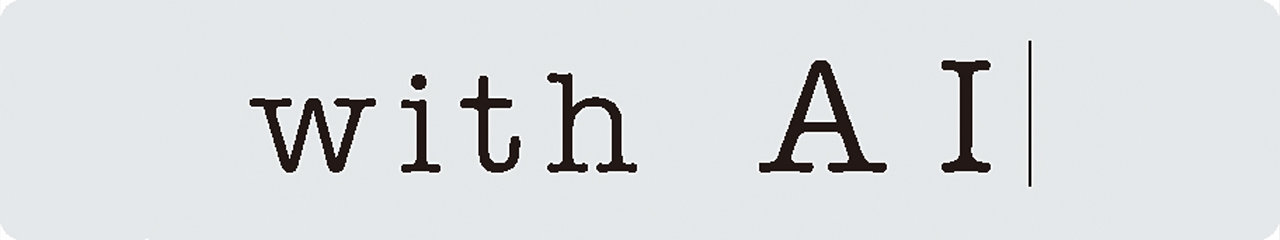
김현지의 with AI
구독
트렌드뉴스
-
1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2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3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4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5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6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7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8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9
이웃집 수도관 내 집에 연결…몰래 물 끌어다 쓴 60대 벌금형
-
10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1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9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0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트렌드뉴스
-
1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2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3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4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5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6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7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8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9
이웃집 수도관 내 집에 연결…몰래 물 끌어다 쓴 60대 벌금형
-
10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1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9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0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임현석]시진핑 실각설이 남긴 진짜 질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01/13327654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