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강금실 인권여행]최하층 집단 '접촉할 수 없는 부류' 취급
-
입력 2005년 12월 6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네팔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카트만두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정부군과 마오이스트 간 무력분쟁이 잦은 산악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에 비해 카트만두 인구가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강금실(康錦實·전 법무부 장관) 여성인권대사는 “평화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 간 화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네팔의 여성인권 실태를 둘러본 뒤 “전쟁의 상처 속에서 서로를 보듬는 네팔 여성이 평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여성 인신매매=네팔 정부는 한해 500∼700명의 네팔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인도로 팔려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현재까지 네팔 여성 3만 명이 인도로 팔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계속된 내전으로 생계난에 빠진 여성들이 자의에 의해 인도의 성(性) 노동자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다.
네팔 정부는 인신매매된 네팔 여성의 송환을 추진 중이지만 인도 정부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 대사는 네팔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 네팔 여성의 인신매매문제를 공론화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질 수조차 없는 ‘달리트’=네팔의 상징인 고산지대 계단식 논처럼 네팔 사회는 층층이 쌓인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네팔인은 자신의 계급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결혼을 한다.
하지만 네팔에는 카스트제도에조차 편입되지 못한 최하층 집단, ‘카스트 바깥의 인간’으로 불리는 달리트가 있다. 달리트는 ‘접촉할 수 없는 인간(불가촉천민·the untouchable)’이란 뜻. 달리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삼중 사중의 차별에 시달린다. 교육의 기회도,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는 달리트 여성들은 대부분 술집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하녀로 고용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간다. 목마른 달리트 여성은 우물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강 대사는 “전통을 이유로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달리트 여성에 대해 국제 여성계가 연대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라는 공통분모를 찾아서=유엔은 현재까지 네팔 정부군과 마오이스트의 충돌로 1만2000여 명(어린이 500여 명)이 숨지고 7만여 명의 피란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군과 마오이스트 양측에 의해 불법 처형, 성폭행, 착취, 납치, 강제 징집 등 인권 침해가 계속되자 네팔 빈민층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가 끊긴 상황이다.
내전으로 가족을 잃은 네팔 여성들은 최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여성포럼’을 결성했다.
이번 여행에 동행한 유엔정책센터 김기연 국장은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대해 서로에게 기대는 모습에서 평화를 향한 네팔 사회의 자정 능력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네팔의 산기슭 사이에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 어둠과 절망이 겹쳐 있는 것처럼 현실을 수용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이곳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카트만두=정효진 기자wiseweb@donga.com
■ 봉제교육에… 유아교실에… ‘한국’ 심는 여성 3人
 |
지난해 11월 이곳에 도착한 이들은 최근 마을주민을 위한 공동복합사무실을 세우고 부녀자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봉제교육장과 탁아소, 유아교실을 열었다. 이들은 전기가 없는 마을에서 밤늦게까지 건물 안팎에 페인트칠을 하고 벽돌을 날랐다. 사비를 털어 아이들 책을 구입하고 수업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주민들은 마을을 찾은 강금실 대사에게 “닷네 밧”(네팔어로 ‘고맙다’는 뜻)을 외치며 한국인 봉사단원에 대한 고마움을 알렸다.
하지만 봉사단원들은 이곳의 뿌리 깊은 신분제도와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차 씨는 “처음에는 마을에 들어서기만 해도 주민들이 돌을 던지며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카트만두=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日 교과서 왜곡 : 일본 내 반응 : 언론 >
-

현장속으로
구독
-

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구독
-

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
구독
트렌드뉴스
-
1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2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노블레스 오블리주 표본”
-
3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4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5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6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7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8
버스서 韓 여학생 성희롱하고 불법 촬영…인니 남성 논란
-
9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10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4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7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트렌드뉴스
-
1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2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노블레스 오블리주 표본”
-
3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4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5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6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7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8
버스서 韓 여학생 성희롱하고 불법 촬영…인니 남성 논란
-
9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10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4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7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대전/충남][강원]신종플루 주춤… ‘먹을거리 축제’ 봇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9/10/16/885347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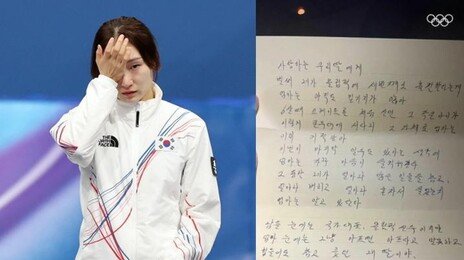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