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저자와 차 한 잔]사마천 ‘사기 세가’ 번역 김원중 교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7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포기하고 쉬운 길 가는 이들엔
‘구천의 와신상담’ 배우라 하죠”
“16년 전입니다. 박사 논문을 쓰며 보던 문학이론서에 사기(史記)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기는 역사서요 문학서이며 철학서다’라는 말도 들었고요. 그런데 한국에 완전히 번역된 게 없어 안타까웠습니다.”전화선 너머 들려오는 목소리가 낭랑했다. 사마천의 ‘사기’ 중 ‘열전’과 ‘본기’ 편을 번역한 데 이어 최근 ‘세가’를 번역한 김원중 건양대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47·사진). 김 교수의 사기 번역에 대한 열정은 주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정도다. 매일 오전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나 수업 시간을 뺀 모든 시간을 번역에 집중한다.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집 근처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보고 교정 작업을 한다.
김 교수는 ‘사기’를 “인간의 본질을 다룬 책 중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중국 전한(前漢) 시대 사마천이 중국 역사 속 다양한 인물의 면면을 다룬 통사 ‘사기’는 본기 12편, 열전 70편, 세가 30편, 표 10편, 서 8편 등 총 130편으로 이뤄졌다. 본기는 제왕, 열전은 신하의 이야기를 다룬 데 비해 세가는 30명의 제후를 다뤘다. 사마천은 공자를 제후만큼 영향력이 큰 인물로 평가해 세가에서 다뤘다.
‘세가’ 편에 있는 제후들의 흥망성쇠가 그런 이야기다. 그는 “집 잃은 개라고 불렸던 공자, 머슴살이를 하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며 봉기해 왕이 된 진섭, 19년간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다 진(晉)나라를 세운 문공 등이 그 예”라고 말했다.
옛 사람인 사마천의 글을 현재를 사는 이들에게 전할 때 김 교수가 가장 신경 쓰는 점은 “원저자의 의도는 충실히 전하되 역자의 개입은 최소로 하는 것”이다. ‘삼국유사’ ‘정사 삼국지’ ‘한비자’ 등을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쉽게 풀어쓰는 데 골몰한 나머지 독자가 감내하며 소화해야 할 부분마저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원저자가 어렵게 쓰면 당연히 번역문도 어려워야 하고, 편하게 쓰면 번역도 쉬워지죠. 높은 분에게 쓰는 편지와 친구에게 쓰는 편지가 같을 수 없잖아요.” 제왕의 이야기를 다룬 ‘본기’ 편의 경우 사마천도 격식을 갖춰 절제된 표현을 썼고 왕과 제후를 보좌한 신하들의 이야기를 쓴 ‘열전’의 경우엔 부부간의 대화를 구어체 그대로 옮기기도 했다.
김 교수는 매일 글 속에서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나다 보니 제자나 젊은이들에게 충고를 할 때도 사기 속 인물 이야기를 곁들인다. “뭐든 금방 포기하고 쉬운 길로 돌아가는 사람을 보면 (세가 편에 있는) 춘추전국시대 월나라의 왕 구천세가(越王 句踐世家)를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오나라에 패배해 굴욕을 겪은 구천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지를 갖고 버텨 극복해 와신상담(臥薪嘗膽)이란 말을 남깁니다. 그처럼 결심을 굳힐 수 있는 근성과 의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트렌드뉴스
-
1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2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3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4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5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6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7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8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9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10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6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7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8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트렌드뉴스
-
1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2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3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4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5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6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7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8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9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10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6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7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8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유능한 관리자의 핵심은 적합한 ‘인재 배치’ [HBR 인사이트]](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12703.4.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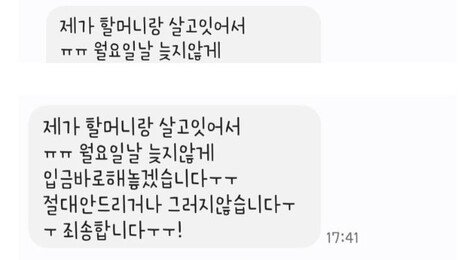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