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문사회]승전도… 패전도… 전쟁은 문화를 잉태한다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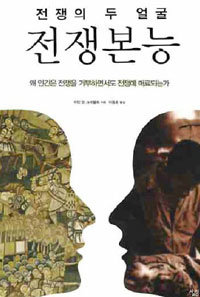
◇전쟁본능: 전쟁의 두 얼굴/마틴 판 크레펠트 지음/614쪽·2만7000원·살림
19세기 초반 영국군은 전투 외 다른 점에서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높이가 높고 색색의 깃털 장식으로 눈에 띄는 기병 모자는 무겁고 불편했다. 군복은 꽉 끼어 기병대원이 말에 오르기도 힘들었다. 목받침은 너무 빳빳해 끈을 잠그면 정면만 바라봐야 했다. 이들은 그렇게 입고 전투에 나섰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에서 무거운 모자와 움직임에 무리를 주는 꽉 끼는 옷은 비효율적이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런 부적절한 것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병사들은 장식과 치장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예술적 요소들은 젊은이들을 군대로 이끌고 사기를 북돋았다. 콜린 파월 전 미 합참의장도 자서전을 통해 멋진 군복에 반해 군인의 길에 들어섰다고 고백해 전투력 외 다른 요소가 전쟁과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전쟁이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슬픔은 학문과 문학 형태로 나타났다. 군사자료로 축적된 전쟁 회고록은 전쟁사 강의에 반영됐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 에밀 졸라의 역사 소설 ‘붕괴’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등이 나왔다. 저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은 뛰어난 문학의 주제라고 평가했다. ‘콘스탄틴 전투’ ‘게르니카’와 같은 미술 작품들도 전쟁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전쟁 문화도 변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엔 전쟁 중 희생자를 추모하며 비석을 세우기 시작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는 가장 강력한 전쟁무기의 위력을 알리는 동시에 앞으로 대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에 힘을 실어줬다. 국가 간의 전쟁이 줄어든 반면 게릴라, 테러리스트 등과의 전투가 늘면서 국가 간 전쟁에서 하는 선전 포고 절차도 자취를 감췄다.
저자는 전쟁 문화를 잘 아는 것이 전쟁 징후를 포착하고 전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글의 말미엔 ‘손자병법’의 저자 손빈의 말을 인용하며 전쟁 문화 보전의 이유를 설명한다. 모순적이지만 현실적이다. “나라가 비록 크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한다.” “전쟁이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더라도, 내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대비해야 한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인문사회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

동아닷컴 신간
구독
-

알쓸톡
구독
트렌드뉴스
-
1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2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5
정해인, 서양 남성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의혹도
-
6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7
인간은 구경만…AI끼리 주인 뒷담화 내뱉는 SNS ‘몰트북’ 등장
-
8
[횡설수설/김창덕]“그는 정치적 동물이야”
-
9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10
[사설]‘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다’는 믿음 커져야 투기 잡힌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트렌드뉴스
-
1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2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5
정해인, 서양 남성 사이에서 곤혹…인종차별 의혹도
-
6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7
인간은 구경만…AI끼리 주인 뒷담화 내뱉는 SNS ‘몰트북’ 등장
-
8
[횡설수설/김창덕]“그는 정치적 동물이야”
-
9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10
[사설]‘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다’는 믿음 커져야 투기 잡힌다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6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콩나물 팍팍 무쳤냐”… 국민 울고 웃긴 예능史](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9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