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Travel]코발트빛 바다… 은빛 요트 펄럭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뉴질랜드 북섬

‘비바람이 치던 바다/잔잔해져 오면/오늘 그대 오시려나/저 바다 건너서….’
학창시절 즐겨 불렀던 ‘연가(戀歌)’. 그 가락이 뉴질랜드에서 나왔다. 6·25전쟁에 참전했던 뉴질랜드 병사가 마오리족의 멜로디를 한국에 전했다고 한다.
○ 지친 여행객 심신 달래주는 마오리족 공연
여행객의 감정은 어디에다 처리해야 하나. 섬 곳곳을 돌며 에너지를 소진하는 길이 남아 있었다. 쉬러 갔다가 몸만 피곤하게 만드는 ‘후진국형 여행 문화’만을 탓할 수 없었다. 오클랜드에서 동남쪽으로 200km 떨어진 타라웨라 호수는 지친 여행객의 심신을 품어주는 곳. 마오리족 공연도 이곳에 자리 잡은 솔리테어 로지에서 볼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로지는 풍광 좋은 곳에 지어놓은 고급 임대용 별장. 로지 정원에는 점심식사를 위해 헬기를 타고 온 현지인들이 간혹 보인다.
느끼한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뒷맛을 없애기 위해 호숫가 산책로를 걸었다. 원시 자연림에 두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만한 통로다. 어디서도 맡아 보지 못한 이국적인 풀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뉴질랜드의 상징 나무인 실버 펀(Silver Fern)도 전신을 공개했다. 고사리 같은 나뭇잎은 일견 녹색으로 보이지만 잎 뒷면은 하얗게 번쩍인다. 뉴질랜드 화폐, 국가대표팀 유니폼에도 이 나뭇잎 무늬가 들어가 있다. 안내인은 “밤에도 야광 물질처럼 은빛이 나 현지인들이 좋아하지만 나무 자체는 땔감으로도 쓰지 못한다”고 했다. 설명을 들을수록 허탈하다. 그런 심정을 알아챘는지, 안내인은 로지 선착장에서 여행객들을 보트에 태운 뒤 호수를 돌다가 수증기가 무럭무럭 일고 있는 호수 가장자리에서 배를 세웠다. 언덕 위의 화산지대 온천수가 호수와 만나는 곳이었다. 호숫가 모래는 3초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뜨거웠다. 호수 물이 무릎에 이르는 지점에서는 온수와 냉수가 교차하며 증기가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화산지대의 특이한 유황 냄새를 피해 타라웨라에서 차를 타고 서쪽으로 150km를 달렸다. 와이카토 계곡으로 가는 길이다. 관광객들은 구릉지 위에 시루떡처럼 촘촘히 쌓인 퇴적암과 석회암 동굴을 보며 3000만 년 전 해저의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흰색 산호초로 뒤덮인 동굴 안에 서식하는 반딧불이가 보이자 안내자는 “곤충 보호를 위해 사진 촬영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개똥벌레의 유충인 반딧불이는 9개월 동안 살면서 먹이를 먹을 때만 발광을 한다. 이 유충은 번데기를 거쳐 성충으로 자란 뒤 완전 변태의 생애를 마감한다. 성충의 일생은 3일에 불과하다. 반딧불이가 수놓은 동굴 천장은 은하수처럼 보였다. ‘개똥 불로 별을 대적한다’는 말이 살갑게 느껴진다. 반딧불이 같은 인생을 위해 동굴이 3000만 년을 기다려 줬는지 모를 일이다. 반딧불이를 보며 여성 안내인이 부르던 마오리족의 노래는 반복되는 인생에 대한 리듬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와이헤케 섬과 테푸케 해안의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같다.
○ 여행정보
▽항공=한국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까지 대한항공이 주 5회(월 목 금 토 일) 운항한다. ▽시차=한국보다 3시간 빠르다. ▽언어=뉴질랜드 공식어는 영어와 마오리어. 대부분 영어를 사용한다. ▽기후=한국과는 정반대. 1, 2월 여름 최고 기온은 약 25도, 겨울 최저 기온은 영상 5도 정도. 북섬이 남섬보다 조금 더 따뜻하다. ▽주의할 것들=뉴질랜드 입국 시 농작물과 식물 검색이 엄격하다. 적발되면 즉석에서 벌금을 물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 차량 운전석은 우측에 있다. 햇살이 뜨겁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모자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푸른색이 나는 키위나무 밑에서 농민들은 키위를 따낸 뒤 아기처럼 안고 다녔다. 표면의 상처를 막기 위해서였다. 연소득이 10만 달러가 넘는다는 한 농민은 “겨울철 가지치기에서부터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테푸케 연구소와 마케팅 본부의 조언을 듣는다”고 말했다.
테푸케 키위 연구소는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제스프리 골드키위’ 품종을 만들어낸 곳이다. 황금빛 과육과 달콤한 맛을 지닌 골드키위는 이곳에서 15년 동안 개발한 끝에 1998년부터 수출한 농작물이다. 연구원들은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골드키위가 고유의 종자를 보존하고 있으며, 순수 접붙이기(자연 교배) 방식으로 탄생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60여 종의 다래 품종으로 다양한 영양소와 맛을 지닌 키위를 개발 중이다. 연구소는 이날 과육 가운데가 빨간색인 레드키위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베이비 키위도 보여주었다. 앞으로는 바나나처럼 껍질을 벗겨 먹을 수 있는 키위나 숙성단계에 따라 껍질 색이 달라지는 키위도 볼 수 있다고 했다. 한 연구원은 “골드키위에 단맛을 더 내고 저장 기간을 8개월 이상 늘릴 수 있는 품종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양학자 린리 드러몬드 씨는 골드키위와 그린키위의 장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골드키위에는 빈혈을 없애주는 엽산,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글루탐산이 풍부해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좋으며 그린키위는 섬유질이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제격”이라고 말했다.
키위 마케팅 본부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는 어떤 키위를 먹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제스프리 본사의 레인 재거 사장은 “장모와 일곱 살 아들은 아침에 소화를 돕기 위해 골드키위를 먹고, 나는 시리얼에 그린키위를 넣어 먹는다”고 말했다. 그는 “몸에 좋다는 이유로 키위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전체 구매자의 25%”라며 “아시아 키위 시장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푸케=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5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8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8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9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5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8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5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8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9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0
‘역대급 실적’ 은행들, 최대 350% 성과급 잔치…金 단축 근무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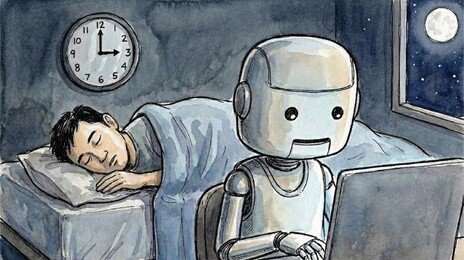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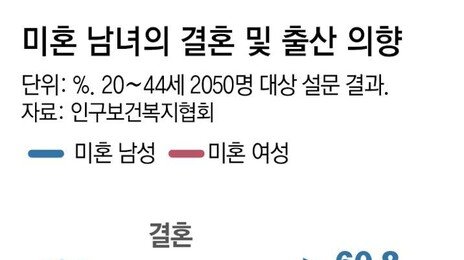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