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청계천 배경 소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펴낸 서하진
-
입력 2005년 9월 1일 03시 04분
글자크기 설정

그가 새로 펴낸 첫 장편소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창해)에도 이런 대화가 나온다. “저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던 시절이 있었다면서요? 그 시절에 저기, 물 나가는 문이 있었다면서요? 저렇게 도랑물처럼 흐르는데 곧 잉어가 살게 될 거라면서요? 진짜 그렇게 되면, 아저씨랑 나랑 잉어 잡으러 와요.”
10월 1일 청계천 복원 공사가 완공되면 첫선을 보이게 될 청계천의 다리 ‘오간수교’가 서 씨 소설의 소재다. 그는 서울시와 한국소설가협회가 기획한 ‘맑은 내 소설선(選)’의 하나로 이 작품을 썼다. 이 기획에는 서 씨 외에도 이승우 박상우 김별아 씨 등 작가 11명이 참여해 청계천의 다리 11개를 소재로 1편씩 장편소설을 쓴다. 파리의 센 강 위를 가로지르는 미라보 다리나 퐁뇌프처럼 청계천의 새 다리들이 문화적 코드로 부활할 수 있을지 눈길을 모으는 시도다.
서 씨는 “이름에 끌려 ‘오간수교’를 선택했다”고 했다. 동대문 근처에 있는 이 다리의 원래 이름은 ‘오간수문’. 물이 통하는 5개의 수문(水門)이라는 뜻이다. 서 씨는 “옛날 백성들이 밤에는 슬쩍 이 수문을 통해서 성문 안으로 들어서곤 했다. 임꺽정도 드나들었다더라”라고 말했다.
이 ‘오간수교’를 오가는 사람들 가운데 채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마흔을 앞두고도 노총각으로 지내는 이정원이 있다. 바로 서 씨의 소설 속에 나오는 의류사업가다. 그러나 정작 그의 마음을 앗아간 김연수의 결혼 생활은 온기가 빠져나간 지 오래다. 남편 정지섭은 쉬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데 어느 날은 남편의 애인이 대담하게 김연수에게 전화를 걸어온다. 이 도발을 맞받아치는 대사는 김연수가 아주 단단한 사람임을 보여 준다. “이 전화, 안 받은 걸로 하겠어요. 모르시는 모양인데, 나는 그 사람(남편)의 연애에 끼어들지 않아요.”
이런 김연수에게 어느 날 흰 장미들이 배달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에게서. 이 꽃들이 시들 만하면 새 꽃들이 배달된다.
서 씨는 “이미 복원된 오간수교를 하루 종일 건너고 건넌 적이 있지만 정작 그게 내가 찾던 바로 그 오간수교라는 걸 몰랐다”며 “늘 찾아 헤매는, 찾았지만 찾은 줄 모르는 사람들의 버리지 못한 꿈을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스캔들’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 스스로 전보다 훨씬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걸 발견하곤 하지요. 날이 갈수록 사랑의 느낌이 귀해지는 것 같아요.”
권기태 기자 kkt@donga.com
트렌드뉴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3
“하루 매출 1억3000만원”…‘두쫀쿠’ 최초 개발자의 정체는
-
4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5
“아가야 행복해야 해”…홈캠 속 산후 도우미 작별 인사에 ‘뭉클’
-
6
‘성유리 남편’ 안성현, 1심 뒤집고 코인 상장 청탁 2심 무죄
-
7
‘워시 쇼크’ 금·은값 폭락 배경엔…“中 투기꾼의 광적인 투자”
-
8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9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10
“한동훈 티켓 장사? 김어준은 더 받아…선관위 사전 문의했다”[정치를 부탁해]
-
1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2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8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9
李, 국힘 직격 “망국적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
10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트렌드뉴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3
“하루 매출 1억3000만원”…‘두쫀쿠’ 최초 개발자의 정체는
-
4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5
“아가야 행복해야 해”…홈캠 속 산후 도우미 작별 인사에 ‘뭉클’
-
6
‘성유리 남편’ 안성현, 1심 뒤집고 코인 상장 청탁 2심 무죄
-
7
‘워시 쇼크’ 금·은값 폭락 배경엔…“中 투기꾼의 광적인 투자”
-
8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9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10
“한동훈 티켓 장사? 김어준은 더 받아…선관위 사전 문의했다”[정치를 부탁해]
-
1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2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8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9
李, 국힘 직격 “망국적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
10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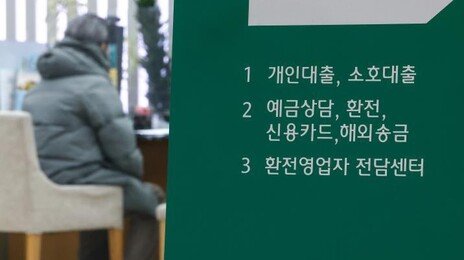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