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학예술]‘심인광고’…죽음이 있어 삶이 더 눈부시다
-
입력 2005년 1월 28일 17시 09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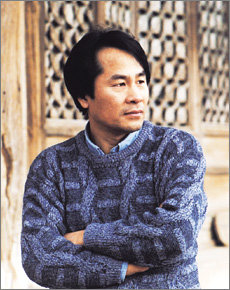
고통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 있음은 곧 고통을 느끼는 행위다. 물론 삶이 고통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다. 삶의 갈피 속에는 기쁨이 곳곳에서 반짝인다. 우리의 삶이 간단하지 않는 것은 기쁨의 존재 조건이 고통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비유를 하자면, 기쁨이 빛이라면 고통은 어둠이다. 기쁨이라는 빛은 고통이라는 어둠 속에만 빛난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그만큼 더 눈부시다. 삶의 신비가 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이승우의 소설집 ‘심인광고’는 어둠에 싸여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둠 그 자체다. 소설에서 빛을 찾고자 하는 독자에게 이승우의 소설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텍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
‘사령(辭令)’의 ‘나’는 회사로부터 ‘사회로 가시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회사원인 나는 자신의 욕망과는 상관없이 회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사회’로 가는 길은 폐쇄되어 있다. ‘사회’라는 이름도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 ‘나’의 실존은 원천적인 절망이며 어둠이다.
‘재두루미’의 ‘나’는 퇴근 후의 관심과 행동을 오로지 집으로 가는 길을 연장하는 데 바친다. 아무도 없는 집의 두터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굴속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눕는 짐승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했으며, 직장에서는 젊은 사원들에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는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의 순간적 일탈이 민통선 안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재두루미를 보는 행위다.
표제작 ‘심인광고’는 쉰다섯 살에 암에 걸려 5개월 이상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통고를 받고 ‘좋은 죽음’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는 한 남자의 내면 풍경을 추적하고 있으며, ‘사해’는 자신의 삶을 ‘영혼도 없이 몸뚱이만 바닷물에 둥둥 떠 있는 상태’로 생각하는 인물의 잿빛 일상을 그리고 있다.
‘그의 광야’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궁극적 희열인 ‘성스러운 떨림’을 인간의 가공물인 교회, 도시, 집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비극적인 전언을 담고 있다. ‘그의 광야’ 속의 인물이 성스러운 떨림을 찾은 곳은 모래바람이 부는 곳, 수천 수만의 구릉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곳, 사람은커녕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곳, 죽음을 내장하고 있는 ‘광야’였다.
‘오토바이’와 ‘터널’은 유년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물을 통해 관계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있으며, ‘객지 일기’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모두 지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기이한 노인을 통해 존재의 불안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듯 이승우의 소설이 천착하는 것은 어둠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령’과 ‘그의 광야’는 한 점의 빛도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어둠 속으로 독자를 끌어들인다. 그 ‘순결한 어둠’ 속으로 속절없이 끌려들어간 독자는 두리번거릴 것이 분명하다. 빛을 찾기 위해. 어둠 속에서는 빛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이승우 소설의 신비는 여기에 있다. 소설이 스스로 어둠이 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빛을 갈망하게 하는.
정 찬 소설가
문학예술 >
-

딥다이브
구독
-

사설
구독
-

동아시론
구독
트렌드뉴스
-
1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
2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
3
미군 “악!”…1.6조 레이더, 930억 공중급유기, 440억 리퍼 11대 잃었다
-
4
김지민, 남편 돈줄 취급 시댁에 이혼 언급 “매일 싸울듯” (이호선의 사이다)
-
5
조국, 한동훈 ‘대한민국 발탁’ 발언에 “尹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
-
6
김의겸 새만금청장 8개월만에 사퇴…“입신양명 위해 직 내팽겨쳐” 비판
-
7
“1억 원 이상 목돈 마련 하려면 ISA가 정답”[은퇴 레시피]
-
8
강남 아파트보다 소박한 일론 머스크 집…수건은 한 장, 주방도 단촐
-
9
닻내린 수중 기뢰, 선체 닿으면 ‘쾅’…특수요원이 ‘타이머 기뢰’ 붙이기도
-
10
“호르무즈 열어라”…트럼프, 이란 석유시설 파괴 불사 ‘경고’
-
1
오세훈-장동혁 벼랑끝 대치, 블랙홀 빠진 국힘
-
2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
3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
4
조국, 한동훈 ‘대한민국 발탁’ 발언에 “尹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
-
5
한동훈 “내가 배신자? 나를 발탁한 건 尹 아닌 대한민국”
-
6
김민석, 美서 트럼프 만나…대미투자법 등 논의한듯
-
7
장동혁 “이정현 돌아와 위기의 국힘 지켜달라”
-
8
아무것도 못했다…WBC 한국, 도미니카에 0-10 콜드패
-
9
장동혁측 “오세훈 컷오프”… 吳측선 “장수에 충분한 시간 줘야”
-
10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땅,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리겠다” 망언
트렌드뉴스
-
1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
2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
3
미군 “악!”…1.6조 레이더, 930억 공중급유기, 440억 리퍼 11대 잃었다
-
4
김지민, 남편 돈줄 취급 시댁에 이혼 언급 “매일 싸울듯” (이호선의 사이다)
-
5
조국, 한동훈 ‘대한민국 발탁’ 발언에 “尹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
-
6
김의겸 새만금청장 8개월만에 사퇴…“입신양명 위해 직 내팽겨쳐” 비판
-
7
“1억 원 이상 목돈 마련 하려면 ISA가 정답”[은퇴 레시피]
-
8
강남 아파트보다 소박한 일론 머스크 집…수건은 한 장, 주방도 단촐
-
9
닻내린 수중 기뢰, 선체 닿으면 ‘쾅’…특수요원이 ‘타이머 기뢰’ 붙이기도
-
10
“호르무즈 열어라”…트럼프, 이란 석유시설 파괴 불사 ‘경고’
-
1
오세훈-장동혁 벼랑끝 대치, 블랙홀 빠진 국힘
-
2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
3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
4
조국, 한동훈 ‘대한민국 발탁’ 발언에 “尹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
-
5
한동훈 “내가 배신자? 나를 발탁한 건 尹 아닌 대한민국”
-
6
김민석, 美서 트럼프 만나…대미투자법 등 논의한듯
-
7
장동혁 “이정현 돌아와 위기의 국힘 지켜달라”
-
8
아무것도 못했다…WBC 한국, 도미니카에 0-10 콜드패
-
9
장동혁측 “오세훈 컷오프”… 吳측선 “장수에 충분한 시간 줘야”
-
10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땅,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리겠다” 망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평창 온 괴짜 할배 “이 아름다운 나라에 핵폭탄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7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