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005 신춘문예]아동문학 당선작 ‘깜상이와…’ - 박영희
-
입력 2004년 12월 31일 16시 34분
글자크기 설정

아이들이 또 소리를 질러대며 웃기 시작합니다. 유나는 오늘도 뜀틀을 넘지 못했습니다. 넘기는커녕 구름판 앞에서 발 한 번 구르고는 한밤중에 거울에서 제 얼굴보고 놀란 사람 마냥 우뚝 서 버렸습니다.
뜀틀뿐만이 아닙니다. 피구시합을 할 때도 폭탄이라도 피하는 양, 내내 비명을 지르는 쥐처럼 도망만 다니다가 머리에 공 한 방 맞고 찔끔찔끔 울기 일쑤입니다.
유나는 체육시간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걱정이 되곤 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체육시간이 없어지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운동에는 소질이 없나봐.’
공부는 곧잘 하는 유나였지만 운동이라면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4학년이 되도록 자전거 타는 법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미꾸라지 손가락 사이로 빠지듯 좁은 골목길을 요리조리 달리는 친구들을 보면 그 신비롭기까지 한 기술을 자기가 받은 상장 열 개와도 맞바꾸고 싶었습니다.
‘나도 한 번 저렇게 타 봤으면…’.
사실 유나가 자전거 배우기를 시도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출발도 하기 전에 넘어지는 통에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긁히기는 예사였습니다.
‘10m만 갈 수 있다면, 아니 5m만. 아니 출발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유나의 소망은 넘어가는 해 마냥 점점 희미해져 갔고 실망의 그림자는 점차 짙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하얀 무릎에 실지렁이 같은 핏물이 배어 나오던 어느 날, 유나는 무언가 모를 서러움에 북받쳐 소리쳤습니다.
“나, 이제 다시는 안 해. 안 한다구!”
그리고는 반딧불처럼 빛나는 야광 장식물을 자전거 바퀴에 붙이고 바람처럼 달리고 싶은 꿈을 자전거와 함께 마당 한구석에 내동댕이치고 말았습니다.
저녁마다 근처 공원으로 운동하러 나가시는 아버지가 오늘도 유나를 구슬려 봅니다.
“유나야, 아빠가 뒤에서 잘 잡아 줄 테니 한 번만 더 해보자.”
“싫어요.”
유나는 아버지가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기미를 보이자 갑자기 소파에서 돌아누우며 소금 빠진 찌개 마냥 대답합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탈 수 있다니까!”
“안 해요.”
“오늘 한 번만 더 해보면 될 거야.”
“……”
유나는 깊은 잠이라도 자려는 듯 눈꺼풀을 꼭 붙이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유나야. 한 번만 더 시도해봐. 응?”
이제 엄마까지 거들기 시작합니다.
“싫어요, 나 안 할래요. 난 원래 운동신경이 둔해서 안 될 게 뻔해요.”
“그렇지 않다니까. 응?”
이쯤 되면 유나는 제 방에 쏙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유나는 까만 색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디딤돌 앞에 쪼그리고 앉아 졸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엄마! 웬 강아지예요?”
“아, 글쎄 시장 갔다 오는 길에 보니 전봇대 옆에서 낑낑거리고 있잖니? 아직 어린 녀석 같은데 누가 갖다 버린 모양이야, 쯧쯧쯧….”
유나는 연탄이, 깜깜이, 먹물떼기 등등의 이름을 놓고 고심하다가 깜상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신문지를 깔아 화장실을 마련해 주었지만 깜상이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여기저기에 마구 실례를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엄마가 상추를 심으려고 가꾸어 놓은 작은 텃밭도 헤집고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안 되겠다. 가엽기는 하지만 좀 묶어둬야겠구나.”
엄마는 1m쯤 되는 줄을 구하여 깜상이를 묶어두기로 하였습니다.
깜상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유나의 몫이었습니다.
유나가 밥그릇을 들고 나타나기만 하면 깜상이는 두 발로 일어서며 폴짝폴짝 뛰어 올랐습니다. 유나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펄쩍 앞으로 뜀박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목줄이 깜상이를 잡아채면서 깜상이는 유리벽에라도 부딪혀 튕겨 나간 듯이 나뒹굴었습니다.
“끼잉, 끼잉.”
그 모습을 보며 유나는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네가 아무리 뛰어봤자 소용없다구. 줄에 매여 있는 걸 몰라? 약 오르지?”
유나는 반지름 1m쯤 되는 반원을 좌우로 그려대며 숨넘어가는 소리로 재촉하는 깜상이를 놀려댑니다.
그러길 10여 일이 지났습니다. 이젠 깜상이도 밥그릇을 가지고 오는 유나의 모습을 봐도 전처럼 뛰어 오르지 않습니다. 뛰어 봤자 별 수 없다는 걸 아는 모양입니다. 엉덩짝에 붙은 먼지라도 떼어 내는 듯 그저 꼬리만 살래살래 흔들 뿐입니다.
한두 가지 동작밖에 못하는 로봇인형처럼 얌전해진 깜상이를 보니 유나는 왠지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유나의 다리를 부여잡기도 하고 뒤꿈치를 물어뜯으며 안달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사냥감을 앞에 둔 치타처럼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싶어진 유나는 깜상이의 목줄을 슬그머니 풀어 주었습니다.
“깜상아, 이리와. 누나가 쥐포 줄게.”
유나는 깜상이가 제일 좋아하는 쥐포를 깜상이 코앞에서 두어 번 흔들어 대고는 디딤돌 위에 걸터앉아 깜상이를 불렀습니다. 깜상이의 눈동자가 솥뚜껑만 하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깜상이는 제자리에 선 채로 엉덩이만 세게 흔듭니다.
“깜상아, 이리 오라니까.”
깜상이는 두 발로 일어서며 허공을 허우적대기만 합니다. 마치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기라도 하는 듯 한 발짝도 앞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먹고 싶으면 빨리 이쪽으로 오라니깐. 줄이 안 매여 있단 말이야!”
유나의 목소리가 커져갑니다.
깜상이가 낑낑대는 소리도 점점 커져갑니다.
“아유, 바보 같은 것! 줄도 안 매여 있는데, 한 발짝만 떼면 되는데. 한 발짝만 떼어보라니깐!”
마침내 유나는 고함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한 번만 해봐! 한 발짝만 떼어 보라구! 한 번만!”
그런데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치던 유나의 눈에 무엇인가가 언뜻 비쳤습니다. 마당 구석에 세워 둔 자전거였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허공만 긁어대는 깜상이의 모습 뒤로 그토록 폼 나게 달려 보고 싶었던 자전거가 잠자듯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멍한 듯 앉아 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전거 핸들을 부여잡았습니다.
“엄마! 나 자전거 타러 가요. 자전거 타는 법 배워 올거라구요! 오늘은 꼭 타고 만다구요!”
유나는 무어라 외치는 엄마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부리나케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제서야 깜상이도 유나를 따라 뛰쳐나갔습니다.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5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8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4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10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5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8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4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10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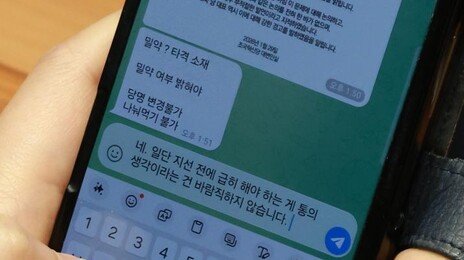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