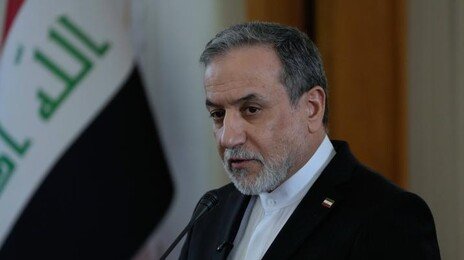공유하기
[책]박완서씨 '문학과 사회'에 단편 '그남자네 집' 발표
-
입력 2002년 5월 20일 18시 34분
글자크기 설정

작가와 얘기를 마치고 돌아온 기자는 서둘러 ‘문학과 사회’ 게재가 예정된 그의 새 단편 ‘그 남자네 집’을 입수해 읽었다.
그랬구나! 작가의 오묘한 미소가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최근 TV책소개 프로그램에 방영된 이후 석달 반동안 60여만부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장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와 ‘그 산이 정말 있었을까’에 살짝 끼워맞춰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이야기, 절절하기 이를데 없는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었던 것이다.
작품 속에서 ‘나’는 새로 이사한 후배의 초대로 그의 돈암동 집을 방문한다. 전쟁후 결혼 전까지 살던 그 동네에서 ‘나’는 기억을 더듬어 ‘그 남자의 집’을 찾아나선다. 위엄있는 ‘조선기와’의 한옥이 예전처럼 버티고 섰고, 마당에 가득한 나무들의 자태에서 ‘나’는 ‘그 무성한 그늘에서 관옥(冠玉)같이 아름다운 청년이 단 꿈을 꾼’ 걸 본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 남자’는 학창시절 같은 동네로 이사온 어머니의 먼 친척. 가슴 두근거려지는 대학 신입생 시절도 잠시, 전쟁이 터지고 두 집은 풍지박산이 난다. 잿더미가 된 서울에서 ‘나’는 국군에 징집돼 상이용사 처분을 받았으나 겉은 멀쩡해서 돌아온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 남자’가 의사인 그의 누님에게 돈을 융통하러 서울을 떠날때마다 ‘나’는 ‘하루만 더 그 무의미, 그 공허감을 견디라 해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루하루 절박하고도 열정적으로’ 그 남자를 기다란다.
그러나 벼락치듯 ‘나’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린다. 왜 그랬을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새들의 생태를 그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는 깨닫는다. ‘작아도 좋으니 하자 없이 탄탄하고 안전한 집에서 알콩 달콩 새끼 까고 살고 싶었다. 그의 집도 우리 집도 사방이 비 새고 금 가 조만간 무너져내릴 집이었다.’
기자는 서둘러 다시 다이얼을 돌렸다. 문학담당 기자가 간혹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무뢰한 질문, “작가의 체험이 몇 퍼센트나 반영되어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그러나 작가는 중국여행을 떠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지나간 고난의 세월, 안온한 피난처로서의 집이 절박했던 시절…. 그 시절을 힘겹게 보낸 작가는 이제 좌우의 산자락이 지켜주듯 둘러싸고 있는 집에서 온갖 초목을 돌보는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 작품속의 ‘그 남자’의 전쟁전 한옥이 그랬듯, 작가의 집에는 오월을 맞아 온갖 싱그러운 꽃들이 자태를 자랑했다.
“아침이면 이슬 머금은 꽃들이 기지개를 켜고, 어제 못보던 봉오리가 또 열려있고… 이 기쁨 만큼은 죽는 날까지 한결같을 것 같아요”라고 작가는 말했다. 그 안온한 집에 이제 그의 ‘새끼’ 며 손주들이 ‘알콩달콩’ 산다.
유윤종 기자 gustav@donga.com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5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6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7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8
‘대륙의 아이콘’서 밉상된 구아이링, “中 위해 39개 메달 땄다. 당신은?”
-
9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10
“한동훈 티켓 장사? 김어준은 더 받아…선관위 사전 문의했다”[정치를 부탁해]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8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9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10
李, 국힘 직격 “망국적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3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4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5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6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7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8
‘대륙의 아이콘’서 밉상된 구아이링, “中 위해 39개 메달 땄다. 당신은?”
-
9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10
“한동훈 티켓 장사? 김어준은 더 받아…선관위 사전 문의했다”[정치를 부탁해]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8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9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10
李, 국힘 직격 “망국적 투기 옹호-시대착오적 종북몰이 이제 그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