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진만이 그의 유일한 언어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7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헝가리 출신 사진작가 케르테츠展
프랑스어도 영어도 못했지만 흑과 백의 사진언어로 각국서 활동
시대를 앞서간 예술성 뒤늦게 각광

“사진만이 나의 유일한 언어이다.”
할 줄 아는 언어는 모국어가 전부였던 헝가리 사진작가 앙드레 케르테츠(1894∼1985·사진)가 말한 이 문장에는 그의 생애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 프랑스어를 몰랐지만 카메라를 들고 서른한 살에 프랑스 파리로 건너간 그는 파리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사진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역시 영어 한마디 못 하는 채로 미국 뉴욕으로 간 그는 미국 주류 사진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다 삶의 후반기에 이르러 세계적인 조명을 받게 된다.
‘앙드레 케르테츠’전이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성곡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케르테츠의 사진 189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대부분 흑백사진이지만 21세기 사진예술의 시선으로도 뒤지지 않는 구도와 감각을 자랑한다.

1937년 케르테츠가 미국에 왔을 때 사진잡지 ‘라이프’의 편집장은 그의 작품을 지면에 싣기를 거절했다. 그의 이미지들이 “너무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렇게 많은 것을 함축한 케르테츠의 사진은 앞서 ‘파리 시기’(1925∼1936년)에 예술성을 발했다. 당시 사진작가들은 어두운 밤을 찍지 않았지만 케르테츠는 밤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다. 그가 찍은 밤거리 풍경에서 검은 밤하늘과 가로등 조명 아래 건물은 놀랍도록 선명한 흑백의 조화를 이룬다.

기록사진과 상업사진을 중시하는 미국의 풍토에 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는 예술성을 놓지 않았다. 이런 케르테츠의 작업이 뒤늦게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1964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대규모 개인전이 개최됐다. 프랑스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우리가 해온 것들은 모두 그가 처음으로 했던 것”이라며 케르테츠에게 존경을 보냈다. 9월 3일까지.
트렌드뉴스
-
1
오늘 6시 이준석·전한길 토론…全측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
2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3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
4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5
스티븐 호킹, 엡스타인 파티서 양옆에 비키니女…유족 “간병인들”
-
6
85세 강부자 “술 안 끊었다…낮술만 자제” 건강 이상설 일축
-
7
“비행기서 발작한 동생” 안아 든 시민…이륙 지연에도 ‘한마음’ [e글e글]
-
8
태안 펜션 욕조서 남녀 2명 숨진채 발견…“밀폐 공간에 불판”
-
9
이한주 경사硏 이사장 재산 76억… 55억이 부동산
-
10
[동아광장/박용]월마트도 이긴 韓 기업들, 쿠팡엔 당한 까닭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3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4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5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
6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7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
8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
9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
10
안철수 “정원오, 고향 여수에 성동구 휴양시설 지어”…鄭측 “주민투표로 결정”
트렌드뉴스
-
1
오늘 6시 이준석·전한길 토론…全측 “5시간 전에 경찰 출석해야”
-
2
‘노인 냄새’ 씻으면 없어질까?…“목욕보다 식단이 더 중요”[노화설계]
-
3
“정원오,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 받고 357억 수의계약”
-
4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5
스티븐 호킹, 엡스타인 파티서 양옆에 비키니女…유족 “간병인들”
-
6
85세 강부자 “술 안 끊었다…낮술만 자제” 건강 이상설 일축
-
7
“비행기서 발작한 동생” 안아 든 시민…이륙 지연에도 ‘한마음’ [e글e글]
-
8
태안 펜션 욕조서 남녀 2명 숨진채 발견…“밀폐 공간에 불판”
-
9
이한주 경사硏 이사장 재산 76억… 55억이 부동산
-
10
[동아광장/박용]월마트도 이긴 韓 기업들, 쿠팡엔 당한 까닭
-
1
국힘 지지율 10%대 추락…TK서도 동률, 全연령대 민주 우위
-
2
‘똘똘한 한채’ 겨냥한 李…“투기용 1주택자, 매각이 낫게 만들것”
-
3
尹 계엄 직후보다 낮은 국힘 지지율… 중도층서 9%로 역대 최저
-
4
한동훈 “백의종군 하라? 그분들, 尹이 보수 망칠때 뭐했나”
-
5
李 “北, 南에 매우 적대적 언사…오랜 감정 일순간에 없앨순 없어”
-
6
‘17% 쇼크’ 국힘, TK도 등돌려 與와 동률…“바닥 뚫고 지하로 간 느낌”
-
7
[사설]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
-
8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
9
국힘 중진들 장동혁에 쓴소리…윤상현 “속죄 세리머니 필요”
-
10
안철수 “정원오, 고향 여수에 성동구 휴양시설 지어”…鄭측 “주민투표로 결정”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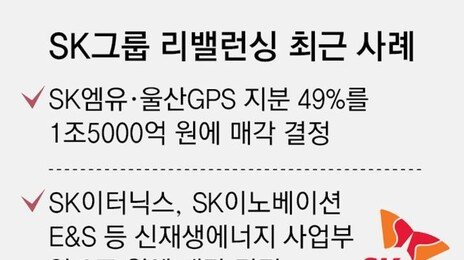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