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횡설수설/김순덕]우울증
-
입력 2007년 4월 19일 19시 35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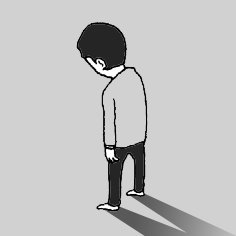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 참사의 범인 조승희를 지도했던 루신다 로이 교수는 그가 확실히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한인 1.5세라는 환경과 총기 접근성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같은 환경이라고 다 우울증에 걸리진 않는다. 유전자 때문이다.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2003년 “세로토닌이라는, 사람의 기분을 좌우하는 화학물질을 관장하는 5-HTT라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적절한 환경을 만날 경우 우울증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렇다면 좀 혼돈스럽다. 심하면 자살, 더 심하면 이번처럼 대량 살상까지 저지를 수 있는 우울증이 내 의지와 상관없는 유전자, 그리고 내 힘으론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면. 우울증에 걸렸나 싶어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남한테 털어놓기 힘들다. “마음먹기 달렸다”거나 “의지력이 부족해서…” 같은 뻔한 소리를 듣기 싫어서도 그렇다. 그래서 환자의 90%는 제대로 치료도 않고 병을 키운다.
▷문제가 있는 한 해결책도 있는 법이다. 타고난 유전자는 어쩔 수 없대도, 제약회사는 세로토닌을 자극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항(抗)우울제를 만들어 냈다. 1980년대 말 ‘프로작’이 개발된 이래 미국의 자살률이 15% 떨어졌다는 조사도 있다. 약물 대신 말(言)을 나누는 ‘토크 치료’도 항우울제와 같은 58%의 치유율을 보였다. 우울하게 남 탓, 환경 탓만 할 건지, 그게 ‘마음의 감기’라는 걸 깨닫고 나을 길을 찾아볼 건지는 결국 자신에게 달렸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 >
-

컬처연구소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트렌드뉴스
-
1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2
‘건강 지킴이’ 당근, 효능 높이는 섭취법[정세연의 음식처방]
-
3
이준석, 장동혁 단식에 남미출장서 조기귀국…‘쌍특검 연대’ 지속
-
4
‘정의선 누나’ 정윤이, ‘F3 드라이버’ 아들의 매니저된 사연
-
5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6
멀어졌던 정청래-박찬대, 5달만에 왜 ‘심야 어깨동무’를 했나
-
7
은행권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확산…주 4.5일제 정지작업?
-
8
反美동맹국 어려움 방관하는 푸틴…“종이 호랑이” 비판 나와
-
9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10
당뇨 의심 6가지 주요 증상…“이 신호 보이면 검사 받아야”
-
1
北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건 ‘尹대통령실 출신들’이었다
-
2
단식 5일째 장동혁 “한계가 오고 있다…힘 보태달라”
-
3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4
김병기 “재심 신청않고 당 떠나겠다…동료에 짐 될수 없어”
-
5
파운드리 짓고 있는데…美 “메모리 공장도 지어라” 삼성-SK 압박
-
6
조국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5급 비서관 두나”
-
7
“금융거래 자료조차 안냈다”…이혜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
8
단식 장동혁 “장미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돼”…김재원 ‘동조 단식’ 돌입
-
9
[김승련 칼럼]사라져 가는 직언, 한국 정치를 뒤튼다
-
10
한병도 “국힘, 조폭이 이탈한 조직원 보복하듯 이혜훈 공격”
트렌드뉴스
-
1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2
‘건강 지킴이’ 당근, 효능 높이는 섭취법[정세연의 음식처방]
-
3
이준석, 장동혁 단식에 남미출장서 조기귀국…‘쌍특검 연대’ 지속
-
4
‘정의선 누나’ 정윤이, ‘F3 드라이버’ 아들의 매니저된 사연
-
5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6
멀어졌던 정청래-박찬대, 5달만에 왜 ‘심야 어깨동무’를 했나
-
7
은행권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확산…주 4.5일제 정지작업?
-
8
反美동맹국 어려움 방관하는 푸틴…“종이 호랑이” 비판 나와
-
9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10
당뇨 의심 6가지 주요 증상…“이 신호 보이면 검사 받아야”
-
1
北침투 무인기 만들고 날린 건 ‘尹대통령실 출신들’이었다
-
2
단식 5일째 장동혁 “한계가 오고 있다…힘 보태달라”
-
3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4
김병기 “재심 신청않고 당 떠나겠다…동료에 짐 될수 없어”
-
5
파운드리 짓고 있는데…美 “메모리 공장도 지어라” 삼성-SK 압박
-
6
조국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5급 비서관 두나”
-
7
“금융거래 자료조차 안냈다”…이혜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
8
단식 장동혁 “장미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돼”…김재원 ‘동조 단식’ 돌입
-
9
[김승련 칼럼]사라져 가는 직언, 한국 정치를 뒤튼다
-
10
한병도 “국힘, 조폭이 이탈한 조직원 보복하듯 이혜훈 공격”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충무로 반항아' 임상수 감독](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