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사설]정부는 실패한 직업교육에 代案있나
-
입력 2006년 6월 12일 03시 02분
글자크기 설정
국내 직업교육은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따라잡는 데 실패했다. 실업고 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격감한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1995년 21만6000명이던 기업체의 실업고 졸업생 수요가 2003년에는 12만1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실업고 졸업생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2005년 한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기업체의 86%가 실업고 교육에 불만을 나타냈다.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업무능력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실업고 교육은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는 탓이다.
1995년 70%를 넘던 실업고의 취업률이 최근 30%대로 급락한 대신 대학 진학률은 1998년 35%에서 2005년 67%로 높아졌다. 실업고의 존재 이유가 변질된 셈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업고 개혁’을 고민하기는커녕 대입 특혜 확대라는 선심카드를 내놓기에 바빴다.
그렇다고 직업교육의 다른 축인 전문대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다. 전문대는 지난해 입학 정원의 17.7%를 채우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이처럼 직업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는데도 정부는 실업고 명칭을 ‘특성화고’로 바꾼다는 정도의 대책만 내놓았을 뿐이다. 이름을 바꾼다고 실업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한때 “교육에도 시장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고용시장이 원하는 인력 양성’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궁금하다.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재건해야 일자리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고 민생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다. 교육정책과 경제정책의 시급한 공통 과제다.
사설 >
-

프리미엄뷰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韓日 ‘훈풍 속 더딘 협력’… 민심의 공감대 더욱 넓혀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13/13315157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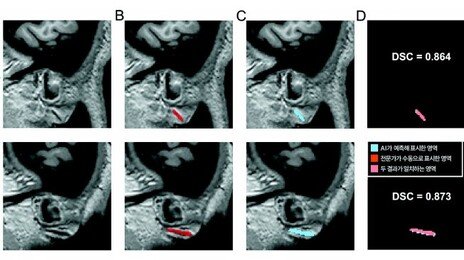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