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프로야구]양준혁 다시 ‘위풍당당’
-
입력 2004년 10월 25일 17시 47분
글자크기 설정

두산과의 플레이오프에서 13타수 1안타에 머문 삼성 양준혁이 한국시리즈에서는 5할대의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24일 현대와의 한국시리즈 3차전 7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솔로홈런을 날리고 있는 양준혁.-대구=연합
1∼3차전 3경기에서 10타수 5안타 타율 5할로 팀 내 1위는 물론이고 양 팀을 통틀어서도 최고. 2홈런 4타점 3득점. 매 경기 안타와 타점을 올렸고 1, 3차전에선 아치를 그렸다.
‘방망이를 거꾸로 쥐어도 3할을 친다’는 양준혁. 하지만 ‘가을 잔치’라는 포스트시즌에는 이상하게 죽을 쒀 왔다. 플레이오프 통산 타율은 0.224에 그쳤고 두 차례 한국시리즈에 출전했지만 통산 타율 0.257.
올해에도 이런 모습은 달라지지 않는 듯했다. 두산과의 플레이오프에서 13타수 1안타로 타율 0.077. 중심 타자 노릇을 못하는 바람에 타순이 6번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급기야 ‘큰 경기에 역시 약하다’, ‘실속이 없다’는 눈총까지 받았을 정도.
그러던 양준혁이 한국시리즈에서 확 달라졌다. 포스트시즌 41경기에서 단 한 개의 홈런도 없다가 21일 1차전에서 처음으로 대포를 쏘아 올린 게 신호탄.
3차전에서는 3-3이던 3회 2사 후 볼넷으로 1루에 나간 뒤 188cm, 95kg의 거구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잽싸게 2루 도루에 성공해 결승점까지 뽑았다. 또 이날 7-3으로 앞선 7회말에는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홈런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양준혁의 변신은 올해만큼은 우승 반지를 끼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현대 투수들의 피칭 패턴을 철저하게 연구한 덕분. 상대 투수에 따라 특유의 ‘만세 타법’을 버리고 예전 타격 폼으로 돌아가 톡톡히 재미를 보기도 했다.
“팀 분위기도 좋고 이번만큼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듭니다.”
대구야구장에 내걸린 ‘위풍당당 양준혁’이란 플래카드만큼이나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다.
김종석기자 kjs0123@donga.com
프로야구 >
-

오늘의 운세
구독
-

패션 NOW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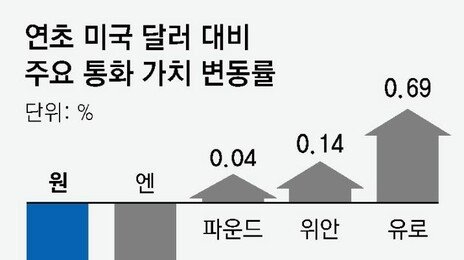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