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동아광장/전진우]멀리 떠나네
-
입력 2001년 3월 5일 18시 27분
글자크기 설정

며칠 전 지하철 출근길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에게 쏘아붙였다는 어느 해직 여성 노동자의 한마디가 서늘하다. 고단하게 살아가는 민초들 눈이라도 붙이게 할 일이지 웬 수선이냐는 것이다. 이 여성 노동자는 “(이 총재도) 야당이 되니까 찬밥 대우를 받지요. 우리 노동자들은 야당보다 더한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 ‘국민과의 대화’를 보니 대통령은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도 했다.
이게 어찌 야당 총재에게만 하는 쓴소리이겠는가. 김대중(金大中·DJ) 대통령이 더욱 아파해야 할 소리다. 노동자 서민대중의 지지를 받고 태어난 국민의 정부 3년 만에 노동자들은 ‘찬밥 신세’고 대통령은 ‘자기 얘기’만 하고 있다니 서글픈 일이다.
▼한 소설가의 희망과 절망▼
소설가 Y는 87년에는 울고 92년에는 자리 펴고 드러누웠었다고 했다. DJ가 대통령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얘기다. Y는 군사독재 시절 거의 소설을 쓰지 못했다. 소설에 매달려 있기에는 너무도 험한 세상이었다. Y의 뜨거운 피가 그를 밖으로 내몰았다. 황량한 바람과 거친 식사를 대하며 그는 오랜 세월을 거리에서 보냈다. 그 시절 Y는 ‘DJ 지지자’였다. DJ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은 달라지리라. 당장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야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 갈 수는 있으리라. Y는 그렇게 희망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3년이 지난 지금 Y는 희망을 잃었다고 했다. 그가 바라왔던 ‘제대로 된 세상’과는 영 다르게 돌아가는 현실을 보며 Y는 더 이상의 기대를 접었다고 했다.
시인 신경림(申庚林) 선생은 얼마 전 한 신문 칼럼에 이렇게 썼다.
‘사람들은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맑고 깨끗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리라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 꿈이 민주화세력의 분열로 깨어진 것이다. 분열은 지역갈등을 심화시켰고 분열된 채 두 세력이 차례로 집권해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민주화세력은 무능하다는 인식을 퍼뜨렸다. …민주화세력이 서로를 주적으로 간주하고 헐뜯고 싸우는 틈새에서 보수반동세력은 다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고, 민주화세력은 서로의 몸을 부풀리기 위해 이들을 제 편으로 끌어들였다.’
소설가 Y가 절망한 이유를 원로시인이 대신 말해준 셈이다.
▼다시 돌아설 수 있을까▼
DJ정권은 애초 세 가지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지역적, 이념적, 정파적 소수파가 그것이다. 따라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세력과 개혁 마인드의 전문가 그룹을 폭넓게 끌어안아야 했다. 이른바 개혁주도세력 창출이다. 집권하기 위해 JP와 손을 잡은 것이 부담스럽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권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러나 DJ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자신한 듯한 DJ는 몇몇 충성스러운 수하(手下)와 전문관료만 있으면 모든 개혁은 자신이 직접 지휘하고 챙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반면에 야당의 ‘발목잡기’가 개혁을 가로막는다는 명분하에 수를 늘릴 수 있다면 5공, 6공 출신이든 수구적 인물이든 가리지 않았다. 최근 민국당 대표 김윤환(金潤煥)씨와의 연정설도 그 한 예다.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은 그에 대해 “정쟁적이고 수구적인 한나라당의 흔들기에 대응하는 데 따른 딜레마”라고 말한다.
그러나 야당의 비판과 견제를 ‘발목잡기’로 비난하기에 앞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는 ‘과정의 노력’을 보여 주었어야 했다. 그러고도 안되면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다. 진정성으로 국민을 감동시키면 ‘국민의 힘’이 야당의 ‘발목잡기’ 쯤은 간단히 무력화시키지 않겠는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의 고통분담을 호소하던 첫 번째 ‘국민과의 대화’에 쏠렸던 국민의 호응과 열기를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지만 개혁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했던 계층이 고통을 전담해서야 노동자 서민이 DJ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지만 아무 세력이든 끌어들여서야 DJ를 지지해 왔던 지식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이 떠났다. 그들이 다시 돌아설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전진우<논설위원>youngji@donga.com
영화 프리뷰 >
-

오늘과 내일
구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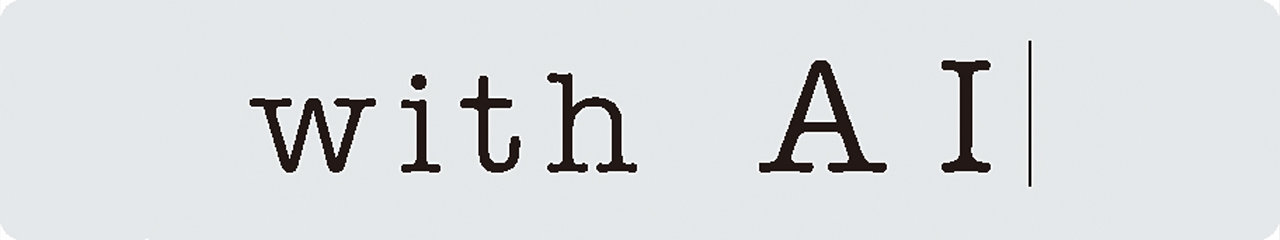
김현지의 with AI
구독
-

이은화의 미술시간
구독
트렌드뉴스
-
1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투자자…2030 수익률의 2배
-
2
트럼프 “대규모 함대 이란으로 이동 중…베네수 때보다 더 큰 규모”
-
3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4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5
“담배 끊으면 60만 원”… 보건소 맞춤형 금연 코칭
-
6
‘HBM 왕좌’ 굳힌 SK하이닉스…영업이익 매년 두배로 뛴다
-
7
“전기차 편의품목까지 다 갖춰… 신차 만들듯 고생해 만들어”
-
8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9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10
“전립선비대증, 약 안 듣고 수술 겁나면… 전립선결찰술이 대안”
-
1
李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
2
국힘, 내일 한동훈 제명 속전속결 태세… 韓 “사이비 민주주의”
-
3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4
李, 이해찬 前총리 빈소 찾아 눈시울… 국민훈장 무궁화장 직접 들고가 추서
-
5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6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7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8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5조 예산 집행
-
9
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
-
10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트렌드뉴스
-
1
오천피 시대 승자는 70대 이상 투자자…2030 수익률의 2배
-
2
트럼프 “대규모 함대 이란으로 이동 중…베네수 때보다 더 큰 규모”
-
3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4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5
“담배 끊으면 60만 원”… 보건소 맞춤형 금연 코칭
-
6
‘HBM 왕좌’ 굳힌 SK하이닉스…영업이익 매년 두배로 뛴다
-
7
“전기차 편의품목까지 다 갖춰… 신차 만들듯 고생해 만들어”
-
8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9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는 ‘이 방향’이 맞는 이유
-
10
“전립선비대증, 약 안 듣고 수술 겁나면… 전립선결찰술이 대안”
-
1
李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공공의료 투자…어떤가요”
-
2
국힘, 내일 한동훈 제명 속전속결 태세… 韓 “사이비 민주주의”
-
3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
4
李, 이해찬 前총리 빈소 찾아 눈시울… 국민훈장 무궁화장 직접 들고가 추서
-
5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
6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
7
“中여성 2명 머문뒤 객실 쑥대밭”…日호텔 ‘쓰레기 테러’ [e글e글]
-
8
‘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선임…5조 예산 집행
-
9
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
-
10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프리뷰]‘주홍글씨’…충격적인 21세기판 창세기 3장](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4/10/20/693139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