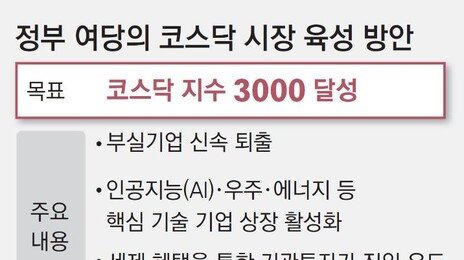공유하기
[밴쿠버리포트] 올림픽 4전5기… 이규혁의 아름다운 도전
- 스포츠동아
-
입력 2010년 2월 17일 07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1994년과 1998년에는 선수로 함께 참가했던 동계올림픽. 그러나 전 위원이 은퇴한 지 10년 넘게 흐른 지금, 이규혁은 현역에 남아 다섯 번째 올림픽 무대를 맞이했습니다.
전 위원과 이규혁은 어린 시절 함께 스케이트를 타면서 친해진 사이입니다. 지금도 종종 통화할 만큼 가깝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규혁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건 불과 13세 때.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와 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5회 연속 올림픽에 진출한 네 번째 한국 선수고요.
사실 남다른 빙상 유전자를 타고 나기도 했죠. 아버지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 1968년 그랑노블 대회에 나섰고, 어머니 이인숙 씨도 피겨 선수로 네 번이나 올림픽 무대를 밟았으니까요. 또 동생 이규현(29)도 형과 함께 두 차례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스케이팅을 배웠다”는 농담이 허튼 소리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금메달은 아직 요원합니다. 500m 경기에서도 결국 승리의 여신은 이규혁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김 감독에게 이규혁 얘기를 꺼내자 “아픈 곳을 찔렀다”며 얼굴이 붉어집니다. “토리노에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번에도 긴장을 많이 해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규혁의 지난한 여정을 옆에서 지켜봤기에 더 안타까운지도 모릅니다. “이번 경기는 다 잊고 1000m에서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털어놓습니다.
이규혁은 이 날 잠을 못 이뤘을 지도 모릅니다. 하나둘씩 목에 메달을 거는 후배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어쩌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올림픽 메달을 못 딴다고 해도, 이규혁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였는지 잊어서는 안된다”고요. 그를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밴쿠버(캐나다) |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렌드뉴스
-
1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2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3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4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5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외파병 간다…태국 ‘코브라골드’ 파견
-
6
與초선 28명도 “대통령 팔지 말고 독단적 합당 중단하라”
-
7
고교 중퇴 후 접시닦이에서 백만장자로…“생각만 말고 행동하라”[손효림의 베스트셀러 레시피]
-
8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딱 걸린 차주 결국
-
9
“고수익 보장”에 2억 맡긴 리딩방 전문가, AI 딥페이크였다
-
10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1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2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3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4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5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6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7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8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9
[단독]美투자사 황당 주장 “李정부, 中경쟁사 위해 美기업 쿠팡 공격”
-
10
李 “코스피 올라 국민연금 250조원 늘어…고갈 걱정 안해도 돼”
트렌드뉴스
-
1
‘꿈’ 같던 연골 재생, 현실로? 스탠포드대, 관절염 치료 새 돌파구
-
2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3
野 “25평서 5명 어떻게 살았나”…이혜훈 “잠만 잤다”
-
4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5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해외파병 간다…태국 ‘코브라골드’ 파견
-
6
與초선 28명도 “대통령 팔지 말고 독단적 합당 중단하라”
-
7
고교 중퇴 후 접시닦이에서 백만장자로…“생각만 말고 행동하라”[손효림의 베스트셀러 레시피]
-
8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딱 걸린 차주 결국
-
9
“고수익 보장”에 2억 맡긴 리딩방 전문가, AI 딥페이크였다
-
10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
1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2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3
이해찬, 베트남서 심정지-수술…李대통령, 조정식 특보 급파
-
4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5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6
“아파트 포기할 용의 있나 없나”에…이혜훈 “네” “네” “네”
-
7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8
與최고위원 3명 “민주당, 정청래 사당 아냐…합당 제안 사과하라”
-
9
[단독]美투자사 황당 주장 “李정부, 中경쟁사 위해 美기업 쿠팡 공격”
-
10
李 “코스피 올라 국민연금 250조원 늘어…고갈 걱정 안해도 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밥이랑 스시는 다른데”…‘김밥김’에 ‘스시앤롤’ 표기 논란 [e글e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16795.3.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