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쁨과 슬픔이 반반일 때[내가 만난 名문장/임지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8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20여 년 전 딩이라는 강아지를 키웠다. 몸이 약한 강아지였다. 입원했던 딩이를 병원에서 데려오던 날 엄마와 나는 딩이가 죽을 걸 예감했다. 울다 잠든 나와 달리 밤새 깨어 있던 엄마는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기 직전 부엌과 내 방 앞, 현관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가 한 번씩 머리를 내려놓는 걸 지켜보았다. 전부 딩이가 좋아하던 자리였다. 부엌에서 슬리퍼를 질겅이고, 내 방 앞에서 발라당 누워 있거나 현관 앞을 맴돌던 어린 강아지.
지금 엄마 집엔 호두라는 강아지가 왔다. 다시는 산 동물을 데려오지 않겠다던 다짐이 무색하게 우리는 호두를 단숨에 사랑하게 됐다. 다만 종종 과거가 현재를 기습한다. 복슬한 몸으로 온 집 안을 헤집는 호두를 보고 있자면 언젠가 딩이도 그랬던 게 불쑥 떠오르고, 그럼 뭉근히 끓이던 오일을 마신 것마냥 명치가 뜨끈해진다.
딩이 덕에 나는 언젠가의 기쁨과 그리움, 슬픔이 그런 식으로 꾸준히 반복된다는 걸 눈치 챈다. 상실을 안고 살아가는 일은 식지 않는 명치를 갖는 일이라는 듯이. 그건 불에 덴 듯 아프지만, 호두를 껴안으며 거기 분명 슬픔 이상의 무언가가 있고 또 이어진다고 말하고 싶어지는 요즘 에덜먼의 문장을 자주 꺼내본다. 이런 게 사우다지려나, 하고.
내가 만난 명문장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헌재의 인생홈런
구독
-

머니 컨설팅
구독
-

사설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당뇨 의심 6가지 주요 증상…“이 신호 보이면 검사 받아야”
-
2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5
[한규섭 칼럼]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
6
“더 울어봐야 한다”…이동국 아들, 아빠의 ‘독한 말’에도 끄덕끄덕
-
7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8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9
李대통령, 정청래에 “혹시 반명이십니까”
-
10
“퇴직연금 기금화, 사실상 개인 자산 국유화하겠다는 것”
-
1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2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5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6
① 美공장 고비용에 인력난… TSMC도 숙련공 대만서 데려가
-
7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8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9
李, 故 강을성 재심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 어떤 책임 지나”
-
10
李대통령, 정청래에 “혹시 반명이십니까”
트렌드뉴스
-
1
당뇨 의심 6가지 주요 증상…“이 신호 보이면 검사 받아야”
-
2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5
[한규섭 칼럼]왜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가
-
6
“더 울어봐야 한다”…이동국 아들, 아빠의 ‘독한 말’에도 끄덕끄덕
-
7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8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
9
李대통령, 정청래에 “혹시 반명이십니까”
-
10
“퇴직연금 기금화, 사실상 개인 자산 국유화하겠다는 것”
-
1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2
송언석 “장동혁 단식 중단해야”…정청래 “단식 말고 석고대죄를”
-
3
홍준표 “과거 공천 헌금 15억 제의받아…김병기·강선우 뿐이겠나”
-
4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
5
[속보]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
6
① 美공장 고비용에 인력난… TSMC도 숙련공 대만서 데려가
-
7
“한동훈, 정치생명 걸고 무소속 출마해 평가받는 것 고려할만”[정치를 부탁해]
-
8
국회 떠나는 이혜훈, 사퇴 일축…“국민,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것”
-
9
李, 故 강을성 재심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 어떤 책임 지나”
-
10
李대통령, 정청래에 “혹시 반명이십니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보물[내가 만난 名문장/신민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12/04/116836858.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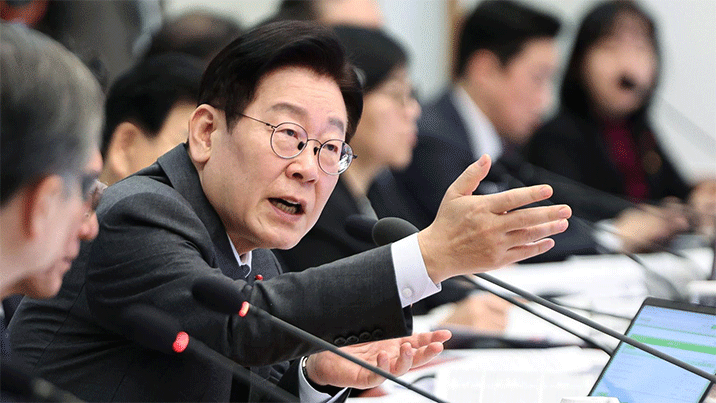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