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뉴욕의 ‘애나’, 한국의 ‘MZ세대’[동아광장/김금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이민자 출신으로 성공 갈구한 드라마 속 여성
사기 행각까지 하며 상류층 맛봤지만 무너져
우린 ‘열정’ 있으면 목표 이루는 사회인가

넷플릭스 드라마 ‘애나 만들기(Inventing Anna)’는 실제 미국에서 벌어졌던 사기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스물다섯의 한 여성이 거액의 신탁자금이 있는 독일 상속녀로 자신을 소개하며 사기를 친 사건이다. 그 거짓말에 값비싼 호텔들이 숙박비를 뜯겼고, 사교계 거물급들과 월가의 화이트칼라들 그리고 은행까지 속아 넘어갔다. 애나는 자신의 가짜 이름, 애나 델비를 딴 호화 사교 클럽을 운영하겠다며 2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무모한 거짓말들이 어떻게 뉴욕의 돈을 실제로 움직였을까.
1991년생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애나는 10대 시절 패션잡지들을 통해 세상을 배워 나간다. 그런 매체들에는 상품화된 욕망을 자극하고 전시하는 수많은 명품이 있고 ‘셀럽’들의 편집된 삶이 있다. 처음 그렇게 구독자일 뿐이었을 애나는 파리의 유명 패션잡지 기자로 일하면서 그 욕망이 구현된 ‘실제들’에 한층 다가간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으로 건너가 자신이 만든 상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개인이 자신의 일상을 전시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된 바로 그 시기다.
이제 애나의 삶에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건너온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는 자신의 과거가 없고 거짓이 탄로 나면 당장 내쫓길 신세인 자기 현실도 없다. “막대한 액수의 보이지 않는 돈이 매일 주인을 바꾸며 돌아다니는” 맨해튼의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갈 미래만이 적어도 애나에게는 가장 리얼하다.
그런데 애나 편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그 세계란 무엇일까. 삶의 목표가 있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면 이루게 되는 세계, 비록 지금 당장은 없지만 후에는 분명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준비된 세계, 그렇게 해서 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 뉴욕에 온 한 어린 여성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세계다. 어쩌면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기대했던 세상, 선거철만 되면 누구든 나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청년의 미래인 것이다.
국내에서는 ‘만들기’라고 옮겨졌지만 원제인 ‘인벤팅(inventing)’은 날조에 가까운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이렇듯 각자의 거짓으로 점철된 재판이 거듭될수록 애나는 더더욱 유명세를 치르고 관련자들도 이익을 얻게 된다. 애나에 관한 기사를 쓴 비비안은 유명 기자가 되고 토드는 수임 의뢰가 물밀 듯 들어오는 호황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애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켜봤기에 자신의 성공 앞에 부끄러움과 고통을 느낀다.
재판이 끝난 뒤 비비안은 교도소로 찾아가, 애나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기사가 오히려 판결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사과한다. 그때 “노 터칭”이라는 교도관의 경고가 들려온다. 애나는 비비안의 그런 눈물 어린 사과에 우리는 친구가 아니고 거래를 했을 뿐이며 유명인이 되었으니 만족한다고 냉소한다. 하지만 우리는 애나의 표정이 그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안다. 시끌벅적한 주목이 끝난 뒤의 자기 삶을 준비하면서 애나가 두렵고 외로우며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동아광장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사설
구독
-

주성하의 ‘北토크’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2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3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4
日대표팀 회식비, 최고 연봉 오타니가 아닌 최저 연봉 스가노가?
-
5
AFP “쿠웨이트 美대사관에서 연기 치솟아”…국무부 “접근 말라”
-
6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7
이란서 중국인 1명 사망…中외교부 “군사 행동 중단해야”
-
8
英기지 내어주고 佛해군 파견…‘이란 공습’에 유럽 가세
-
9
“귀 안까지 찌릿”…뒤통수 통증 부르는 이 질환은?
-
10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3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4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5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6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7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8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9
[사설]‘사법개혁 3법’ 통과… 법집행자들의 良識으로 부작용 줄여야
-
10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트렌드뉴스
-
1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2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3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4
日대표팀 회식비, 최고 연봉 오타니가 아닌 최저 연봉 스가노가?
-
5
AFP “쿠웨이트 美대사관에서 연기 치솟아”…국무부 “접근 말라”
-
6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7
이란서 중국인 1명 사망…中외교부 “군사 행동 중단해야”
-
8
英기지 내어주고 佛해군 파견…‘이란 공습’에 유럽 가세
-
9
“귀 안까지 찌릿”…뒤통수 통증 부르는 이 질환은?
-
10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3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4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5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6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7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8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9
[사설]‘사법개혁 3법’ 통과… 법집행자들의 良識으로 부작용 줄여야
-
10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동아광장/박용]월마트도 이긴 韓 기업들, 쿠팡엔 당한 까닭](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9/13326243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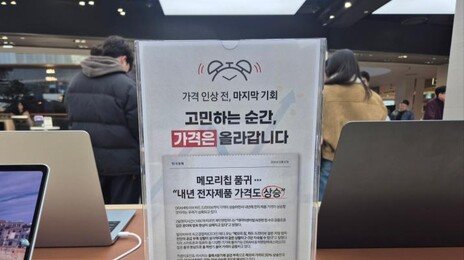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