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뉴스룸/이재명]동질성의 폭력성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유아인과 조정치. 달라도 너∼무 다르다. 영화 ‘완득이’의 배우 유아인은 꽃미남과다. 반면 기타리스트인 조정치는 지난해 TV프로그램 ‘무한도전’의 ‘못친소(못생긴 친구를 소개합니다)’ 편에 출연하며 예능 기대주로 떠올랐다. 거지도 ‘꽃거지’가 대세인 세상에서 조정치는 연예인의 외모 지평을 크게 넓힌 그야말로 ‘못친’이다.
꽃미남과 ‘못친’이 한 휴대전화 CF에 등장한다. 그 낯섦이 이 CF의 무기이자 메시지다. 산업과 대중문화에서 낯섦은 흥행코드가 된 지 오래다. 대중의 폭발적 열광은 낯섦 없이 불가능하다. 단군 이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한국인이 된 싸이가 그랬던 것처럼.
조정치식 낯섦의 반전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바로 정치다. 정치는 낯섦과 거리가 멀다. 도돌이표가 붙은 네 마디 악보 같다. 첫 마디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시작한다. 국민은 왜 싸우는지도 잘 모른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면 둘째 마디에서 서로의 이익을 챙긴 뒤 극적 합의에 이른다. 셋째 마디는 정치를 바꾸겠다는 약속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넷째 마디. 해외로 놀러 가고 지역구 챙기느라 여의도 정치는 쉼표다. 그러다 다시 첫 마디로 돌아간다. 거기에 감동의 선율이 자리할 여지가 없다.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 곧 동질성의 강요는 일종의 폭력이다. 모두가 같아야만 한다는 동질성의 과잉이 21세기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세기로 만들었다는 게 재독 철학자 한병철 베를린 예술대 교수의 진단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같은 것에 의존하는 자는 같은 것으로 인해 죽는다”고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를 보면 동질성의 과잉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관료나 연구원 출신이 장차관의 4분의 3이다. 그럼에도 낯섦에서 출발하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국정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낯설다. 더욱이 ‘나는 약속하고 장차관은 지킨다’는 게 박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다. 동질성이 강한 집단이 동질적 사고를 강요받으며 이질성을 전제로 한 융합과 창조를 이뤄내겠다니 진정한 역설 아닌가.
그나마 이질적인 ‘아메리칸드림’ 김종훈과 ‘벤처 1세대의 상징’ 황철주마저 어이없게 사퇴했다. 빈자리가 생길수록 관료들은 쾌재를 부를 터다. 경제든 문화든 이질성의 수용 없이 융성한 사례가 없다. 이질적 인재 찾기는 박 대통령의 모든 구상의 출발이다. ‘문명이란 불명확하고 일관성 없는 동질성에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이질성으로 향한 하나의 과정이다.’ 영국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의 말이다.
뉴스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초대석
구독
-

골든타임의 약탈자들
구독
-

특파원 칼럼
구독
트렌드뉴스
-
1
전현무, 순직 경관에 ‘칼빵’ 발언 논란…“숭고한 희생 모독” 경찰 반발
-
2
심장수술뒤 혈압 치솟던 강아지…머리에 ‘이것’ 얹자 ‘뚝’
-
3
“‘바나나맛우유’는 옛말?”…장수 브랜드의 유쾌한 반전
-
4
“집 팔때 ○원 밑으론 안돼” 주민 단톡방 제보, 최대 2억 포상금
-
5
[단독]‘10일 결근’ 사회복무요원, 캐보니 125일중 97일 빼먹었다
-
6
1만명 뒤엉킨 日 ‘알몸 축제’ 사고 속출…3명 의식불명
-
7
[단독]“살인·폭파” 허위협박 9건에…경찰 2500여명 헛걸음, 2.4억 피해
-
8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9
코인 투자로 돈날리자 동업자에 농약 탄 음료 먹여 독살 시도
-
10
러 바이칼호 ‘빙판 투어’ 버스 침몰…中관광객 8명 사망
-
1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2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3
119 구급차 출동 36%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씩 늦어져”
-
4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5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
6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7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
8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
9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10
태진아 “전한길 콘서트 출연 사실무근…명예훼손 고발할 것”
트렌드뉴스
-
1
전현무, 순직 경관에 ‘칼빵’ 발언 논란…“숭고한 희생 모독” 경찰 반발
-
2
심장수술뒤 혈압 치솟던 강아지…머리에 ‘이것’ 얹자 ‘뚝’
-
3
“‘바나나맛우유’는 옛말?”…장수 브랜드의 유쾌한 반전
-
4
“집 팔때 ○원 밑으론 안돼” 주민 단톡방 제보, 최대 2억 포상금
-
5
[단독]‘10일 결근’ 사회복무요원, 캐보니 125일중 97일 빼먹었다
-
6
1만명 뒤엉킨 日 ‘알몸 축제’ 사고 속출…3명 의식불명
-
7
[단독]“살인·폭파” 허위협박 9건에…경찰 2500여명 헛걸음, 2.4억 피해
-
8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9
코인 투자로 돈날리자 동업자에 농약 탄 음료 먹여 독살 시도
-
10
러 바이칼호 ‘빙판 투어’ 버스 침몰…中관광객 8명 사망
-
1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2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
3
119 구급차 출동 36%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씩 늦어져”
-
4
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
5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
6
장동혁 “내 이름 파는 사람, 공천 탈락시켜달라”
-
7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
8
與의원 105명 참여 ‘공취모’ 출범…친명 결집 지적에 김병주 이탈도
-
9
李 “한국과 브라질, 룰라와 나, 닮은게 참으로 많다”
-
10
태진아 “전한길 콘서트 출연 사실무근…명예훼손 고발할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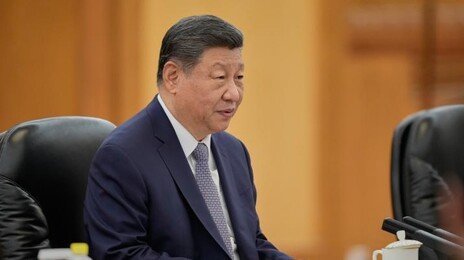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