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밀월외교]블레어 ‘푸들 외교’ 손익계산서
-
입력 2007년 7월 14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헬퍼 교수는 “9·11테러 직후 블레어 전 총리가 테러를 서구문명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국제 테러정책에서 미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영국은 글로벌 드라마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헬퍼 교수는 또 “미영 간 정보 교환 및 교역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영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며 “자기 몸무게 이상의 펀치를 휘두르는 존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블레어 전 총리는 9·11에 대한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국내적으론) 교육 프로그램과 (국제적으론) 아프리카 에이즈 대책에 변화를 주기 위한 동력으로 활용했다”며 “미국에 유럽을, 유럽에 미국을 설명해 주는 매개자 역할을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힐 교수는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한 뒤 “블레어 총리 시절 미영 간의 위성정보 교환, 정보 당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으며 비록 찬반이 엇갈리지만 미사일방어망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무라브치크 연구원은 “1990년대 보스니아 사태 때부터 이라크 침공을 논의하던 때까지 미국과 유럽 간에는 점점 더 인식의 간극이 벌어져 왔다”며 “블레어 전 총리는 이런 시기에 미국과 유럽을 그나마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누군가 ‘푸들 소리까지 들어가며 얻은 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냉소적으로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 주고 싶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프랑스나 독일을 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미국의 외교정책은 대중과 여론주도층의 인식을 반영한다. 지난 몇 년간 미국 내에서 영국에 대한 감정은 프랑스나 독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따뜻해졌다. 이런 감정이 매일 매일의 구체적 정책에 다 표출되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영국을 향해 훨씬 더 빨리 헌신적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는 무기 판매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미국은 무기 생산을 위해 수천 개의 부품 조달 계약을 여러 나라와 맺고 있지만 영국,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기술력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믿을 수 있는 동맹이기 때문이다.
스미스 연구원은 “세계가 미국을 버릴 때 블레어 전 총리는 항상 옆에 있었고 부시 대통령은 이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영국이 특정한 정책에서 진정 미국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미국은 영국의 곁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블레어 전 총리의 친미 행보 이유에 대해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영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국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라크 침공 전 블레어 전 총리는 그동안 쌓아온 우정을 토대로 부시 행정부에 유엔을 더 존중하고 시간을 더 갖자고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블레어 전 총리가 얻은 게 뭐냐고 물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의 접근법은 영국의 안보정책에 도움이 될 방향이라고 믿는 바를 추진한 것이었다. 임기 말에는 부시 행정부가 아프리카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 더 초점을 두게 만들었다. 부시 대통령 스스로 ‘동맹국들은 미국이 동맹국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동맹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마치 신하처럼 여긴다고 느끼고 있다’고 깨닫게 해 준 것도 블레어 전 총리였다.”
○ ‘푸들 외교’로 영국이 잃은 것은
헬퍼 교수는 “며칠 전 한 영국군 고위 장성을 만났더니 ‘수백 년 쌓아온 중동과의 우호관계를 몇 년 사이에 잃어 버렸다’고 하더라”며 “많은 영국인들은 블레어 외교로 인해 유럽 및 중동 국가와의 관계가 손상됐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유럽을 이어 주는 매개자로서 영국의 역할이 이라크전쟁에 적극 참여한 결과 많은 손상을 입었다”며 “부시 대통령은 영국에서 인기가 없고 영국인들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영국이 자체의 안보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헬퍼 교수는 “이미 독일과 프랑스가 친미 정책으로 돌아섰고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주요국이 친미 정책을 펴고 있어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회복세를 보이고 영국이 받은 피해도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힐 교수도 “국가적 자존심에 미친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없지만 (다른 국가로부터) ‘친구라면 때론 진실을 말해 주고 다른 의견을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 등 영국의 외교정책은 도전을 받았다”고 말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대중은 블레어 전 총리가 언제나 부시 행정부에 충성을 다했을 뿐 정작 친구로서 해야 할 충고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양국 정부 간의 관계는 좋았지만 영국인들은 미국의 인권정책,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 등에 대한 반감이 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영국 정부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겠지만 대중 사이에선 친구를 잃었고 이를 회복하는 데는 한 세대가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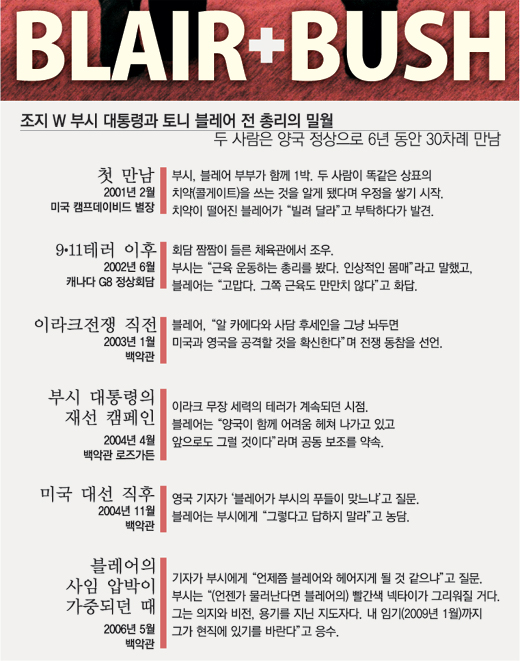


![반도체를 흔드는 손, 차라리 ‘립서비스’나 말든지[오늘과 내일/김재영]](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073123.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