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환경경영 시대]<5>환경경영을 넘어 지속가능 경영으로
-
입력 2003년 10월 9일 17시 57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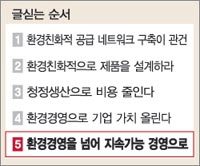
그러나 한국 기업의 이름은 단 한 개도 찾아볼 수 없다. 보고서를 낸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과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지속가능 경영은 환경경영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3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에는 이 3가지 분야에서 1년간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상세하게 들어간다. 선진기업들은 실적 보고서와 함께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다국적 기업인 필립스의 지속가능성 담당 임원인 행크 더 브루인 부사장은 “이해 관계자들의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 추구해서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이승규 교수는 “환경 친화적 경제 구조로 바뀌어 가는 흐름은 경영자들에게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더 이상 미덕이 아니고 고객 만족이나 개성 추구, 편리성 등도 그 자체로 기업이 추구할 궁극의 가치는 아니다. 기업들이 전혀 새로운 경쟁 역량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발걸음은 더디다.
국내 대기업 A사는 실무적으로 올해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업을 마쳤지만 발간을 미뤘다. 이런저런 속사정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GRI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려다 보니 노사 문제 등 껄끄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때 환경오염 문제로 집중 포화를 받았던 대기업 B사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환경 담당 조직을 밖으로 분사시켰다. 선진기업들이 환경 관련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 기구로 격상시켜 전사(全社)적인 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움직임이다.
현장에서는 “먹고 살기 바쁜데 웬 지속가능성이냐”는 목소리도 많다. 원가와 품질, 납기 같은 과제가 널려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있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경영진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특히 1995년 환경 문제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던 석유기업 셸이 최근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 변신한 것을 주목할 만하다.
이 회사의 지속가능성 담당자인 팀 반 쿠튼은 “시대의 흐름을 남보다 먼저, 멀리 읽어내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고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 지속 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위한 GPI 가이드라인 | ||
| 범주 | 항목 | 내용 |
| 경제 | 고객, 협력업체, 직원, 자본 제공자, 공공 부문 | |
| 환경 | 재료, 에너지, 물, 생물다양성, 배출, 폐수, 폐기물 등 | |
| 사회 | 노동 | 고용, 노사 관계, 보건 및 안전, 교육과 훈련, 다양성과 기회 등 |
| 인권 | 전략과 관리, 비차별 결사, 단체협상의 자유, 아동 노동 등 | |
| 사회 | 지역사회, 뇌물과 부패, 경찰 역할 및 기여도, 경쟁과 가격 책정 | |
| 제조물 책임 | 고객 보건과 안전, 제품과 서비스, 광고, 프라이버시 존중 | |
-끝-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환경경영 시대 >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글로벌 포커스
구독
트렌드뉴스
-
1
1평 사무실서 ‘월천’… 내 이름이 간판이면 은퇴는 없다[은퇴 레시피]
-
2
트럼프가 보조금 끊자…美 SK 배터리 공장 900여명 해고
-
3
한국 성인 4명 중 1명만 한다…오래 살려면 ‘이 운동’부터[노화설계]
-
4
한국야구 ‘공일증’에 또 울었다…8일 대만에 지면 진짜 끝
-
5
국힘 지도부 ‘서울 안철수-경기 김은혜’ 출마 제안했다 거부당해
-
6
트럼프 “이란 오늘 매우 강력한 타격”…공격 확대 시사
-
7
美외교지 “李 인기 비결은 ‘겸손한 섬김’…성과 중시 통치”
-
8
홍준표 “통합 외면 TK, 이제와 읍소…그러니 TK가 그 꼴된 것”
-
9
미국은 미사일이 부족하다? 현대전 바꾼 ‘가성비의 역습’[딥다이브]
-
10
李 “대통령·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권한만큼 책임 커”
-
1
[단독]오산 떠난 美수송기 이미 대서양 건너… 미사일 재배치 시작된듯
-
2
한동훈 “尹이 계속 했어도 코스피 6000 갔다…반도체 호황 덕”
-
3
오세훈, 장동혁에 “리더 자격 없다…끝장토론 자리 마련하라”
-
4
美외교지 “李 인기 비결은 ‘겸손한 섬김’…성과 중시 통치”
-
5
국힘 지지율 21%, 張 취임후 최저… 지선 여야 지지差 16%P 최대
-
6
‘패가망신’ 경고, 李 취임 후 10여번 써…주가-산재 등 겨냥
-
7
[사설]지지율 연일 바닥, 징계는 법원 퇴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나
-
8
정청래 “조작 기소 검사… 감방 보내 콩밥 먹여야”
-
9
국힘 지도부 ‘서울 안철수-경기 김은혜’ 출마 제안했다 거부당해
-
10
李, 장성 진급 박정훈에 삼정검 수여하며 “특별히 축하합니다”
트렌드뉴스
-
1
1평 사무실서 ‘월천’… 내 이름이 간판이면 은퇴는 없다[은퇴 레시피]
-
2
트럼프가 보조금 끊자…美 SK 배터리 공장 900여명 해고
-
3
한국 성인 4명 중 1명만 한다…오래 살려면 ‘이 운동’부터[노화설계]
-
4
한국야구 ‘공일증’에 또 울었다…8일 대만에 지면 진짜 끝
-
5
국힘 지도부 ‘서울 안철수-경기 김은혜’ 출마 제안했다 거부당해
-
6
트럼프 “이란 오늘 매우 강력한 타격”…공격 확대 시사
-
7
美외교지 “李 인기 비결은 ‘겸손한 섬김’…성과 중시 통치”
-
8
홍준표 “통합 외면 TK, 이제와 읍소…그러니 TK가 그 꼴된 것”
-
9
미국은 미사일이 부족하다? 현대전 바꾼 ‘가성비의 역습’[딥다이브]
-
10
李 “대통령·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권한만큼 책임 커”
-
1
[단독]오산 떠난 美수송기 이미 대서양 건너… 미사일 재배치 시작된듯
-
2
한동훈 “尹이 계속 했어도 코스피 6000 갔다…반도체 호황 덕”
-
3
오세훈, 장동혁에 “리더 자격 없다…끝장토론 자리 마련하라”
-
4
美외교지 “李 인기 비결은 ‘겸손한 섬김’…성과 중시 통치”
-
5
국힘 지지율 21%, 張 취임후 최저… 지선 여야 지지差 16%P 최대
-
6
‘패가망신’ 경고, 李 취임 후 10여번 써…주가-산재 등 겨냥
-
7
[사설]지지율 연일 바닥, 징계는 법원 퇴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나
-
8
정청래 “조작 기소 검사… 감방 보내 콩밥 먹여야”
-
9
국힘 지도부 ‘서울 안철수-경기 김은혜’ 출마 제안했다 거부당해
-
10
李, 장성 진급 박정훈에 삼정검 수여하며 “특별히 축하합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환경경영 시대]환경경영을 넘어 지속가능 경영으로](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