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차 한잔에 어울리는 따뜻한 이야기’]<9>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3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포리스트 카터 지음/아름드리미디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한다. 사슴을 잡을 때도 제일 좋은 놈을 잡으려 하면 안 돼. 작고 느린 놈을 골라야 남은 사슴들이 더 강해지고, 그래야 두고두고 사슴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야. 꿀벌은 늘 자기들이 쓸 것보다 더 많은 꿀을 저장해 두지. 그러니 곰한테도 뺏기고 너구리한테도 뺏기고 우리 체로키한테 뺏기기도 하는 거다. 그놈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 하는, 뒤룩뒤룩 살찐 사람들하고 똑같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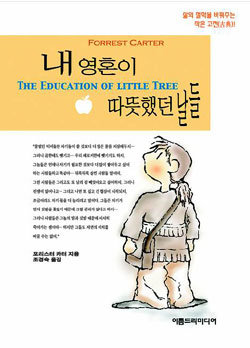
체로키 인디언의 혈통을 이어받은 지은이가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얻은 가르침을 옮긴 자전적 성장소설이다. 네 살 때 부모를 잃은 주인공 ‘작은 나무’는 2년 동안 산속 오두막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낸다. 장례식장에서 말없이 울음만 삼키며 할아버지의 바지춤을 붙들고 따라갔던 첫 만남부터 그의 임종을 지켜본 마지막 날까지 함께 경험한 이야기를 엮었다. 원제는 ‘The Education of Little Tree’. 1976년 출간 당시에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저자 사후 12년이 지난 1991년 17주간 미국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뒤늦게 화제를 모았다.
삽화 하나 없이 글로만 채웠는데도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맞은편 산등성이 뒤에 숨은 채 뿌연 은빛만을 하늘 가득 토해내는 반달’을 따라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숲을 가로지르는, 부드럽게 쿨렁거리는 사슴가죽 침대에 누워 ‘희미한 빛 속에 귀신처럼 서 있는 창밖 개울가 나무들’을 바라보는 소년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히 그려진다. 기다랗게 땋은 머리를 마루 위까지 늘어뜨린 채 ‘로마제국 쇠망사’나 ‘맥베스’를 느릿느릿 읽고 있는 할머니, 흔들의자에 기대 앉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할아버지를 바로 곁에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담백한 묘사로 채워진 문장들이 리드미컬하게 짜여 있어 눈으로 씹는 맛이 시종 뿌듯하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인 대지, 모노라(Mon-o-lah)가 내 모카신(부드러운 가죽으로 뒤축이 없게 만든 인디언 신발)을 통해 나에게 다가왔다. 여기서는 볼록 튀어나오거나 밀쳐 올라오고, 저기서는 기우뚱하거나 움푹 들어간 그녀의 존재가 내 몸으로 전해져 왔다. 혈관처럼 그녀의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뿌리들, 그녀 몸 깊숙이 흐르는 수맥의 생명력도.”
“할머니는 사람들이 누구나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하나의 마음은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꾸려가는 마음이다. 이런 것들과 관계없는 또 다른 마음은 ‘영혼의 마음’이다. 몸이 죽으면 몸을 꾸려가는 마음은 함께 죽지만 영혼의 마음은 그대로 남는다. 영혼의 마음을 크고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뿐이다.”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을 부리고 교활한 생각을 하거나 남을 해치고 이용해 이익을 볼 생각만 하면 영혼의 마음은 점점 졸아들어 밤톨보다 작아지게 된다는 것. “타인에게서 더럽고 나쁜 것만 찾아내려 하는 사람, 나무를 돈 덩어리로만 보는 사람처럼 평생 욕심만 부리던 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영혼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충고가 마디마디 엄한 회초리처럼 살갑게 따끔하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할 겨를 없이 어찌됐든 남보다 앞서 가려 너도나도 내달리고 있는 현대의 도시에는 할머니가 이야기한 ‘걸어 다니는 죽은 사람’만이 가득한 것인지도.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차 한잔에 어울리는 따뜻한 이야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특파원 칼럼
구독
-

정경아의 퇴직생활백서
구독
-

내가 만난 명문장
구독
트렌드뉴스
-
1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2
日대표팀 회식비, 최고 연봉 오타니가 아닌 최저 연봉 스가노가?
-
3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4
[속보]이란 혁명수비대 “네타냐후 집무실에 탄도미사일 공격” 주장
-
5
‘침묵의 암살자’ B-2 폭격기, 폭탄 907kg 싣고 이란 훑었다
-
6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7
이란서 중국인 1명 사망…中외교부 “군사 행동 중단해야”
-
8
AFP “쿠웨이트 美대사관에서 연기 치솟아”…국무부 “접근 말라”
-
9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10
‘음주 물의’ 김지수, 프라하서 여행사 차렸다…“삶 확장하는 경험”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3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4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5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6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7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8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9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10
[사설]‘사법개혁 3법’ 통과… 법집행자들의 良識으로 부작용 줄여야
트렌드뉴스
-
1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2
日대표팀 회식비, 최고 연봉 오타니가 아닌 최저 연봉 스가노가?
-
3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4
[속보]이란 혁명수비대 “네타냐후 집무실에 탄도미사일 공격” 주장
-
5
‘침묵의 암살자’ B-2 폭격기, 폭탄 907kg 싣고 이란 훑었다
-
6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7
이란서 중국인 1명 사망…中외교부 “군사 행동 중단해야”
-
8
AFP “쿠웨이트 美대사관에서 연기 치솟아”…국무부 “접근 말라”
-
9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10
‘음주 물의’ 김지수, 프라하서 여행사 차렸다…“삶 확장하는 경험”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3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4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5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6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7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8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9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10
[사설]‘사법개혁 3법’ 통과… 법집행자들의 良識으로 부작용 줄여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차 한잔에 어울리는 따뜻한 이야기’]내 생의 마지막 저녁식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0/12/04/3306268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