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商道와 文道는 통하더군요”…무역 개척담 책 낸 최정호 씨
-
입력 2006년 8월 16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노래를 잘해서 음대에 가라는 권유도 들었다. 영화광이기도 해서 수업 빼먹고 영화 보러 갔다가 학교에서 정학도 맞았다.
글재주도 좋아서 작가지망생 동생이 쓴 습작을 꼼꼼하게 고쳐 주었다.
그렇지만 홀어머니에 여섯 남매의 장남이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형은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선택했다.
최정호(66·한양대 산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씨가 펴낸 ‘CEO여, 문화코드를 읽어라’(삶과꿈)는 이렇게 다져진 문화 감각에 기대어 쓴 글모음이다.》
최정호 씨는 대우캐리어와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등을 맡았고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의 대우 현지법인에서 활동한 기업인이다. 그는 또 작가 최인호(61) 씨의 형이다.
14일 정호 씨와 만난 자리에는 동생 인호 씨가 함께했다. 정호 씨는 동생과 나눈 대화를 옮기는 형식으로 책을 썼다가 독자를 위해 서술 형식으로 고쳤다. “형제의 사연(私緣)을 넘어 학창시절부터 문화를 주제로 나눈 얘기가 결실로 맺어졌다”고 형은 설명한다. “이 책은 우리 형제의 대화를 통해 잉태된 제3의 아우”라고 동생도 거들었다. 어린시절 얘기부터 시작됐다.
“그땐 공부 잘하는 형이 극복 대상이었다”는 인호 씨. 고교생 형이 겨울밤 들어오면 소설책을 읽던 인호 씨가 덥힌 이불을 내어 주었단다. 마루는 추워서 나가질 못하겠고, 형이 피곤하니 빨리 자야 한다고 어머니가 채근하는 통에, 책에 빠진 인호 씨는 여간 고민이 아니었다. 궁리 끝에 마루 불을 켠 뒤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틈새 불빛으로 책을 읽었다.
“내가 그렇게 컸다오”라며 인호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 정호 씨가 다시 책 얘기를 꺼낸다.
“1998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했을 때 일이에요. 저녁식사 자리에서 독일인 최고경영자(CEO)가 소설가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의 무대가 다보스인 걸 아느냐고 물었어요. 전 ‘마의 산’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아득해졌지요. 그런데 대학시절 토마스 만의 ‘선택된 인간’을 읽은 게 떠오르더라고요. 토마스 만의 소설을 영화화한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을 본 것도 생각나고. 그 얘길 했더니 대화가 풀렸지요.”
정호 씨의 문화 감각은 50여 개 나라에서 무역을 할 때 큰 도움이 됐다. “칠레 기업인을 만나면 시인 파블로 네루다 얘기를, 독일 사람을 만나면 귄터 그라스의 소설 ‘양철북’을 영화로 봤던 걸 얘기하고…. 이러면 같이 골프 치고 사우나 하는 것과는 다른 교감이 생겨요. 문화 스킨십이랄까요.” 인호 씨가 무릎을 쳤다. “맞아, 스킨십! 문화는 묘한 접촉 수단이에요. 문화적인 얘기를 하는데 커피 한잔이면 되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동류의식은 수준이 높잖아요.”
인호 씨의 밀리언셀러 ‘상도’도 형 덕분에 쓰게 된 것. 폴란드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형을 만나러 갔다가 현지 한국 기업인들과 만나 얘기를 들으면서 모티브를 얻었다. 그뿐만 아니라 등단작 ‘견습환자’를 비롯해 ‘겨울 나그네’ ‘별들의 고향’ 등 인호 씨의 대표작 제목을 다 형이 달아 줬다고 한다.
작가는 동생의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책을 내니 형은 글 욕심이 난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러다가 형제끼리 다 해먹는다는 얘길 듣겠다”면서 활짝 웃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5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8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4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10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5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8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4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10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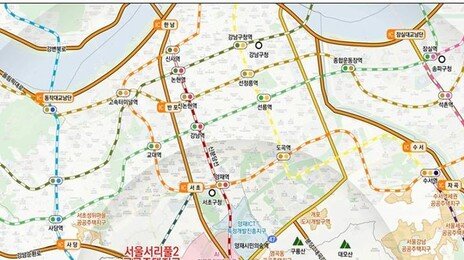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