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심영섭의 세상속으로]위기의 주부들
-
입력 2005년 8월 1일 03시 10분
글자크기 설정

모처럼 잡은 휴가의 마지막 날, 해피 엔딩으로 기록될 일이 하나도 없다. 행인에게 부탁해 가족사진을 찍으려 하자 디지털 카메라에는 ‘저장공간 없음’이란 글자가 뜨고, 네 살 된 딸은 열이 나고, 아이들 재우고 술잔을 기울이던 남편과는 새 차를 사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였다. TV에서 하는 ‘위기의 주부들’을 본 것은.
이미 미국에서 3000만 명의 팬을 거느리고 있다는 이 드라마는 평론가인 내가 보기에도 각본, 연기, 연출 측면에서 모두 수준급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드라마를 이끌고 있는 화자가 이미 자살한 메이 앨리스라는 여자라는 점, 그리고 주인공인 네 명의 주부의 일상이었다. 남편과 이혼한 뒤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수전, 말썽꾸러기 아이 넷에게 시달리는 전직 커리어 우먼 리네트, 끔찍하게 완벽을 추구하는 주부 브리,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전직 모델 가브리엘.
이 중에서 앞의 둘은 내가 이미 거쳐 왔던 상황이고, 뒤의 둘은 한 번이라도 되어 봤으면 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나 눈 씻고 보아도 네 명의 주부 중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 모두 나름대로의 ‘비밀과 거짓말 게임’을 벌이고, 이 아슬아슬한 무간 지옥에서 주부라는 역할을 고수한다.
아하. 이래서 로라 부시가 자기도 ‘위기의 주부’라고 했군. 주부라면 모두 공감할 만한 그 무엇. 불만과 의혹과 때론 배신감이 고개를 쳐들어도 내다 버리지 못하는 가정이란 테두리.
문득 남편이 드라마를 보면서 말문을 튼다. “저거 말이야‘아메리칸뷰티’랑 비슷하지 않아?” 맞다. 많은 사람이 이 드라마가 ‘섹스 앤드 시티의 주부판’이라고 하지만 내 눈엔 ‘아메리칸 뷰티’의 주제나 형식을 꼭 닮았다. 죽은 사람이 나와서 화자를 하고, 반드르르한 중산층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한 꺼풀씩 벗겨 나가는 추리 기법하며. 결국은 나도 남편에게 말을 건다.
“정말 일부일처제는 인간이 만든 가장 나쁜 제도 중의 하나야.
안 그래?”
미국가족협회에서 ‘멀쩡한 주부의 일탈을 유도해 가족의 가치를 해친다’는 비난에 시달렸다는 드라마. 그러나 과연 이 지구상에 멀쩡한 주부가 있긴 있단 말인가.
이런저런 생각 끝에 나도 로라 부시와 같은 결론을 내리며 잠을 청한다. 내가 바로 위기의 주부야. 드라마가 일탈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가 그저 아주 조그만 일탈일 수밖에 없는. 한숨 푹…(효과음).
심영섭 임상심리학박사·영화평론가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5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8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4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10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트렌드뉴스
-
1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2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3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4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5
앤드루 前왕자, 누운 여성 신체에 손댄 사진… 英사회 발칵
-
6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7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8
이광재 돌연 지선 불출마… 明心 실린 우상호 향해 “돕겠다”
-
9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10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3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4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9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10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심영섭의 세상속으로]여성성은 나의 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5/08/22/6952385.1.jpg)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3276630.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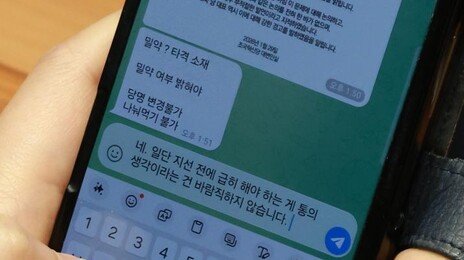
댓글 0